
국내 해운업을 대표하는 부산시와 부산항의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펜데믹 후 더 성장했다. 해운과 항만 산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돌게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부산 지역 항만물류 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운수 및 창고업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5년간 전체 산업 평균 6.0%의 매출액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인 14.7%를 기록했다.
부산항, 지역 경제 성장 견인해왔다… 환적항만으로서 세계 2위 굳건

보고서는 해운에 주목했다. 부산항의 해운 산업이 부산시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 항만물류 산업의 지역 경쟁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해상화물운송업의 경우,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확대와 해운 운임 상승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를 견인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부산 항만물류산업 종사자 수가 1%p 증가할 때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는 0.12%p 증가하고, 지역 내 총부가가치는 0.31%p 상승했다. 또 부산 운수 및 창고업의 부가가치가 1%p 증가할 때 지역 내 총부가가치는 0.3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물류산업은 부산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운수 및 창고업의 5년 평균(2018~2022) 매출액 증가율은 14.7%로 전 산업의 평균(6.0%) 2배를 상회했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기준으로도 부산은 지난 2022년 기준 물류 시설 운영업 2억1000만원, 물류서비스업은 9300만원으로 측정됐다. 이는 전국 기준을 넘어 인천, 전남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부산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제1관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부산항 경유 정기노선의 증가 등으로 환적 중심 항만으로서 부산항의 역할 또한 확대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은 2023년 기준 컨테이너 총 처리 실적 2315만 TEU를 기록하며 환적화물 비중 53.6%로 세계 2위의 환적 항만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287개에 달하는 국제 정기노선은 아시아 주요 항만 중 싱가포르(318개)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환적물량은 전 세계 2위, 총 처리 물량은 상하이, 싱가포르에 이은 전 세계 7위다.
이에 보고서는 부산시로 한정하면 수상운송서비스업은 222억원, 창고 및 운송보조서비스업은 122억원의 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며 항만물류 산업의 전체 운수업 부가가치는 부산으로 한정할 시 63.8%까지 높아진다고 기술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제미나이' 떠난 부산항, 향후 발전 방향은

중국 해운사의 견제와 지난해 새로 출범한 제미나이 얼라이언스가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부산항의 환적 물량이 감소해 올해 실적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덴마크 머스크 해운사와 독일 하팍로이드 해운사의 연합이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미나이 얼라이언스는 21.7%의 컨테이너 마켓 쉐어 비율을 기록 중이다. 이는 28.4%의 비율을 보유 중인 오션 얼라이언스에 이은 2번째 비중이다.
보고서 역시 "부산의 항만물류 산업은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세 둔화로 인해 양적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난 2023년 53.6%에 이르는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도 성장세가 더뎌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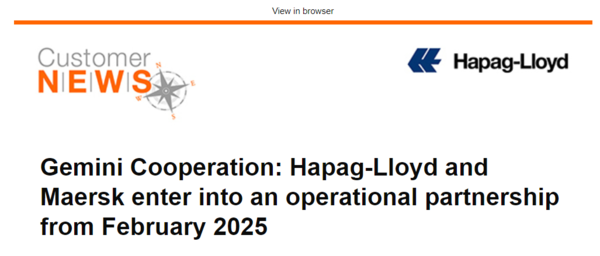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2500만 TEU로 설정했으며 스마트 항만 건설과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 블록체인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9월과 12월 언급했다.
한은 부산본부는 "선박 대형화 지속, 해운의 탈탄소화 요구 증대에 따라 고효율‧친환경의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며 "IT, 물류가 융합된 무인 자동화 항만 등 항만 자동화 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항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산항과 오는 2029년 개항하는 가덕도신공항과의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강서지역의 에코델타시티‧연구개발특구‧국제산업물류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바탕으로 가공무역, 조립, 제조 등이 포함된 항만‧물류‧제조 융복합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산항 성공 사례 인천·전북 등 타 지역 항만에도 영향 미칠까

한편 부산항의 사례는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타지역 항만들에도 모범사례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항이 도입한 무인 원격 컨테이너 크레인, 자율주행 이송 장비(AGV), 자동화 야드 크레인 등의 기술을 다른 항만들이 벤치마킹 중이며 차량 반출입예약시스템(VBS), 환적 운송시스템(TSS), 통합 정보 조회 서비스(IIS) 등도 물류 프로세스 최적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역시 오는 2026년까지 총 6256억원을 투입해 계획 중인 2~6단계 항만에 부산 신항 서컨테이너 부두 장비를 완전 무인화로 조성할 방침이다. 무인 원격 컨테이너 크레인, 자율주행 이송 장비(AGV), 자동화 야드 크레인 등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부산항이 먼저 선보인다면 인천 신항 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부산항이 환적, 로컬 쪽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인천항은 경인 지역에서 나오는 국제 수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항만 산업은 곧 물류·해운 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