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적 없나? 특히 궁금한 것. 왜 2년일까?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다. 생각해보면 얼추 융통성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게 우리가 또 하나 알고있는 것이 있다. 2년 전월세 계약은 마치 융통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고집불통 영감님과 닮았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있지 않나. 집을 빌린다는 건 곧 2년이라는 시간의 족쇄를 차는 것과 같다는 것. 물론 따스하고 행복한 족쇄니 다행이지만.
이 지점에서 최근 재미있는 트렌드가 보인다. "저는 딱 5주만 필요한데요?", "두 달만 살다 갈 겁니다" MZ 같은 질문이라 좋다!
생각해보라. 오래 살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덜 오래 살 사람도 있지 않은가? 여기서 이른바 '치고 빠지기'의 고수들이 등장했다. 과거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와 "한 달 방 있나요?"라고 물으면 "여기가 여관인 줄 아나"라며 소금 세례를 맞기 십상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바야흐로 부동산 숏폼(Short-form) 시대의 개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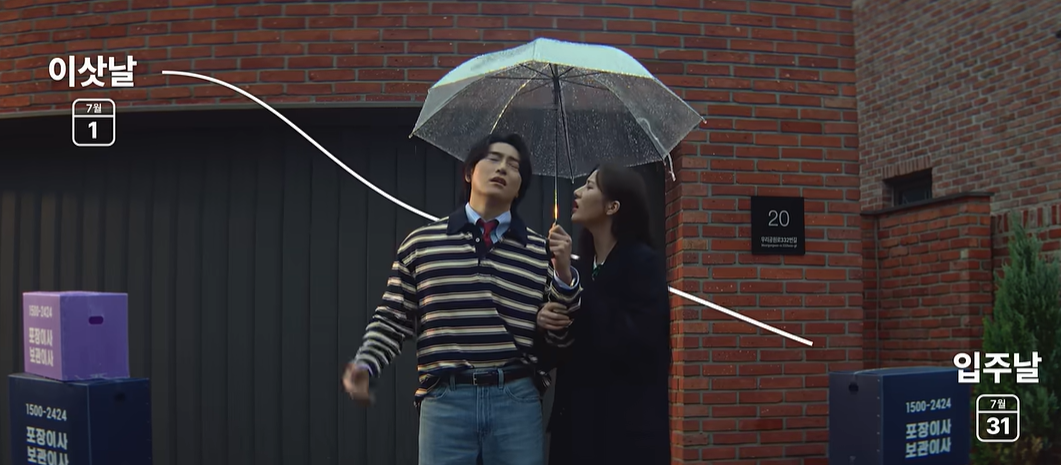
세사람 이야기
서울에 사는 40대 가장 A씨의 최근 고민은 '집'이었다. 아, 물론 노숙자 이런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집을 고치는 동안 머물 집이 필요했다. 낡은 구축 아파트를 뜯어고치기로 결심했는데, 공사 기간 5주가 붕 떠버린 것이다.
처음에 자신만만했다. "요즘 세상에 돈 주면 갈 데가 없겠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호텔? 4인 가족이 5주간 호텔에서 지내면 밥은 매끼 사 먹어야 하고 빨래는 어떡하며, 결정적으로 통장 잔고가 비명을 지를 게 뻔했다.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 그렇다고 레지던스? 위치가 회사와 아이들 학교에서 너무 멀었다. 모텔을 갈 수도 없지 않은가.
문제는 문제다. 부동산에 가서 "5주만 월세 계약합시다"라고 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 딱 좋기 때문이다. A씨는 졸지에 '인테리어 난민'이 되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아파트형 단기임대였다.
"보증금 1억? 아니요, 100만 원이면 됩니다. 2년 계약? 아니요, 날짜 수만큼만 내세요."
구원의 빛이다. 그는 살던 집 근처 아파트를 딱 5주간 빌렸다. 그렇게 아침에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아내는 익숙한 마트에서 장을 봐와 저녁을 해줬다. 내 집인 듯 내 집 아닌 내 집 같은 공간. 비용은 호텔의 반값. A씨는 리모델링이 끝난 새집에 들어가며 생각했다. "세상 좋아졌네"
한편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B씨(40대, 여)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부대원 같은 비장함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30일. 미션은 험난했다.
1. 부모님 안부 확인 및 생존 신고
2. 1년 치 수다 떨 친구들 만나기
3. 한국의 선진 의료 기술(건강검진, 임플란트) 체험
4. 자녀들의 한국어 및 수학 실력 펌프질(대치동 학원)
문제는 베이스캠프였다. 친정? 반갑게 맞아주시겠지만 사춘기 손자 둘과 한 달 내내 부대끼면 부모님의 혈압약 복용량이 늘어날 것이 뻔했다. 호텔? 강남 한복판 호텔 스위트룸을 한 달 빌리면 캐나다행 비행기표 값을 날리게 된다.
스마트폰을 켰다.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의 단기임대 매물을 '클릭' 몇 번으로 확보했다. 풀옵션, 방 3개, 학원가 도보 5분. 그녀는 그곳에서 마치 10년 넘게 압구정 주민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냈다. 아침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낮엔 피부과를 돌고, 저녁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다.
"호텔은 아무리 좋아도 '여행객'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냥 '서울 시민' 모드로 살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고 빠지는 쿨한 계약,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B씨의 후기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난감한 인생이 있다. "고시원은 네이버...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보이고, 다리를 뻗으면 벽에 발이 닿는 곳."
간호학과 4학년 C씨(20대, 여)에게 단기 거주란 곧 '고시원'을 의미했다. 그리고 서울 대형 병원의 강원도 분원으로 2개월 실습을 가야 했을 때, 그녀는 절망했다. "또 그 좁은 관 같은 방에서 두 달을 버텨야 하나"
하지만 MZ세대는 참지 않긔. 친구와 작당 모의를 했다. "우리 돈 합쳐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들은 단기임대 플랫폼을 뒤져 병원 근처의 투룸 오피스텔을 구했다. 보증금도 거의 없고, 월세는 둘이 나누니 고시원 특실 가격과 비슷했다. 그렇게 퇴근 후 좁아터진 고시원 침대에 쭈그려 누워 유튜브를 보는 대신, 그들은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며 실습의 고단함을 풀었다. C씨에게 단기임대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준 공간이었다.

우리는 스트리밍의 시대를 산다
A, B, C씨 같은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는 '2년 전월세'라는 거대한 확성기에 묻혀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없는, 이른바 '미스매치(Mismatch)의 지옥'이었다.
이 꽉 막힌 혈관을 뚫어준 것은 기술은 플랫폼이었다.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의 등장은 마치 꽉 막힌 고속도로에 뚫린 버스전용차로와 같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삼삼엠투는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찍더니, 그 후엔 가속도가 붙어 불과 1년 만에 200만 고지를 점령했다. 거래액 그래프는 거의 수직 상승이다. 2021년 6억 원이던 거래액이 2024년 840억 원이 됐다. 3년 만에 140배 성장. 이 정도면 '성장'이 아니라 '폭발'이다. 누적 계약 건수는 이미 20만 건을 넘어섰다.
재밌는 건 집주인들의 태세 전환이다. 처음엔 "귀찮게 무슨 한 달 계약이야"라며 손사래를 치던 임대인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눈이 번쩍 뜨인 것이다. "잠깐, 전세는 이자 무섭고 월세는 안 나가서 공실인데, 단기로 돌리니까 수익률이 더 높네? 게다가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어?"
공실의 공포에 떨던 집주인들에게 단기임대는 난세의 영웅이었다. 2023년 1만 5천 건이던 신규 방 등록 수가 2024년 3만 3천 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배경이다. 초기엔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위주였던 매물도 이제는 전국 팔도 방방곡곡, 아파트부터 빌라까지 다양해졌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준다.
살펴보자. 과거 우리에게 집은 '사는(Buying) 것' 아니면 '2년 동안 사는(Living)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집은 넷플릭스처럼 '필요한 만큼 구독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워케이션(일하면서 휴가)을 떠나는 직장인, 한 달 살기로 제주도를 찾는 은퇴자, 인테리어 때문에 잠시 떠도는 가족, 장기 출장 온 비즈니스맨 등등등. 이들에게 "2년 계약하세요"라고 강요하는 건 컵라면 하나 먹으려는 사람에게 쌀 한 가마니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스트리밍의 시대다. 이제 기술의 플랫폼으로 흐르는 콘텐츠의 스트리밍이 우리의 관념을 꿰뚫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집이라는 개념도 2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흘러 삶의 스케줄에 맞추는 온디맨드 스트리밍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장 몇 시간의 다큐가 되거나, 혹은 쪼개진 부동산 숏폼의 시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박형준 삼삼엠투 대표가 "이제 집은 2년 단위로 묶이는 공간이 아다"면서 "내 삶의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말한 이유다. 그리고 이 인사이트는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삶의 서비스에 스며들어 재미있는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삶을 유연하게 쪼갤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는 순간이다. 이것이 비단 부동산 임대시장만의 일일까. 여러번 곱씹어 볼 관전 포인트다.
그건 그렇고 이제 당신도 합류해라. 혹시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혹은 장기 출장 때문에 고민 중인가? 그렇다면 쫄지 말고 당당하게 외쳐보라. "여기, 5주 어치 집 주세요! 일시불로요!" 아 물론 진짜 외치라는건 아니고 앱을 열라는 뜻이다. 막 길가에서 스마트폰 열고 소리치면 이상한 사람된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