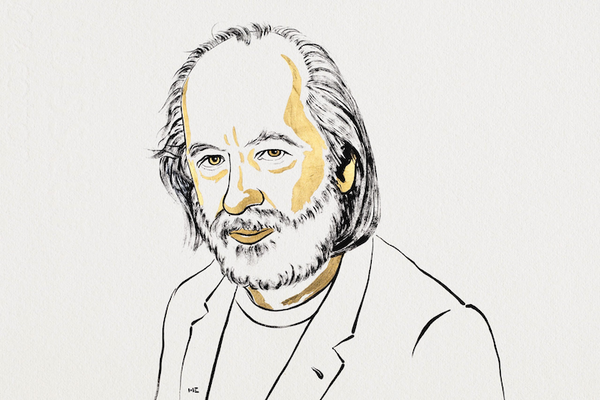
스웨덴 한림원 발표문을 바탕으로,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의 문학 세계를 정리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써 내려간 그의 문장은 현대의 종말을 통과하는 인간의 기록이다.
■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그 기적을 놓친다”
“그의 작품은 절망과 혼돈, 폭력과 구원의 순간을 탐구하는 현대의 서사시.” - 스웨덴 한림원
“그는 절망의 문장으로 희망을 쓴다.” - 안데르스 올손 노벨위원회 위원장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László Krasznahorkai)는 1954년 헝가리 남동부 죄러(Gyula)에서 태어났다.
그의 문학은 논리보다 체험, 설명보다 직관에 가깝다.
그는 데뷔작 ‘사탄탱고’(1985)는 공산체제 붕괴 직전 버려진 집단농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망과 기이한 구원을 그린다. 벨라 타르 감독이 1994년 동명 영화로 연출했다.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그 기적을 놓친다”는 문장처럼,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의 무력함과 반복되는 절망을 그린다.
■ 종말의 대가로 불린 작가
비평가 수전 손택은 그를 “현대문학의 종말론적 대가”라 평했다.
두 번째 장편 ‘저항의 멜랑콜리’(1989)는 이 평가를 굳혔다. 거대한 고래 사체를 전시한 서커스단이 등장한다. 그들의 등장은 마을에 폭력과 광기를 퍼뜨린다. 작가는 이를 통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독재가 스며드는 과정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렸다.
‘전쟁과 전쟁’(1999)에서는 헝가리의 기록관리인 코린을 주인공으로 세웠다. 코린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서사시를 들고 뉴욕으로 향한다. 이 작품에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쉼표로 이어지는 긴 문장을 완성했다. 이른바 ‘무한 문장’이라 불리는 문체는 그의 상징이 됐다.
■ 귀향과 몰락의 비극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2016)은 고향으로 돌아온 몰락한 귀족의 이야기다. 망명 생활을 마친 주인공은 귀향의 길에서 인간의 자만과 욕망,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를 마주한다. 지역 주민들이 벌이는 과장된 환영식 장면은 블랙코미디의 정점이다. 작가는 그 장면에서 냉소와 연민이 교차하는 인간 군상을 그린다.
■ 동양으로 향한 시선
그는 중앙유럽의 종말 서사를 넘어 동양의 사유로 시선을 옮겼다.
‘북쪽엔 산, 남쪽엔 호수, 서쪽엔 길, 동쪽엔 강’(2003)은 교토 남동부의 정원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명상적 사유를 드러낸다.
이후 ‘서왕모의 강림’(2008)에서 그 탐구는 절정에 이른다. 17편의 단편은 피보나치 수열로 배열돼 있으며, 예술과 아름다움의 본질을 묻는다. 첫 장면의 가모 강 위 흰 백로는 보이지 않는 예술가의 운명을 상징한다.
■ 광기와 저항
단편집 ‘세계는 계속된다’(2018)는 뉴욕을 무대로 예술과 존재의 경계를 탐색한다. 작가는 모방과 창조, 질서와 혼돈이 맞물린 세계 속에서 인간이 끝까지 붙잡는 의지를 그린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카프카와 토마스 베른하르트로 이어지는 중앙유럽 서사 전통을 잇는다. 그는 폭력과 구원, 무질서와 예술의 틈을 응시하며, 세계의 끝과 예술의 시작이 맞닿는 지점을 문장으로 파고든다. 문장은 길고 느리지만, 그 호흡 속에서 절망을 통과한 인간의 희망이 남는다.
관련기사
- “12시간 만에 20배↑”… 2025 노벨문학상 라슬로 작품 판매 폭증
-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 ‘사탄탱고’ 예스24·교보 1위… ‘트렌드 코리아 2026’ 또 밀렸다
- 국내 출간된 노벨문학상 작가 라슬로 작품은? … 알마출판사서 6권 출간
- “묵시록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2025 노벨문학상 크라스나호르커이 라슬로 선정 이유
- [속보] 2025 노벨문학상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 노벨문학상 베팅 사이트 공동 1위 크라스나호르커이 라슬로 · 찬쉐
- 교보문고 예측 2025 노벨문학상 후보는? …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 · 찬쉐 · 김혜순 · 황석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