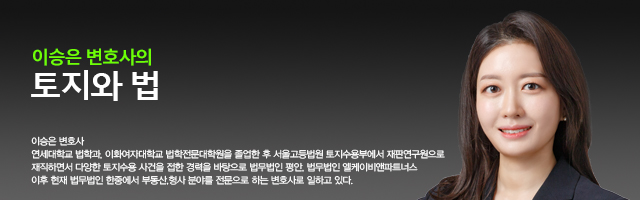지난 주에 대법원에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84년부터 공동거주자 일부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다고 하였다. 즉 A와 B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에 C가 B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C는 A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기 때문에 B의 승낙을 받아서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83도685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2021. 9. 9.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판결로 C가 A 몰래 A의 집에 들어갔더라도 B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이라면 비록 B와의 불륜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의 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의 부재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둘째,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인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 “침입”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거주자의 일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대법원의 별개의견(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과 같이하지만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논거를 달리하는 대법관의 의견) 가운데 “주거침입죄는 목적범(목적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이 아니고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됨) 이러한 목적의 유뮤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논거도 있다.
즉 혼외 성관계의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더라도 주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공동주거권자 일방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판례가 변경되기까지 약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많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즉 국가가 개인의 은밀하고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하여 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더 이상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과 관련돼 있다. 더욱이 간통죄가 형벌상 폐지되어 더 이상 간통이라는 단어도 쓰이지 않게 된 마당에 주거침입죄가 기존대로 처벌된다면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대법원의 바뀐 견해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