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각막궤양으로 입원한 70대 환자 박모씨. 박씨는 오전 3시께 병실에서 자던 중 깨 침대 난간을 넘다가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실신했다. 이후 뇌 컴퓨터단층촬영(CT)상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출혈이 발견됐다. 결국 두개골 내부에 있는 핏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이 생기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한다. 18일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총 1만9153건이다. 건수는 통계 집계 이후 해마다 증가해 5년 전인 2019년(1만80건)보다 약 2배 늘었다. 작년 1~12월 안전사고 건수는 전년(2만273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안전사고 통계 중 사고 유형 등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인증원은 2023년까지 연도별 현황과 작년 상반기 통계는 공개했다.

투약 오류, 전체 사고의 절반 넘어…처치 시간대인 오전 10~12시 빈번
이에 따르면 2023년 사고 유형 중 약물 투여 오류가 49.8%로 가장 많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1.8%로 절반을 넘었다. 약물 용량이 처방전과 다르게 투여됐거나 타인의 처방 약이 엉뚱한 환자에게 들어간 경우 등이다. 약물 투여 경로 오류도 자주 발생한다. 호흡이 힘든 사람에게 구강에 분무해야 할 약을 정맥에 주사하는 식이다.
이럴 땐 흡입용 등 약물 투여 경로별로 투약 카드 색을 달리하길 권장한다. 그러면 응급 시에도 의료진이 투약 경로를 헷갈리지 않고 투여할 수 있다.
2023년 원내 낙상은 전체 사고의 33.9%로 약물 투여 오류의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검사오류(3.3%)와 처치관련상해(2.4%) 등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엔 검사오류, 처치관련상해가 각각 3.6%, 2.2%로 집계됐다.
2023년 안전사고 위해 정도는 중증, 사망, 중등도 이상이 보고된 건수가 전체의 11.1%였다.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6.7%), 입원실(36.3%) 순으로 많다. 낙상은 주로 화장실(3.6%)과 복도(3.4%)에서 발생했다. 발생 시간은 진료와 처치로 붐비는 오전 10~12시(10.1%)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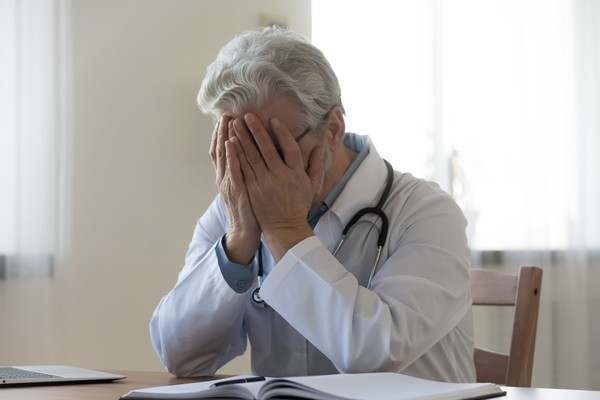
2015년 안전사고 자율 신고제 도입…사고 절반 가까이는 70대 이상
환자 안전사고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고해 집계된다. 병원들이 안전사고를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다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자율 보고를 하되 이를 갖고 처벌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병∙의원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단 뜻이다. 한편으론 환자 고령화로 투약 오류 피해와 섬망(치료 과정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023년에 안전사고의 절반가량(43.4%)이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병원에선 노인 환자가 섬망 증세로 소변줄이나 수액줄을 손으로 뽑아 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들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어지럼증이 많고 인지 기능은 떨어진 데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낙상 발생 요인이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 손상 원인 중 52.2%가 낙상이다. 고령층 낙상은 뇌출혈과 골절을 포함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때문에 찾은 곳에서 되레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런 분석에서 더 나아가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줄이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