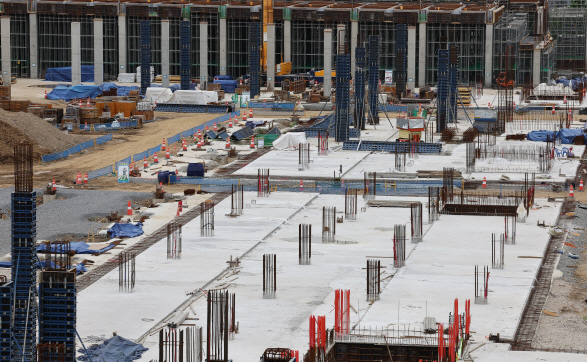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해 원청 업체가 일정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한 '직접 시공 의무제' 강화가 건설업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1일 공개한 '직접 시공 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직접 시공 의무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위탁·하도급 없이 최대 50%까지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규모 공사의 업체 선발 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 시공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건산연은 ‘직접 시공 평가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분업을 기반으로 발전해왔는데 획일적인 직접 시공 확대는 하도급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을 훼손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공사의 품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건산연은 부실공사의 감소와 품질·안전성을 높인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실증적 규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 등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자의 의무가 공사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30억원 이상 일반 공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화됐고, 이는 분업화와 전문화 체계를 근간으로 한 건설 생산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산연은 ▲상위법령 위임하의 정책 운용 원칙 수립 ▲직접시공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완화 대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주 부연구위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 강화보다는 현실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원활한 직접시공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별 특수성이나 업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차원에서 정책을 운용한다면 산업·업계 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업계가 순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관 제도·정책에 대한 보완·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