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글로벌 ICT 업계는 생성형 AI의 시대라 봐도 무방하다. 2024년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픈AI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들이 속속 생성형 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드보이'들도 만만치 않다. 생성형 AI의 폭풍과 함께 등장할 그들의 화려한 귀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년은 가히 생성형 AI의 시대로 부를 수 있다. 그 정도로 오픈AI를 주축으로 하는 생성형 AI 전략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글로벌 ICT 업계를 강타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했다.

인플레이션과 전쟁이 끌어낸 FAANG 2.0
처음부터 생성형 AI가 블랙홀로 부상한 것은 아니다. 팬데믹 당시 공급된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이슈들이 전면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오픈AI가 2022년 말 챗GPT를 전격 공개하며 군불을 떼고는 있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 살 일'이 중요했다.
빅테크를 상징하는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에서 모티브를 딴 FAANG 2.0이 화두로 부상한 이유다. △연료(Fuels) △항공(Aerospace)·방위 △농업(Agriculture), △원자력(Nuclear)·재생에너지 △금(Gold)·금속·광물을 뜻하는 FAANG 2.0은 빅테크를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연료, 즉 에너지는 FAANG2.0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원유, 석탄,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는 그 자체로 인류의 삶과 산업의 지속성을 전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기 때문이다. 에너지 패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존재감은 상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며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엑슨모빌, 셰브런 등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춤을 춘 이유다.
항공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팬데믹이 종료되며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자 항공주들의 강세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블레저(Bleisure) 현상에 힘입어 커다란 상승 동력을 창출했다. 출장과 관광 및 레저를 함께 즐긴다는 개념에서 지금은 엔데믹으로 접어들며 일과 여행의 일상이 무너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블레저 현상을 통해 항공은 물론 우주까지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부상했다.
항공과 더불어 방산 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럽의 군비경쟁이 시작되자 역시 관련 기업들은 함박웃음을 머금었기 때문이다.
비록 '죽음의 상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FANANG 2.0에서 방산의 존재감이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선명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덕분에 미국의 노스롭그루먼, 록히드마틴, L3 해리스 테크놀러지를 비롯해 국내의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주요 업체이 크게 성장했다.

농업도 있다.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식량, 즉 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공급망이 붕괴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각 국의 농업 유통 트렌드가 급변하는 한편 환경오염 이슈도 농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키운 배경으로 여겨진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자 시장 전체가 불안에 떨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IT와 농업의 만남인 애그리테크가 급부상했고, 각 국이 농업 생산물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자 시장의 집중도는 더욱 커졌다.
덩달아 식품 제조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을 만들어내는 ‘푸드 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기술도 부상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가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 지방산’을 활용해 항공기나 우주발사체 제트 엔진에 쓰이는 등유(케로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으며 독일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플랜트 기술에 주력했다.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도 시장의 관심도가 쏠린 아이템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가치도 올라갔고, 에너지 역시 전략 자산화로 삼으려는 각국의 로드맵이 겹쳐지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최근 더 무거운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호주 국립기후복원연구소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도, 혹은 1.5도 올라갈 경우 생물종의 20%가 순식간에 멸종할 수 있다. 또 미국 프리스턴대 연구팀은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올라갈 경우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있는 적도 인근 지방의 인간 생존 한계온도가 치솟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적도 인근에는 전세계 인구의 40%가 살고있다.
그 연장선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은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통해 추후 30년 동안 청정에너지 투자를 연간 4조 달러로 늘리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해 100조달러의 투자 지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유럽연합각료이사회는 2020년 22%인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이유기도 하다. 당장 딜로이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500여개의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딜로이트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50년 전세계 수소 사용량을 2억5900만톤 수준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도 각광을 받았다. 특히 구리에 시선이 집중됐다. 실물 경제를 잘 예측해 '닥터 코퍼(Dr. Copper)'로 불리는 구리는 건설·전자·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쓰여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자재로 꼽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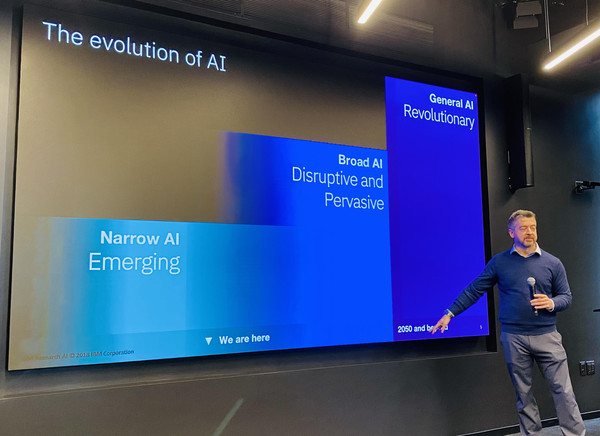
생성형 AI, 블랙홀이 되다
2023년 초 FAANG 2.0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이 뒤바뀐 것은 2022년 말 공개된 오픈AI의 챗GPT가 가공할만한 AI 존재감을 알리며 시작됐다.
물론 AI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워렌 맥클록(Warren McCulloch)과 윌터 파츠(Walter Pitts)가 1943년 AI의 기원이 되는 인공신경망에 대한 최초의 연구성과를 발표한 후 1950년 소위 AI 검사법이라 불리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가 발표될 때가 무려 70년 전이다. 최초의 AI 연구자 학회인 다트머스 칼리지가 열린 것도 1956년이며 그동안 AI는 꾸준히 성장한 바 있다.
부침은 있었다. IBM의 왓슨 실패가 대표적이다.
2015년 출범한 왓슨헬스는 AI와 헬스의 만남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인간 의사의 진료를 돕는 왓슨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내외부의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 등 의료 AI 솔루션들은 국내 부산대병원 등에 도입되며 큰 기대를 받았으나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반발도 컸다. 강력한 기술력과 별개로 이를 응용하고 적용하는 작업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IBM은 결국 2022년 1월 왓슨을 사모펀드인 프란시스코파트너에 매각했다.
다만 챗GPT가 세상을 흔들기 전인 2022년 6월 구글 람다의 영혼 존재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의미심장한 징후는 있었다. 구글의 '책임 있는(Responsible) AI' 부서에서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블레이크 레모인(Blake Lemoine)이 2022년 6월 AI 람다의 학습을 담당하며 "람다에게 인간과 같은 영혼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해프닝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브라이언 가브리엘(Brian Gabriel) 구글 대변인은 람다에 대해 "윤리학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포함된 전문팀이 레모인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근거가 없었다"면서 "레모인은 감각이 없는 현재의 대화 모형을 의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AI가 영혼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아도 최소한 영혼이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오픈AI의 챗GPT가 글로벌 빅테크의 블랙홀로 전격 부상했다. 구글 알파고 쇼크 이후 가장 강력한 AI 웨이브가 온 세상을 강타한 셈이다. 당장 구글도 맞불을 놨다. 람다 기반의 바드를 출격시킨 후 포털에 AI를 탑재하는 방식을 택해 빙에 챗GPT를 넣는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동맹군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제미나이까지 등판했다. 알파고의 구글 딥마인드와 구글 리서치(Google Research)를 통합한 후 대규모 협업에 나선 결과 탄생한 제미나이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코드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여러 정보를 동시에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이다.
총 3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는 방대하고 복잡한 작업에 적합한 가장 유용하고 규모가 큰 모델(Most capable and largest model for highly complex tasks)이며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는 다양한 작업에서 확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 (Best model for scaling across a wide range of tasks)이라는 설명이다. 또 가장 하위 라인업인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는 온디바이스 작업에 가장 효율적인 모델 (most efficient model for on-device tasks)이다.
생성형 AI가 부상하자 FAANG 2.0의 바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물론 글로벌 거시경제에서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생성형 AI가 빅테크 업계는 물론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바꾸며 FAANG 2.0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내려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타 등등'의 반격
생성형 AI가 업계의 블랙홀이 되자 다른 ICT 이슈들은 더욱 숨을 죽였다. 팬데믹 당시 온택트 트렌드를 통해 다양한 존재감을 보였으나 생성형 AI에 철저히 가려지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로 들어서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생성형 AI가 여전히 위세를 보였으나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비롯해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 전반에 대한 관심, 나아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이슈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마트홈 전반에 대한 각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선명해지며 입체적인 전략도 속속 공개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