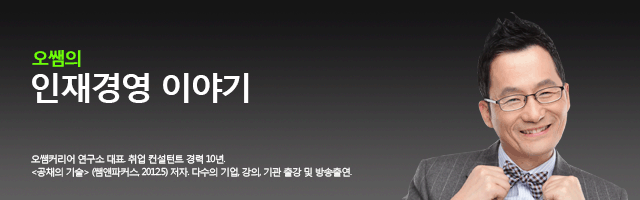SBS 수목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 나온 세종, 배우 한석규의 모습은 다소 파격적이었다. 신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했고, “하례는 지랄”, “이런 개 엿 같은 경우가 있나!”, “광평만은 살려다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다… 이럴 줄 알았냐?”와 같이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때론 궁녀에게도 말을 가려 하시라는 충언을 받기도 했다.
세종은 보수 관료들과 함께 경연을 했다. 경연은 신하가 왕을 학문으로 제압하는 제도였다. 세종은 신하들과의 토론장인 ‘경연’을 한 달에 5번 이상씩 열었다고 한다. 드라마에서도 ‘경연’을 빠지지 않는 세종에 신하들이 툴툴거리는 내용이 나온다. 이번에는 세종이 ‘경연’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조직 리더의 자세를 살펴보겠다.
<뿌리깊은 나무> 드라마 4회에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경연 장면이 나온다. ‘부민고소금지법(아랫사람이 웃어른이나 상관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은 선왕 시절 금지된 것이었는데 왜 다시 경연을 하느냐고 반대하는 신하들과 토론하는 모습이다. 웃음과 여유로 토론을 운영하던 세종은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신하들의 계속되는 의견을 들으며 눈에 튀는 행동을 한다. 세종은 자신의 옷소매에 있던 옥패를 꺼내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는 상태에서 붓으로 글자를 적어놓는다. 글자는 ‘우라질(于癩疾)’이다. 무슨 글자를 쓰는지 모르는 신하들은 의견을 계속 말했고, 글자를 다 쓴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덧붙인다. 신하들의 태도는 의기양양. 그러나 세종은 새로운 질문을 하면서 반전을 만든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반전의 내용보다는 ‘우라질’이라는 글자다. ‘우라질’은 그냥 감정언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종은 화가 낫고 그것을 신하들을 향해 소리치기보다는 옥패에 그 감정을 ‘글자’로 쓴 것이다. 신하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말이다.
만일 세종이 ‘토론의 장’인 경연에서 신하를 향해 ‘우라질! 다들 물러가거라!’ 소리쳤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말하고 싶은 것,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세종이 그 다음날 스스로 감정을 정리한 후, 새로운 마음으로 경연을 시작해도 왕의 눈치만을 살피는 신하들은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토론’은 없고, 단순한 ‘지시’만이 있을 것이다. 판은 깨지는 것이다. 화나는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들이 ‘노(怒, 화내다)’한 횟수 비교가 나온다. 태종은 ‘노하다’ 94회, ‘크게 노하다’ 3회였던 데 비해, 세종은 ‘노하다’ 16회, ‘크게 노하다’ 3회로 적다. 세종도 화난 상황을 많이 맞았지만 그대로 화를 내지 않았던 관대한 성격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종은 ‘토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드라마에서도 아버지 태종은 힘과 권력으로 의견 다른 상대를 제거하고 물리쳤지만, 세종은 ‘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한다. 세종이 즉위한 뒤 처음 한 말이 “의논하자”였다.
조직의 리더에게 필요한 혼잣말은 ‘우라질’이다. 회사 사정 모르고 이야기하는 직원들, 팀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미달인데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팀원을 보면 화가 날 수 있다. 그 상황에 세종과 같은 ‘옥패’에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우라질!!’이라고. 팀원과 직원에게 쏟아 붓기 전에 말이다. 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헌신이 필요한 세상이다.
직원의 몸을 얻는 데 그치지 말고, 직원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필요하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지 말고, 화를 내는 횟수를 줄이고, 혼잣말로 ‘우라질!’이라고 크게 외쳐보자. 권력과 권한을 가진 조직의 리더는 화가 날 때, 아무도 못 듣게 혼잣말로 ‘우라질!’하고 외치자. 이것이 조직 리더에게 필요한 소통의 자세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