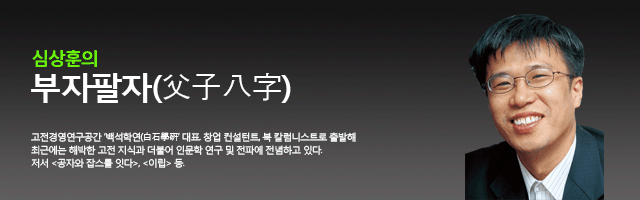伐柯伐柯 其則不遠(벌가벌가 기칙불원)-도끼자루를 베고 또 벰이여 그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중용>)
[한자 풀이] 伐 칠 벌, 柯 도끼자루 가, 其 그 기, 則 법 칙, 不 아니 불, 遠 멀 원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을 일컫는 ‘10철(哲)’ 중 한 명이었던 염유는 본명이 ‘염구’였다. 공자보다 29세 연하로, 자(字)는 자유(子有)이다. 따라서 ‘염유’라는 호칭은 성(姓) 씨에다 자를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제자 자유(子遊) 언언(言偃)과 구별하기 위해 그리 쓴 것 같다. 그런데 <논어(論語)>본문엔 왜 염구(冉求)라고 표기한 것일까. 그것은 스승(공자)과 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스승 앞에서는 자를 쓰지 않고 이름을 쓰는 것이 예다. 어쨌든 본문 뜻은 이렇다.
염구가 말했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부족입니다.”
공자가 답했다. “역부족자는 중도에 이르러 그만두는 데, 지금 네가 미리 금을 긋는구나.”
이러한 스승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덕분일까, 염구는 정신을 차린다. 다시 공자 문하에서 학문에 정진한다. 공자와 함께 천하주유를 마칠 무렵,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출세한다. 노나라 계강자(季康子)의 부름을 받는다. 그리하여 계강자 밑에서 재(宰, 관리책임자)로 활동한다. 게다가 큰 공을 세운다. 염구가 공을 세운 덕분에 공자는 쉽게 자신의 고향 땅, 노(魯)나라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막상 노나라에 돌아온 공자는 염구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았고 거리를 두었다.
그 이유가 있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염구는 자공과 달랐기 때문이다. 염구는 ‘가난한 이의 재물을 빼앗아 부자들을 돕는 식’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 스승 공자는 염구에게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자공에겐 그렇지 않았다. 자공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중국 최고의 부호인 월(越)나라의 범려와 후대에 활동했던 진나라 상국 여불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즉, ‘폐거(廢擧)’를 사용했다. 폐거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이 때문에 공자는 제자 자공을 염구처럼 비난하거나 욕하지 못했다.
자공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 그러면서도 노나라, 위(魏)나라의 재상(정치가)으로도 성공한다. 이에 반해, 염구는 노나라의 실력자가 되는 권세와 부를 누리지만 스승 공자에겐 끝내 인정을 받지 못한 제자로 남아야 했다. 공자학당에서 파문을 당했다는 설도 있다.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논어>, ‘위령공’)
이 팔자(八字)는 자공이 평생 사랑했고 실행했던 글귀이다. 일찍이 자공은 스승 공자에게 물었다. “평생 동안 실천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공자는 여덟 글자인 ‘己所不欲 勿施於人’로 답을 줬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남에게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자공은 평생 실천하고 지키고자 했다.
염구는 계강자 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았다. 크게 울렸다. 이것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앞장을 섰다. 그래서 그랬는가. 염구는 계강자의 가신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공자의 제자로는 실패했다. 공자 사후, 공자의 문하와도 왕래가 끊어진다. 더욱이 후배들이 염구를 따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공은 노나라, 위나라의 재상으로 계속 출세를 하면서도 공자 사후에도 공자 문하의 후배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다.
조선 양반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조선의 양반가는 어떻게 공부했을까. 양반가에 아이가 태어나고 글을 알 나이가 되면 주로 <천자문>, <계몽편>, <추구>, <동몽선습> 등의 글을 배우게 했다고 한다. 남자 아이의 경우, 8세가 되면 ‘人生八歲 皆入小學(인생팔세 개입소학)’이라는 말처럼 모두 <소학>을 떼어야 했다.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인들이 자녀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는 방송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의 방영분 가운데 충남 공주에 있다는 옛날식 서당이 나온 적 있다. <사자소학>을 공부하는 모습이 잠깐 등장했는데 아빠와 아이들 모두 훈장님의 회초리가 무서워 밤새 익히느라 곤혹스러워했다. 한문에 약하기는 아이나 그 부모나 다를 바 없었다. 당황하고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무튼 옛날에는 TV에 나오는 아이(8세 기준)들이 서당에서 <소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보통 사서삼경(四書三經)에 입문하는 코스가 정석이었다.
사서삼경은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주역)>을 말한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주희는 얘기했다. 다르게 공부하라는 수순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중용→맹자→논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경→서경→역경 수순이 그것이다. 학습자의 능력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빠르면 10세, 늦으면 20세에 이르러서야 사서삼경을 모두 뗐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 출사(出仕)를 하기 위한 과거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보면 된다.
이로 볼 때, 양반가문의 아이로 태어나서 공부하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니 뒤늦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 있다.
공문(孔門)을 잇는 두 가지 필살기, 시를 배워라, 예를 익혀라
3000명의 제자를 키운 공자의 아들 교육은 실상 별 게 없었다. 개인지도라고 할 것이 없었다. 특별하지 않았다. 그저 두 가지만 집 마당에서 아들 공리(孔鯉)에게 요구했을 뿐이다. 그 하나는 ‘시를 배우라는 것(學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예를 배우라는 것(學禮)’이었다. 시를 공부해야 남들과 대화가 가능하고(以言), 예절을 익혀야만 사회에 나아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남 앞에 설 수 있다(以立)라고 아들에게 귀띔했을 뿐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준 팔자가 성립이 된다. ‘學詩以言 學禮以立(학시이언 학예이립)’이 그것이다.
뒤에 장가를 든 공리는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을 ‘급(伋)’으로 지었다. 급(伋) 자는 ‘움직이는 모양’을 뜻하는 낱말이다. 아버지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공리는 아들 급이 공문의 적통을 잇는 ‘사람(人=亻)’이 되길 바라는 뜻으로 아버지(공자)가 강조한 두 가지(학시, 학예)에 미치는(及) 사람으로 아들이 성장하길 희망했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을 ‘급伋’이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급의 자는 ‘자사(子思)’이다. 맹자(기원전 372~289년)보다 약 100년 전 사람이다. 전국 시대 초기에 활동했다. 아버지 공리는 50세에 죽었으나 자사는 62세로 공문의 사람으로는 비교적 장수 한 편이다.
자사는 공문의 전통에 따라 아버지에게 직접 배우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제자이자 아버지와 비슷한 또래인 증자(曾子)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자사도 성장하고 난 다음 차후에 할아버지처럼 제자를 교육했다. 이랬던 자사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맹자가 배웠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사기> ‘공자세가’에 따르면, 자사가 ‘나이 62세에 송(宋)에서 곤액(困厄)을 치르면서 <중용>을 지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이다. 전공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다. <중용>의 작자가 ‘자사가 아닐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중용>의 지은이로 자사를 굳게 믿고 싶다. 이러는 이유가 있다. <중용>은 대개 ‘중니가 말했다, 공자가 말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점과 본문 가운데에 특히, <시경>의 인용이 여럿(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29장, 33장)이 보여서다. 이 때문에 공자 집안의 필살기라는 생각을 떨쳐 낼 수 없어서다. <중용> 13장엔 다음과 같은 여덟 글자가 등장한다. 이 여덟 글자 역시 <시경>에서 따온 거다.
伐柯伐柯 其則不遠(벌가벌가 기칙불원)(<중용>, 13장)
벌(伐)은 ‘친다’라는 뜻이다. 이어서 도끼자루를 뜻하는 ‘가(柯)’가 등장하므로 “도끼자루를 들고 벤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기(其)는 ‘그’라고 풀이한다. ‘도끼자루로 나무를 베는 그것은’의 ‘그’를 의미함이다. 칙(則)은 ‘법칙’이니 ‘방법’으로 풀어도 좋다. 불(不)은 ‘아니다’로, 원(遠)은 ‘멀리’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끼자루를 들고 (나무를) 베고, 또 벰이여 그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로 해석이 된다.
도끼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도끼자루를 구하기 위해 적당한 나무를 찾는데 보이지 않는다. 이 나무, 저 나무를 뒤져 봐도 알맞은 나무를 찾지 못해 아무런 생각 없이 쿵, 쿵 아무 나무나 찍는다. 힘만 든다. 땀이 연신 쏟아진다. 그런데도 답이 보이질 않는다. 도끼자루로 쓸 나무를 가까이서 찾지 못하고 멀리에서만 답을 구하고자 한다. 답은 사실 제 손안에 있는데도 말이다. 제 손안에 도끼자루를 흘겨보지 않고 자세히 보았더라면 그 모양을 보고 적당한 나무를 베어 도끼자루를 만들면 되는 간단한 이치를 놓치고 있는 답답함을 지적하는 여덟 글자다.
답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멀리 있지 않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애쓴다. 힘이 빠진다. 뻘뻘 땀만 흘린다. 이런 사람이 많다. 방법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는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은 상식이고 지식에 머문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에 안주해 똑같은 곳에서 답을 얻고자 한다. 연목구어(緣木求魚)를 하는 셈이다. 상식을 파괴해야 한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기대해야 그 답이 보인다.
현대의 서산간척지 방조제 사업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임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위기 탈출의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학계에도 물었다. 심지어는 해외 건설사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보았다. 답을 찾지 못해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기술직 임원들은 최신 장비들을 다 써보았다. 이것도 답이 아니었다. 답은 코 밑에 있었다. 다른 임직원들이 도끼자루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룹의 회장은 당시 울산에 정박해 있던 23만톤급 폐유조선 워터베이호를 생각했다. 이게 도끼자루감이 될 바로 그 나무였다. 그렇다. 문제의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울산에 있었다. 멀리 외국에 있지 않았다.
공자와 정주영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만나고 싶어도 실제로는 만날 수 없는 2000년 전 사람과 2000년 후에 사람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정주영은 공자가 말한 물획(勿劃)을 배운 것일까. 또 어떻게 시경에서 말하고, 중용에서 언급하는 여덟 글자 ‘伐柯伐柯其則不遠’의 참뜻을 받아들인 걸까.
그는 다른 사람이 지식을 구할 때, 지혜를 구한 위대한 경영자다. 지혜로운 경영자는 항상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고 논다. 진지한 놀이(serious play)를 한다. 끝까지 도전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마음으로 금을 긋지 말자. 도끼자루를 만드는 방법은 내가 들고 있는 도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자. 공자처럼, 정주영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법 없이, 또 멀리서 답을 찾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