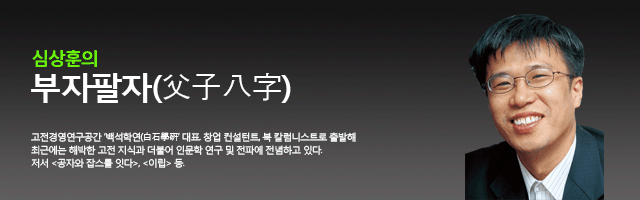伐柯伐柯 其則不遠(벌가벌가 기칙불원) - 도끼자루를 베고 또 벰이여 그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중용>)
[한자 풀이] 伐 칠 벌, 柯 도끼자루 가, 其 그 기, 則 법 칙, 不 아니 불, 遠 멀 원

학력(學歷)은 학력(學力)을 이길 수 없다. 날로 달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학교 졸업장은 한낱 종잇장과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쓰레기에서 쓸 얘기 즉, 쓸 수 있는 이야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찾을 줄 알아야 성공한다.
학력(學歷)에만 선을 긋는다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채움은 오지 않는다. 학력(學歷)이 지식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라면 학력(學力)은 지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 1731~1800)의 말이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가 되기에는 멀고, 가끔은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하다. 지식은 타인의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에 머물지만, 지혜는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마음속에 있다.”
지혜와 실행은 학교 졸업장과 무관하다
지식은 나만 있지 않다. 남들도 갖고 있다. 하지만 지혜는 다르다. 나 외에 남이 가질 수 없어서다. 다음은 <리틀 빅 씽>에 나오는 한 내용이다. 참고로 <리틀 빅 씽>은 세계적인 ‘경영의 구루(guru·뛰어난 스승)’ 톰 피터스가 쓴 책의 제목이다.
호텔업계에서 힐튼호텔의 창업자 콘래드 힐튼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다 (중략) 그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가치 창출에 노력하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고철 덩어리는 가치는 없지만 이것으로 말발굽을 만들면 10달러를 벌 수 있다. 그리고 명품시계의 부품을 만들면 250만달러를 벌 수 있다.
그는 은행 경비원에 지원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이유로 취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어서 성공을 일구어냈다. 그는 “내가 만일 글을 읽을 줄 알았다면 지금도 경비원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톰 피터스 지음, 최은수·황미리 옮김,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 법칙, 리틀 빅 씽>, 더난출판사 펴냄)
힐튼은 쓰레기(고철 덩어리)에서 쓸 얘기(말발굽, 명품 시계의 부품)를 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는 다행히 글을 읽을 수 있는 학력(學歷)이 없었기에 은행 경비원에 취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그는 세계적인 힐튼호텔의 창업자로 새 길을 모색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임자, 한 번 해 봤어?”
학력(學歷)이 짧았던 현대그룹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이 즐겨 썼던 말로 유명하다. 정주영 회장의 주변에는 주로 학력(學歷)이 긴 인물들이 조직의 임원진으로 참여했고 참모가 되어 활동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의도의 33배나 달하는 서산간척지 방조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이다. 현대에 빨간 불, 즉 비상이 걸렸다. 위기가 닥쳤다.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가두고 그 물을 빼서 육지를 만드는 간척지 사업의 핵심 기술인 물막이 공사가 최종난관에 부닥친 것이다. 그것은 6.4㎞의 A지구 방조제 공사였는데, 공사의 마지막 남은 270m의 해결 방법이 속수무책이 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 9m, 4.5톤이 넘는 자동차만한 바위도 순식간에 휩쓸려가는 초속 8m의 급류가 휘도는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주영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임직원들은 앞 다투어 정주영 회장에게 보고했다. 일테면 이런 식이었다.
“학계에도 문의해 보았고 해외 건설사에도 컨설팅을 의뢰해 보았지만 모두 속수무책입니다.”
“……”
당시 정 회장은 굳게 침묵하고 있었다. 또 다른 보고가 들려왔다.
“최신장비들을 다 써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볼멘 이야기들만 해댔다. 이때였다. 조용히 경청하던 정 회장이 침묵을 깼다. 그러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박또박 말을 꺼냈다.
“큰 배를 가라 앉히는 것은 어떨까.”
당시 울산에 정박해 있던 23만 톤급 폐유조선 워터베이호를 염두해 두고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회장님, 그게 가능한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임자 해봤어? 학교에서 배운 이론대로만 따라하면 세상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유조선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2013년 11월 11일. SBSCNBC 방송, ‘경제 포토에세이 멘토의 유산-정주영’)
1984년 2월 24일의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정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길이 322m의 대형 유조선으로 서서히 그리고 정확하게 못다 이은 방조제 최대 난관 코스의 틈을 막아내는 것에 성공한다. 이른바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데, 정주영 공법 때문에 세계가 놀랐다.
원래 공사의 계획공기는 45개월이었다. 하지만 현대는 9개월 만에 완공을 마쳤다. 정주영의 지혜를 빌린 덕분에 가능했다.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 2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의 언론은 찬사를 보냈다. 뉴스위크와 뉴욕타임스에도 자세히 소개가 됐다. 그리하여 수많은 선진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정주영 공법’을 배우고자 문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힐튼처럼 정주영도 학력(學歷)은 낮았다. 그럼에도 학력(學力)과 지혜는 누구보다도 높았다. 정주영 어록의 압권을 차지하는 “임자, 해봤어?”라는 말은 ‘실행을 중시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의 리더십이다.
탁상토론으로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이 중요하다. 실행을 통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을 검증해도 때는 늦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획(勿劃)’에 있다. 물획은 ‘미리 선을 긋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孔子)가 한 말이다. 공자는 제자들이 해 보지도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아주 꼴 보기 싫어했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안 된다고 반대만 하지 말자. 이야말로 해보지 않겠다고 미리 금을 긋는 행위이다. 의욕이 없는 것이다. 다르게는 기쁨을 잃은 것이다. 사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실행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노력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시작만이 있다. 늘 끝을 보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맹자가 전국 시대에 주로 활동했다면 이에 앞서 200년 전에 공자는 이미 춘추 시대에 활동했다. 전국 시대의 최고 스타는 사공자, 즉 맹상군·신릉군·춘신군·평원군이었다. 사공자를 따르는 식객이 무려 3000명이었다. 이에 발분하여 상인 출신으로 진나라의 상국이 된 여불위도 식객을 3000명이나 모아서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사공자나 여불위의 식객은 권력과 금력을 동원하여 모은 숫자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후(왕)들의 견제가 따르면 하루 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자는 달랐다. 비록 ‘상갓집 개’처럼 보였고, 권력이나 금력도 공자에겐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문하에 든 제자가 3000명이었다. 사공자나 여불위가 활동하기 이미 200년 전에 말이다.
공자의 3000 제자 중 핵심인물은 얼마였을까. 72명이라는 설도 있고 77명이라는 설도 있다.
77명이라는 설은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에 의해 소상히 밝혀진 바 있다(<중니제자열전>). 정확히는 35명의 제자만이 연령과 성명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 42명은 이름만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를 ‘10철’이라고 한다. 즉, 10명의 수제자를 말한다. 이를 소개하자면, 안연·민자건·염백우·중궁(덕행)이 있었고, 재아·자공(언어)이 있었고, 염유와 계로(정사), 자유와 자하(문학)가 있었다.
10철 중에 공자가 천하주유를 할 적에 끝까지 스승을 따른 인물로는 안연, 자공, 염유, 계로가 단연 중심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자보다 먼저 죽은 제자가 둘 있다. 안연과 계로다. 이 두 사람은 그다지 출세하진 못했다. 하지만 나머지 인물, 자공과 염유는 달랐다. 스승 공자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정치가로 출세했다. 또 재산도 많이 모았다. 가난하지 않고 부자로 살았다.
자공과 염유는 나이가 비슷한 또래이다. 염유가 두 살 연상이었다. 이 두 사람이 공자 문하에 들기 전에도 자공은 부유했다. 하지만 염유는 그렇지 않았다. 가난했다. 이 때문에 염유는 공자에게 배워서 빨리 출세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실은 잘 풀리지 않았다. 사방에 벽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염유는 특히 정사에 뛰어났다. 이런 발군의 재능을 가졌지만 관직 운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생각이었다. 정사 과목에 라이벌이었던 계로(자로)가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염유는 정반대였다. 소극적인 성격이었다.
이 성격이 학업에 걸림돌이 됐다. 이러한 제자의 심리 상태를 스승은 금방 눈치 챘다. 이 때문에 염유는 공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冉求曰 “非不說子之道, 力不足也.”
(염구왈 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
子曰 “力不足者, 中道而廢, 今女畵.”
(자왈 역부족자 중도이폐 금녀획) (<논어> ‘옹야’편)
질책이 있은 덕분일까. 염유는 다시 마음을 잡는다. 학업에 매진한다. 그리하여 공자의 천하주유(14년)에 동행한 것이다. 안연과 계로, 자공과 함께 스승 공자를 따르는 것을 끝까지 해냈다. 이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