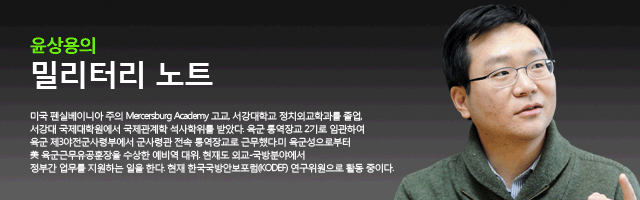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콜라업계의 양대 산맥인 코카콜라(Coca Cola)와 펩시콜라(Pepsi-Cola)는 먹거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 때문에 힘겨운 시기를 맞게 된다. 건강음료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콜라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96년, 펩시는 역사에 남을 전대미문의 프로모션 사업을 시작했다. 이른바 포인트 교환제인 ‘펩시 포인트(Pepsi Point)’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펩시 포인트 프로모션의 내용은 단순하다. 펩시를 샀을 때 10센트를 1포인트로 환산한 후, 누적 포인트를 모아오면 그에 맞는 상품인 일명 ‘펩시 스터프(Pepsi Stuff)’로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간단하게 계산하자면 펩시 캔 한 개가 1달러였으므로 음료 캔 하나가 10포인트가 되는 식이다. 특히 이 ‘펩시 스터프’는 포인트에 따라 셔츠나 스포츠 용품, 등산의자 등 꽤 쏠쏠한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호응이 괜찮았다. 예를 들어 펩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하나를 얻기 위해선 80개의 ‘펩시 캔’에 붙은 펩시 포인트를 모으던가, 아니면 2ℓ짜리 펩시 페트 병 40개 분의 포인트를 모으면 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 프로모션이 세간의 관심을 불러모았던 가장 큰 이유는 1등 상품 때문이었다. 펩시 측이 7백만 포인트를 모으면 당시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맥도넬더글러스(McDonnell Douglas, 1997년 보잉과 합병)사가 미 해병대용으로 면허생산 중이던 ‘해리어 수직이착륙기(AV-8 Harrier II)’를 제공하겠다고 걸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펩시 측은 이 야심 찬 기획을 진행하면서 TV 광고까지 제작했다. TV 광고에서는 한 어린 학생이 해리어 전투기를 타고 학교에 간 후 학교 마당에 해리어를 착륙시키면서 “버스보다 훨씬 빠르군!”이라고 말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놀라는 가운데 “7백만 포인트를 모으면 해리어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자막을 내보내 펩시 팬들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그런데 ‘펩시 포인트’ 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1996년 초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 광고를 보던 당시 스물한 살의 대학생 경영학도인 존 레너드(John Leonard)라는 청년은 이 ‘7백만 포인트’라는 것이 실제로는 10센트당 1포인트이므로 결국 70만달러(한화 약 7억3천만원이지만, 당시 환율 기준으로는 약 5억6천만원 정도 됐었다)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존 레너드는 1996년 3월 28일자로 펩시 측에 그간 모은 15포인트와 함께 자신의 변호사 신탁계좌에서 $700,008달러 50센트 수표를 끊어 보냈으며, “10센트당 1포인트 가치이니 이 돈으로 7백만 포인트를 구입하겠다. 배송비용 명목으로 추가 10포인트를 더했으니, 상품인 해리어 전투기를 보내달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참고로 당시 해리어 한 대의 가격은 형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약 $2300만달러에서 $3000만 달러(약 250억원~311억원) 수준으로, 이것을 정말 $70만달러로 살 수 있다면 펩시 측은 소비자에게 1/34에 불과한 싼 가격으로 전투기를 증정하겠다는 의미였다. 사실 펩시 측에게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이런 계산상의 허점을 눈치챈 것이 레너드 씨 한 명뿐이었다는 점으로, 만약 열 댓 명이 눈치챘었다면 펩시는 사운이 기울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뒤늦게 실수를 눈치챈 펩시 측은 당황했다. 펩시 측에서는 곧장 레너드 씨에게 “해리어는 이번 펩시 포인트 기획을 홍보하기 위한 조크(joke)였을 뿐, 실제로 증정하는 상품이 아니다. 일례로 펩시 측에서 상품 교환을 위해 발행한 카탈로그에는 해리어가 실려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아 답장을 보냈다. 펩시 측 대변인은 “누가 봐도 농담에 불과했던 물건에까지 일일이 다 책임 부인권(disclaimer)을 써 붙여야 한다면, 도대체 어느 선까지 광고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성명까지 냈다.
레너드 씨는 곧장 계약위반, 사기, 허위광고 및 불공정한 상거래 혐의로 펩시를 고소했다. 마이애미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이 소송은 4년 가까이 송사가 이어진 끝에 1999년 뉴욕 맨해튼의 연방 법원까지 올라가 “레너드 대 펩시코(Leonard vs. Pepsico) 사건[88 F. Supp. 2d 116, (S.D.N.Y. 1999), aff'd 210 F.3d 88 (2d Cir. 2000)]”, 혹은 통칭 “펩시 포인트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결국 사건을 맡은 뉴욕 주의 킴바 우드(Kimba Wood, 1945~ )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우선 광고에서 해리어 전투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만약 광고만으로 고객과의 계약이 성립됐다고 치더라 손, 상식적으로 업체 측이 $2300만달러에 달하는 전투기를 고작 $70만달러로 제공할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레너드 씨가 주장한 “사기”에 대해서는 쌍방이 문서화된 정식 계약서를 완성한 후 그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애당초 계약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실 이 판결 부분 자체는 다소 간 반박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핵심은 이 ‘광고’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진정성이 있는 ‘오퍼’였냐는 점에 집중됐는데, 법원 측은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청소년이 수년 간 조종훈련을 거쳐야 조종할 수 있는 제트기를 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고 진정성이 있는 광고였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해당 광고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사춘기 시절 환상을 부풀려 자극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보았다. 1999년 8월, 우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문을 읽었다.
“지상 목표물 및 공중 목표물을 공격 및 파괴할 수 있으며 무장 정찰 및 공중 요격을 수행할 수 있고, 전투기를 상대로 공격 및 방어전을 실시할 수 있는 해리어 제트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아침에 이 기체를 타고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을 묘사한 펩시사의 광고는 명백히 진지한 의도의 광고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주장처럼 군사용도의 기능을 제거시키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진정성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레너드 씨는 2차 순회심판 상고 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에 항소했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판결로 우드 판사의 판결과 동의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논점이 된 허위 과장 광고나 사기 등에서 존 레너드 씨가 승소 혹은 부분 승소를 했다고 쳤을 때 해리어 제트기를 소유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다.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럴 일은 없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 미 국방부는 해당 해리어 전투기가 비행 가능한 상태로 판매할 수 없는 군용물자라는 점을 들어 광고 금지 명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해리어 전투기가 민간에게 판매되기 위해서는 ‘비 군사용도화(demilitarized)’ 되어야 하며, 수직이착륙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장 능력이나 비행능력까지 모두 제거시켜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날 수 없는 항공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펩시 측은 ‘펩시 포인트’ 프로모션에서 해리어 전투기 광고를 중단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군용 장비는 국가 이외의 주체는 소유할 수 없으며, 무기가 갖는 폭력성은 오직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수출허가제도(E/L: Export License)나 방산통제법 등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레너드 씨가 정말로 해리어를 몰고 대학 캠퍼스를 누빌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시 해리어를 수령하게 되면 되팔아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이미 다섯 명의 투자가를 모집해놨었던 것을 보면 후자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스럽게도 미 연방법원의 판단은 군용물자가 민간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