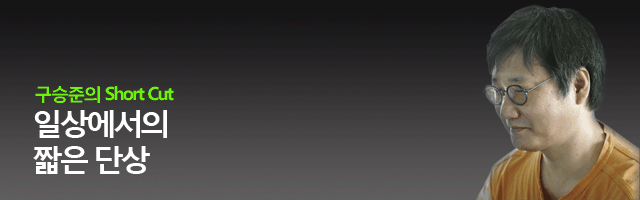“형, 차 맛이 기가 막히죠? 게다가 가격도 우리 차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형, 차 맛이 기가 막히죠? 게다가 가격도 우리 차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열에 들뜬 후배의 서슬에, 찻잔을 손에 쥔 채로 고개부터 끄덕였다. 최근에 대만 여행을 다녀왔다더니, 실상은 대만 차(茶)여행이었나 보다. 후배의 아내는 대만의 명차 산지만 찍고 다니느라 타이페이 시내 관광도 제대로 못 했다며 샐쭉한 표정을 지었다. 여행의 전리품인 양 찻상에 도열한 문산포종차, 목책철관음, 동정오룡차, 타이완고산차 등을 보니, 마오콩, 핑린, 룽탄, 아리산 등으로 이어지는 후배 부부의 여행 경로가 손바닥 보듯 머릿속에 그려진다.
운도 좋았다. 타이완은 차 산지별로 봄가을에 ‘비새(比賽)’라는 차 품평대회를 여는데, 후배의 여행 일정과 얼추 맞아서 최고 등급인 ‘특등장(特等獎)’ 급의 차를 저렴하게 샀노라고 자랑이 이어졌다. ‘특등장’을 받으면 으레 타이완 각지의 도매상이며 애호가들이 몰려와 한두 달 만에 품절되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도매상들이 높은 마진을 붙인 소매가에 사는 수밖에는 없다. 나 역시 작년 겨울, 타이완의 차 명인에게서 ‘특등장’ 바로 다음 등급인 ‘두등장(頭等裝)’ 목책철관음을, 그것도 하나 남은 재고 한 통을 간신히 구했을 정도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맛을 내는 한국 녹차를 사려면 돈이 두세 배는 들잖아요. 게다가 저 같은 초보는 차를 사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된 물건을 샀는지, 솔직히 미심쩍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차 상인들의 ‘구라’도 보통 아니잖아요? 미안한 소리지만 해가 갈수록 차 만드는 실력은 안 늘고, ‘말빨’만 느는 거 같다니까요. 하하하….”
아주 없는 소리는 아니다. 이따금 ‘무슨 무슨 차 페스티벌’ 식의 이름이 붙은 행사에 가보면, 차 맛을 설명하는 알쏭달쏭한 말의 향연이 만화 <신의 물방울>의 와인 품평에 못잖다. 첫맛의 청명한 기운이 정수리 백회혈을 열고, 중후한 후미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돌아 가히 꼬리뼈를 휘감을 기세다. 차를 마셔온 햇수가 쌓이며 차 맛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입문자라면, 싸면 싸서 찝찝하고 비싸면 비싸서 찜찜한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하면, 대만은 차 구매자에게 천국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차가 일단 만들어지면 판매하기 전에 심사를 통해 차의 등급을 매겨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품다(品茶)’의 방식이나 기준도 누구도 승복할 수밖에 없게 정교하고 엄정하다. 찻그릇의 용적 대비 2퍼센트 중량의 차(즉, 물과 차가 50대 1)를 100도씨 물로 5분 동안 우려내는 포다법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마른 찻잎을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탕색(湯色)이며 향기, 맛, 우린 후의 엽저(葉底) 등 체크하는 항목만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런 식의 유통구조라면, 싼 차를 사든 비싼 차를 사든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제 차 명인들이 저마다 ‘하늘 아래 내가 최고’ 식의 우물 안 개구리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차 품평대회도 없지만, 그나마도 으레 고질병처럼 구설수가 따라붙는다.
후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게 물었다.
“이런데도 굳이 한국 녹차를 마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빙긋이 웃음이 새나왔다. 나도 한 번쯤 떠올려본 의문이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해마다 이맘때면 아내의 지청구를 견디며 녹차를 대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이 가진 방대한 차의 레퍼런스 안에서도 아직껏 발견하지 못한, 우리 녹차만의 청량한 물맛 때문이다. 어쩌면 차 상인들의 과장적인 설레발(?)은 우리 차가 가진 오묘한 맛의 세계에 가닿으려는 의지의 소산인지도 모른다. 은근하다고만 말하기에는 엄동설한을 견뎌낸 찻잎이 가진 골수까지 파고드는 강한 기운이 있고, 뭔가를 느껴보려고 눈을 감으면 좀처럼 포착되지 않는 향기와 맛이 시쳇말로 ‘무심한 듯 시크’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토종 녹차가 가진 이러한 개성을 충분히 살린 한국식 제다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차에서 대만 차의 향기가 맴돌고, 일본 차의 탕색이 비치는 일이 적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이식된 ‘야부기다’ 등 일본산 차나무가 우리 차를 대변하는 일마저 종종 벌어진다. 연초에 프랑스의 명품 차 업체인 ‘마리아주 프레르(Mariage Freres)’에서 한국 녹차를 수입해 출시했다고 화제가 된 일만 해도 그렇다. 용기에 ‘차’라는 한글까지 대문짝만 하게 달고 나왔지만, 알고 보면 제주도에 심은 일본 품종 찻잎을 가지고 만든 일본식 증제차라는 게 가슴 헛헛한 진실이다. 언제쯤 한국 토종 녹차의 품성이 세계 차 시장에서 고유한 영역을 인정받게 될까. 그래도 요즘 내 책상 위를 장악한 것은 갓 나온 우리 햇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