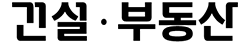‘서울 24.9배, 뉴욕 11.0배, 코펜하겐 9.0배, 리야드 3.1배.’ (넘베오, 지난해 말 기준)
집값의 버블을 측정하는 추산법인 ‘연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로 비교한 서울과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 수준이다.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버는 세대가 사는 지역에서 중간값의 집을 사는 데 급여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때 걸리는 햇수를 뜻한다. 국제 금융 기구인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미국∙덴마크∙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7만7950달러(약 1억349만원)∙7만7370달러∙5만9870달러로 한국(5만1570달러) 대비 높은데, 우리나라 수도의 집값 수준이 이들 국가의 수도보다도 2~8배 비싼 것이다.

글로벌 주요 도시의 집값 거품 수준을 정확히 추정하긴 어렵다. 집값 거품은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커져 집의 ‘내재가치’(집을 가졌을 때 향후 얻을 수 있는 편익)를 넘어 형성된 값을 말한다. 내재가치를 구하려면 소득과 교통 인프라, 학군, 이자율 등이 집값에 주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 그만큼 거품의 정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긴 힘들다. 이에 업계에선 한계가 있지만 집값이 소득이나 월세보다 얼마나 비싼지, 과거 추세에서 많이 벗어났는가 등으로 거품 여부를 분석한다.
PIR은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이 택한 추산법이다. 이에 주요 도시의 집값 거품 정도를 비교할 때 쓸모가 있다. 도시와 인간 정주 분야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해비타트가 권고한 적정 PIR은 3~5배다.
지난 7일(현지 시각)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분석 업체인 넘베오(Numbeo)가 220개 도시의 PIR을 분석한 결과, 적정 PIR에 해당하는 곳은 산유국인 오만과 바레인의 수도 무스캣(4.3배)∙마나마(4.6배) 등 잘 사는 나라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PIR이 10배를 넘으면 집값에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에티오피아∙캄보디아∙브라질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45.2배)∙프놈펜(29.0배)∙리우데자네이루(25.3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서울보다 PIR이 높은 모든 도시는 GNI가 한국의 절반도 채 안되는 나라에 속해 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 위치해 있다.
서울의 PIR은 2012년 말 10.4배였다가 2018년에 20배를 돌파(20.7)한 뒤 6년째 20배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 2012년으로부터 11년만에 PIR은 14.5포인트(p) 뛰었다. 같은 기간 중 한국보다 수도의 PIR 오름 폭이 큰 나라는 스리랑카(12.7→34.6) 뿐이다.
서울과 외국의 주요 도시간 PIR은 지역별 주거 여건 등이 많이 달라 이런 비교보단 국내 다른 도시의 같은 지표와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부동산인포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22.5배다. 전국 평균(10.7배)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어 세종(12.2배)과 경기(12.1배) 등의 순이다. 1인당 연 근로소득이 4746만원으로 가장 많은 울산(5.9배)은 PIR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울산은 1인당 급여가 가장 높아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아 소득 대비 내 집 마련 부담이 덜하다”며 “서울과 세종은 급여가 2, 3위여도 집값이 비싸 내 집 마련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