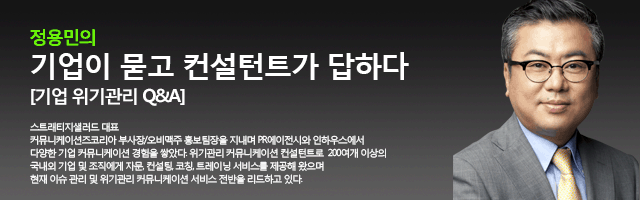[한 기업의 질문]
“흔히 위기관리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시 사소한 대응과 관리로 위기의 발아를 방지하면, 큰 위기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 같은데요. 이게 상식적인 말이라 전사적으로는 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을까요?”
[컨설턴트의 답변]

재미있는 질문이라 제가 한번 온라인 쇼핑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미는 다양한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꽤 쓸 만한 호미는 1-2만원대로 가격대가 있습니다. 반면 가래는 예전 농기구라서 그런지 찾기가 호미 만큼은 쉽지 않았습니다. 큰 삽의 일종으로 일부에서 4-5만원대로 판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속담처럼 ‘호미(1-2만원)로 막을 것을 가래(4-5만원)로 막지 말라’는 조언은 위기관리 ‘비용’ 또는 ‘부담’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비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위기관리를 경험하며 반복적으로 목격해 보면 기업에서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 정로도만 막아도 위기관리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판을 튕겨보면 그런 위기관리는 상당 수준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기업은 자사관련 위기를 두려워하고 골치 아파할까요? 고작 가래 가격 정도 수준이라 기회 비용에 비해 보면 결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하는데 말이지요.
사실 가래로 막아 낼 수 있는 위기는 위기라 정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위기를 기업들은 종종 간과하다 가래는 커녕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해 고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터진 둑을 감당해 내기 위해 포크레인 수십대를 동원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포크레인들이 현장의 통합된 지시 없이 각자 터진 둑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일사불란하게 현장의 지휘를 받기만 하면 포트레인 몇 대로도 물길이 잡힐 텐데, 각자 도생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면 포크레인 수십대도 어림이 없게 되는 경우가 돼 버리곤 합니다. 한마디로 사후 위기관리도 못 해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지요.
호미다. 가래다. 그런 고즈넉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 위기관리는 상당히 목가적인 모습으로만 임직원 머릿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앞으로 위기관리를 그릴 때에는 수십대의 포크레인이 엉겨 붙어 거대한 댐을 막아 서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호미는 1-2만원이면 충분하지만, 포크레인은 한대당 수천에서 억원대까지 가는 장비입니다. 하루만 빌려도 돈 백만원은 줘야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외주에 대한 비유겠지요. 호미나 가래로 막을 수 있는 위기를 포크레인 수십대로 막아야 할 상황으로 까지 방치한다면 더 이상은 남는 장사가 아닐 것입니다. 가래를 지우고, 포크레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