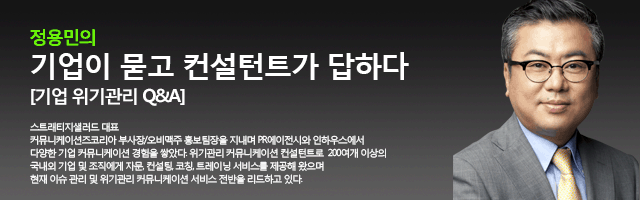[한 기업의 질문]
“저희는 이번 상황을 위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컨설턴트께서는 이번 상황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줄 수도 있고요. 너무 고객들에게 욕을 많이 먹어서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는 건가요?”
[컨설턴트의 답변]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하면 바로 ‘주어진 상황을 위기로 정의하기’ 단계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회사 내부에서 그것을 위기로 정의해야만 위기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회사 스스로 그것을 위기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위기가 아닌 것이 되지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거나, 시끄럽고 귀찮은 노이즈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정의는 기업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조원인 회사에게 1억짜리 제품 리콜은 위기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압도적으로 리콜 하고 보상하면 계획대로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10억인 기업에게 제품가 1억짜리 리콜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게 분명한 위기 일 수 있으나, 신속성이나 압도적인 위기관리는 1조짜리 기업보다 어려워집니다.
위기를 정의할 때에는 위와 같이 매출이나 재무적 영향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기준을 기업이 제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명성이나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1억원짜리 제품 문제라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객 커뮤니케이션과 개선을 통해 위기관리를 하려는 1조짜리 회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따른 민감성을 위기의 정의 기준으로 삼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사를 향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관련 부정 이슈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감성이 위기 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내부고발이나 이해관계자 갈등 또한 마찬가지지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 평소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기를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사만의 위기 판별 기준이 세워진다면, 그 기준을 전사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내 모든 구성원들이 정확한 위기관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공통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의외로 위기 요소들은 금세 눈에 띄게 됩니다. 사전에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위기에 대한 자산의 기준을 미처 가지지 못하는 기업은 부정적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갈팡질팡합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아주 작고 미세한 감정과 분위기에 휘둘립니다. 당연히 상황이 변화되면 그런 감정과 분위기도 순식간에 잊게 됩니다. 아주 얇은 냄비에 물이 끓듯이 금세 부글대다가 순식간에 식어 버리게 되는 형국이지요. 상당히 소모적인 위기관리가 됩니다.
그런 이상한 위기 정의와 대응이 반복되는 회사에는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위기관리에 임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와 이해관계자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위기관리가 별것 아니라는 경험적 자조가 태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은 위기를 바라보고 판별하는 기준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먼저 위기를 판별하기 위한 자사만의 일관된 기준을 세워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