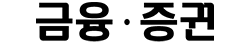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의 기업들이 외부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권 발행 등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도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기업은 남는 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이다.
금융투자회사와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성장기업과 성숙기업의 차별화된 현금흐름을 매칭한다면 한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01~2016년 중 국내 기업(비금융 기준)의 내부자금조달액은 꾸준하게 증가했다. 투자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크게 감소한 후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는 정체 혹은 소폭 감소했다.
투자수요를 내부자금으로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급도(내부자금조달/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한 이유다. 2016년에는 98%를 기록했다.
외부자금조달액은 2009년 이후 감소해 2010년부터는 내부자금조달액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에서 내부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7%에서 2016년 73%로 상승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의 내부자금조달이 투자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자급도는 각각 1.16, 1.32, 1.29다.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기업의 현금창출은 많아지는 반면, 새로운 투자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면서도 “현금흐름창출과 투자기회는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성격, 기업 규모, 기업 연령 등 기업 특성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2001~2016년 중 연도별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국내 기준, 금융사 제외)과 이를 제외한 기업의 투자와 내부자금조달 추이를 보면 기업 규모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
20대 기업은 2001년부터 자급도가 1을 상회했으며 2014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충분한 현금흐름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투자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급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나 여전히 외부자금조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업력이 짧고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이 내부 현금흐름만으로는 새로운 투자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2009~2013년 기간에는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의 비중이 컸다. 이후에는 간접금융 비중이 높아졌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서 보면 부채의 비중이 크다. 2014년부터는 대출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채권은 순상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채권발행이 가능한 대기업은 충분한 내부 현금흐름을 차환 용도로 사용하는 반면, 외부자금조달이 필요한 여타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셈이다. 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이 쉽지 않음을 뜻한다.

내부자금이 부족한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업력이 짧은 경우가 많다. 그 특성상 자금조달은 1차적으로 자본시장이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성훈 연구위원은 “외부자금의 대부분이 대출금이란 사실은 외부자금의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mismatch)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를 비롯한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은 잉여현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기업은 불확실성과 미래 투자 수요 발생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동기로 현금을 보유한다. 그러나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대리인비용’을 발생시킨다.
조성훈 연구위원은 “기업의 현금보유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기업별로 달라 일률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도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라며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을 포함한 시장규율에 의해 기업별로 효율적 현금보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