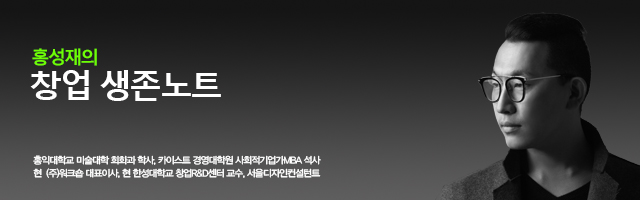필자가 1인 기업가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그 길을 걷거나, 필자가 가기로 한 걸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걷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길을 모두 걸어보며 느낀 단상을 공유하고 싶다.
하나의 방식은 보다 세련된 듯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일이기도 하다. 먼저 필자가 갈 길을 선언하고 가는 것이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임을 안다. 하지만 필자는 모두에게 선언한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겠다고. 누구보다 크고 당당하게 외칠수록 필자 자신은 알고 있다. 속으로는 무수히 떨고 있다는 것을. 겁이 날 때 더 크게 외치고 있음을. 그렇게 필자가 가보겠다고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 뒤돌아보면 잘 가라고 배웅하는 친구들에게 씩~ 웃어 보이는 여유도 잊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금세 지친다. 땀이 나고 갈증도 난다. 곧 속으로 후회한다. 내가 가기로 한 이 길은 나를 즐겁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진심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크게 외쳐놓고 돌아선 이 길을 다시 총총걸음으로 돌아가기엔 뭔가 부끄럽다. 잘 가라고, 넌 잘할 수 있다고, 배웅 나온 친구 녀석을 얼굴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있다 가보기로 하고 터덕터덕 걸어본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길이 어느새 잃어버린 길이 되고, 혼란한 마음에 다시 이쪽저쪽을 다녀본다. 어차피 꽤 걸어왔으니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어쩌면 이미 돌아가는 길조차 잃어버린 것만 같다.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걷고, 걷고 또 걷는다. 그러다 꽤 즐거운 걸음이 이어진다. 걷는 속도와 리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풍경을 보며 걷다 보니 꼭 끝을 위해 걷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필자가 진짜로 간다고 큰소리쳤던 도착점이 보인다. 필자는 사실 좀 어이가 없다. 필자는 분명 많이도 길을 잃었다. 헌데 걷고 걷다 보니 어떻게 도착을 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도착해버렸다. 친구들이 필자를 추켜세운다. 네가 할 줄 알았다며, 놀랐다고…. 그리고 어린 동생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 길을 알아냈냐고, 나도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들뜬 맘에 이것저것 생각나는 풍경들과 어려움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한다. 하지만 필자도 우연히 나왔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기분은 좋다.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필자가 갈 길 따위는 실체가 있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필자는 옆 동네 머저리처럼 내가 저길 반드시 가겠다는 말을 떠벌릴 생각도 자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벽에 조용히 짐을 꾸렸다. 작지 않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이것저것 가방에 넣어본다. 근데 막상 들어보니 가방이 꽤 무겁다. 어디로 갈지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슬그머니 무거운 가방을 등에 매고 집을 나선다. 소리 나지 않게 가만히…. 지금은 가족들이 잠든 푸르스름한 밤이라 더 좋다. 그렇게 걷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보기로 한다. 멀리 보이지 않는 새벽이라 보고 싶어도 못 볼 바에는 그냥 땅을 보고 걷는 편이 좋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질퍽한 진흙이 나올 때도, 쩍쩍 갈라진 마른땅이 나올 때도 있다. 마음에 드는 길이 나올 때는 질펀하게 앉아서 풍경을 멍하니 보기도 한다. 기분에 따라선 일하는 사람들을 슥슥 스케치한다. 때론 이런 필자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히피라고 생각할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다 뜨거운 낮이 오고, 차가운 밤이 온다. 마침 가져온 침낭과 랜턴으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헌데 실망스럽다. 모두 필자가 좋아하는 길로 다닌 건데, 이 길을 걸었던 흔적이 뒤죽박죽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일기장을 마구 뒤섞은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해진다. 필자가 가려던 길에서 담고 만들었던 흔적들이 이 길이 모두 끝나고도 여전히 뒤죽박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난다. 그래서 후회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어디로 갈지 생각은 하고 올 걸…. 옆 자리에 자고 있던 동생에게라도 말하고 올 걸, 길 잃은 필자가 지독하게 헤맬 때 혹여나 찾아올 수라도 있게 할 걸 하는 막심한 후회. 그렇게 지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다. 한데 이상하게 어제의 절망보다는 약한 실망감이 스르륵 자리 잡는다. 그 실망감도 뭐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필자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무척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길을 걸으며 풍경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 관계에서 얻은 것들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게 시간을 쌓아가면서 점점 내가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쓰게 된다. 무엇을 쓰든, 무엇을 그리든 필자가 편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 점점 한 사람의 그것과 같아진다. 그렇게 필자는 알게 된다. 한 사람의 그것이 바로 필자의 방식이라는 것을…. 어느새 가방엔 생필품 대신 노트와 스케치북이 가득하다. 돌아갈 때가 된 것이다. 출발할 때보다 오히려 가방이 가벼워졌다. 오랜만에 들른 집엔 이른 오후라 여전히 아무도 없다. 혹여나 필자가 몰래 나간 것 마저 모를 것 같아 내심 섭섭하기도 하다. 복잡한 마음에 샤워를 했다. 오랜만에 뜨거운 물을 만나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문득 인기척이 들리기에 후다닥 나가보니 그간 그리고 쓴 두꺼운 책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는 아버지가 계신다. 멋쩍은 마음에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라고 말해버렸다. 아버지가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그 길을 조용히 다녀왔다.
두 가지 방식으로 길을 걸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공통점이 있었다. 두 길 모두 한참을 걷다 보면 선택한 길을 후회하고, 걷고 또 걸어서 결국은 다녀왔다. 왼손과 오른손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동적인 순간에 두 길은 모아진다. 또 때로는 다녀올게 하며 왼손을 혹은 오른손을 들게 된다. 다시 필자의 몸통과 만날 짧고 긴 여행을 또 걷고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