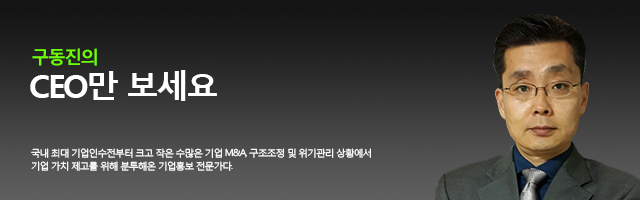지금은 효용가치가 예전만 못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계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다. 전화도 아닌 시계를 왜 얘기하는지 의아하겠지만,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약속의 필수 조건은 ‘언제’와 ‘어디’이다. 바로 그 언제라는 것은 시계로부터 얻어야만 했다.
예전 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세 가지를 선물했다. 첫째가 시계였고, 두 번째는 만년필이나 볼펜 그리고 마지막이 영어사전이었다. 이 세 가지가 어린이 단계를 벗어나 그 다음으로 가는 증표인 셈이었다. 어른들이 데려다 주고 가라면 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움직이려면 시계가 필요했다. 또래집단도 넓어지고 교우관계도 활발해진다. 시계가 필수다.
잘 부러지고 지워지기 쉬운 연필은 초등학교의 쓰기 훈련을 끝낸 후에는 볼펜이 대체한다. 쓸 게 많은 중학교에서 깎아 쓰는 연필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때부터 볼펜이 필수다. 다음엔 영어 공부를 위한 사전이다. 30~40대 이상의 연배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학을 졸업하니 영어사전만 해도 한 짐이었다. 콜린스코빌드, 롱맨 같은 영영사전부터 영한사전, 한영사전 등등 알바비가 솔찬히 들었던 손때 묻은 것들이라 아직도 책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된다. 시간은 물론 뭔가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를 찾는 데에도 그만 한 것이 없다. 통화와 각종 SNS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재미를 위한 것들도 깔려있다. 문서, 음악, 영상 등 온갖 자료들이 손끝에서 바로 해결된다.
말 비중은 7%뿐, 표정, 제스처, 분위기가 다 커뮤니케이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팩스가 필수였다. 전화선에 연결해 쓰는 팩스만 해도 가정에서는 쉽게 가질 수 없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엄청난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문자나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툴들도 많다. 지구 저편 어디선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사건이 발생한 뉴스를 손 끝에서 전파해 세상에 알린 사례도 드물지 않다.
2011년, 30년 동안 이집트 독재정권은 국민들의 18일간의 시위 끝에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로 막을 내렸다. 당시 이집트는 인터넷을 차단시키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지만 반정부 운동가와 시민들은 트위터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히려 상황을 더욱 널리 전파하고 공유했다. 그렇게 소셜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파워는 대단하다.
예전 같으면 사진 한 장을 뉴스에 싣기 위해서는 찍고, 현상하고 인화해서 상태 좋은 것을 골라서 스캔을 떴다. 요즘은 이미지나 문서 파일을 보낼 때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끝이다. 원본상태 그대로다. 그럼에도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해주는 도구는 없다. 문자가 목소리를 대신할 수 없고, 목소리만 가지고 표정이나 분위기까지 전달되기 힘들다.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 보다 더 확실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없다.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유명한 하영목 박사가 쓴 ‘프레젠테이션의 정석'에 보면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편리하고 간단한 것일수록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다. 메신저 창을 여러 개 띄웠다가 뒤바꿔 입력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일도 있었고, 한 사람에게만 전한다고 한 것이 동보로 날아가는 낭패도 있었다. 수거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본 후라면 소용없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더 위험하다. 부재 중일지라도 와서 보고 답신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도 강력한 무기다.
‘백문불여일식(百聞不如一食)’이라고 그냥 만나는 것 보다는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누군가와 뭘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경상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남자 형제들만 득실대는 집안에서 말없이 지내는 생활이 몸에 배었다. 흔히 경상도 남자들이 퇴근하면 잠이 들 때까지 세 마디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밥은? 자자’가 전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 마디도 많았다.
말 수도 적은데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메신저가 차라리 속 편하다. 말하는 속도도 좀 느려서 오히려 말보다 타자가 빠를 때가 많다. 막상 말로 할 때는 말 할 거리가 없던 것이, 손으로 하는 메신저에서는 수다 양이 늘어난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입은 과묵한데 손은 수다쟁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씩 안부 연락하는 일만 해도 적지 않은 어려운 일이고, 서로 바빠 통화마저 어려울 때가 많다. 틈 날 때마다 메신저 창을 띄우고 로그인 된 지인들을 찾아서 인사라도 나누면 서로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주는 데에 그만한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작은 변화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가 재산이다
2003년 무렵 핸드폰과 명함집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한동안 고생이 많았다. PCS폰 시기였는데, 전화번호가 제법 입력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사용한 것도 아닌데 액정이 나가 버렸다.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은 이상 없어서 그대로 들고 다녔다. 문제는 전화 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명함집 대여섯 권을 늘 들고 다녔다. 길 가다가도 연락할 일이 생기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명함집을 뒤질 수 밖에 없었다. 언제 누구와 연락해야 할 지 몰랐기에 명함집을 다 들고 다녀야 했다.
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도 큰 일이었다.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면 다른 전화나 문자가 오기 전에 얼른 통화 버튼을 눌러야 했다. 그러다가 핸드폰을 하나 더 장만했는데도 모두 예전 번호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쌍권총처럼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다녔는데, 전화가 몰리기 시작하면 양 허벅지에 동시에 진동이 전해졌다. 벨소리 역시 쌍나팔을 불기 일쑤였는데, 어떨 땐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벨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고, 계속 진동이 오는 것처럼 없는 떨림이 느껴졌을 정도였다.
손으로 떠는 수다는 사실 핸드폰으로는 힘들다. 핸드폰 자판은 컴퓨터 키보드만큼 빠른 속도로 입력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타도 많아서 제한적이다. 때문에 컴퓨터 메신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한다. 많은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 일일이 번호 누르고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다. 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메신저를 통한 문자 연락도 꽤나 유용하다. 수다쟁이 손이 더 효과적인 시절이다.
커뮤니케이터는 기자들만이 아니라 업계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재계가 돌아가는 상황도 훤하다. 많은 기자들을 만나 알게 되는 또 다른 정보는 언론사 내부 동향이다. 언론사는 사실 특수한 집단이고 보통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특수한 조직들이다.
하지만 커뮤니케이터에게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재산이다. 그런 정보는 바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 승진하고, 부서 이동을 하거나 언론사들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놓칠 수 없는 정보 재산이다.
한 언론사가 내부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기자 한 사람의 업무가 바뀌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사항일까 싶지만, 기사의 논조가 바뀌고, 그 매체의 시각이 바뀌고 나아가서는 그 기사로 인해 파급되는 여론의 향방이 결정된다. 때문에 입은 조용하더라도 결코 손은 수다를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요즈음 커뮤니케이터의 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