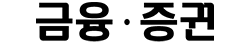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원한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것이지 금융사가 존재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대로 된 자산관리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는 부유층의 전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 약자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금융소비자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놓고 선택을 하고 싶지만 천편일률적인 상품에 만족스럽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금융’이 없고 그저 많은 금융소비자 중 ‘One of Them’이라는 사실에 실망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핀테크는 이러한 고객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핀테크는 한 마디로 금융의 개인화로 정의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자신이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성향을 파악하고 맞춤형 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 금융의 일상화가 실현된다.
그러나 핀테크의 전망이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핀테크 발전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많은 규제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또 핀테크 시대로 나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핀테크는 그저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산업은 금융사의 공급주도 시장에서 소비자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은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대다. 플랫폼 시대를 넘어 플랫폼 간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줘야 한다.
‘섬세한 금융 서비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서 금융사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금융사들도 결단을 해야 한다. 정말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말이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핀테크의 종류와 구성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아는 게 힘’이란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핀테크(FinTech)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는 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과격한 표현으로는 ‘파괴적 혁신’이라 한다.
그렇다면 왜 핀테크는 ‘파괴적 혁신’일까. 우선 핀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전자금융서비스는 PC나 모바일 등의 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각종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좀 더 확대하면 최근 들어 고철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CD·ATM 등도 전자금융서비스에 포함된다.
과거로부터 금융거래의 일부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물리·공간의 제약을 없앴다는 점이 전자금융서비스의 실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전자금융서비스는 실물 화폐거래를 줄이고 전체 화폐를 일부 디지털화하는 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다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핀테크란 말인가’, ‘전자금융이 더 발달한 형태가 아닌가’ 등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혹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고객에게 좀 더 섬세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핀테크로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핀테크의 전부라 할 수 없다.
전자금융과 핀테크의 결정적 차이… 수직과 수평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는 금융사들의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CD/ATM, 인터넷뱅킹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궁극적 목적은 고객의 편의를 위함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결국 예치금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출, 결제, 이체 등에 따른 각종 수익을 얻는 데 있다. 한마디로 은행이 각종 업무를 확대하는 즉, 금융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이 전자금융서비스다.
반면, 핀테크는 금융사들의 수직계열화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대출, 결제, 이체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다소 복잡한 업무인 자산관리까지도 전문성을 나타내는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금융 업무별 IT기술이 융합되면서 말 그대로 ‘특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분야별 특화가 수직적 구조에 어울리는지 수평적 구조에 어울리는지를 떠올리면 전자금융서비스와 핀테크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구분이 될 것이다. 즉, 핀테크는 기존 금융의 수직 구조를 수평으로 바꾸는 데서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금융사들은 각 사가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사들이 부족한 점은 ‘금융 수직계열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금융 환경을 돌파해 결국 수익성을 되찾겠다는 뜻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핀테크가 아닌 전자금융서비스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관계는 수평 형태가 이상적”이라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핀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을’의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이선스 방식의 현 금융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 틀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금융업의 수평구조와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대 NO!… 플랫폼 ‘경쟁’의 시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미래 예언 중 하나인 ‘은행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Banking is necessary. Banks are not)는 말은 핀테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해준다.
만약 은행서비스와 은행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은 단연 서비스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 가는 이유는 돈을 보관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받기 위함은 물론 대출, 이체 그리고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단순히 은행에 돈을 보관할 목적이라면 튼튼한 금고를 사면 그만이다. 또 각 개인의 재산현황이 노출될 이유도 없고 전산오류, 해킹 등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각 금융사들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뱅크런(Bank Run) 등 대규모 인출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서비스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1000만원을 예금한 상황에서 연 -1% 이자가 적용되면 은행은 이 고객으로부터 연간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고 하자. 만약 10만원의 이자를 내기 싫은 고객이라면 이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은행이 예금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이체 시 송금액의 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이자를 은행에 내고 각종 서비스 혜택이 지급이자보다 더 크다면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금융 서비스’는 ‘마이너스 금리=뱅크런’이라는 직관적 판단을 뒤엎을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화두로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 플랫폼’이다. 잘 생각해보자. 유사한 플랫폼이 이익을 공유하는가? 대표적으로 애플과 구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랫폼이 시장을 점령한 이후 여타 경쟁자들은 이 시장을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어졌다. 그리고 애플과 구글은 여전히 이 시장에서 경쟁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음원, 쇼핑, 숙박 등의 플랫폼도 동종 플랫폼 업계와 여전히 경쟁 중이며 이제는 경쟁 지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국내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시점이 경쟁의 시작이며 결국 소수만 살아남게 된다. 그것도 글로벌 금융사 중 소수로 살아남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린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의 대상이 금융사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핀테크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하면 애플, 페이팔, 알리바바, 골드만삭스 등이 꼽힌다. 이 중 골드만삭스만이 유일한 금융사란 점에서 이미 경계는 허물어져 가고 있다.
한 P2P금융 관계자는 “우리가 대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며 가장 직접적인 경쟁상대를 꼽으라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라며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와 대출 혹은 투자가 필요한 사람을 P2P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이 현재 예금과 대출 등 기존 은행 영업방식과 유사한데 분명 특화된 무기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특화된 무기가 없다면 인터넷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에 인터넷을 연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인터넷은행이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않고 예금, 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이어 자산관리 등 기존의 백화점 형태로 업을 확장한다면 혁신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업이 공급자 주도에서 소비자 주도로 전환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남는 것은 ‘외면’ 뿐이다. 결국 플랫폼 싸움에서 이기려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