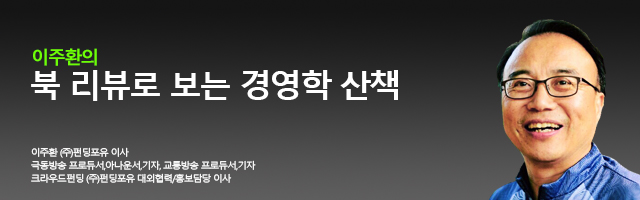‘가출한 정치를 찿습니다.’ 이 책은 ‘정치실종사건’을 다룬다. 한국의 정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셜록홈즈가 되어 명견(名犬)을 앞세우고 행간마다 탐문했다.
<명견만리>는 강연과 다큐멘터리와 책의 융복합 콘텐츠이다. TV 프로그램은 3년째 시청율 상위이다. 책도 베스트셀러이다. 3권 12개의 주제중 가장 먼저 ‘정치편’을 골랐다.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누가봐도 우월적 지위의 ‘수퍼갑’이다.
정치는 무엇일까?
한국정치의 미래는 어떨까?
어떻게 해야 정치가 발전할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정치적 현실은 온통 먹장구름이다. 이 책은 그 사이로 언뜻 비추는 햇살이다. 정치의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 정치가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하는 이정표임을 강조한다.
사회적 합의능력에 국가의 성패갈려
한국은 갈등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정치는 갈등의 조정자이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 대화와 타협은 뒷전이다. 편가르기와 힘겨루기에 능하다. 지금도 여당대표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대치국면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지수가 OECD 27개국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발표했다. 1인당 갈등비용이 GDP의 27%이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1인당 연간 900만원꼴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4인 가족 기준 연 3,600만원이다. 사회를 통합하는 ‘합의의 기술’이 부족한 댓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사실, 갈등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갈등은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독일의 성장과 이탈리아의 몰락이 전형적 사례이다.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강대국의 위상을 높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지역간,세대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존재감을 잃었다.
유권자가 객석에서 무대로 나서야
한국의 유권자는 선거일 하루만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4~5년간 구경꾼이 된다. 정치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문제다. 우리의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 즉, 독과점 구조이다.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생태계가 조성되어야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해법은 정치의 일상화, 일상의 정치화이다. 배선정 PD는 취재노트에서 어려서부터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투표로 국민의 정치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정치가 일상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에 매의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는 결코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지난 18대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위기를 바로 잡는 힘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2015년 12월, 스페인에서는 신생정당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있다)가 제3당이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좌,우가 아닌 아래다.‘ 그들의 구호이다. 스스로 세비를 낮추었다. 의원의 수입을 공개하며 각종 특권을 내려놓았다. 당직기간도 8년으로 제한했다. 10년간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도 포기했다. 무엇보다 국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와 일상의 벽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350석중 69석을 확보한 이유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오성운동이 ‘부패와 무능,금권정치 타파’를 주창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제1야당으로 떠올랐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7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정의로운 결과’를 기치로 내세웠다. 정치의 본질이 담겨있다. 슬로건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먼저 정치제도부터 손질해야한다. 현 정부에서 에스토니아처럼 IT를 활용한 선거가 시행되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정치인 중간평가가 가능해진다. 평가결과를 공천에 반영하고 세비를 차등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정치분야에서 손가락에 꼽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한다.
정치는 국가의 경영이다. 최고의 경영 무엇일까? 사랑이다. 멋진 정치인은 국민과 연애하는 정치인이다. 그들의 시선이 높고 센 곳이 아니라 낮고 어두운 곳을 향할 때 사랑은 완성된다.
정치가 방황을 끝내야한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한다. 국민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정치인들이 나를 자신의 반려동물처럼만 대우한다면 나는 기꺼이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 있다.
이제는 ‘정치’라고 쓰고 <•지•키•미>라고 읽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키워주고] 모두를 [•미소짓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자. 그리고 ‘환희의 송가’(Song of Joy)를 합창하자. 저 멀리서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 들려오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