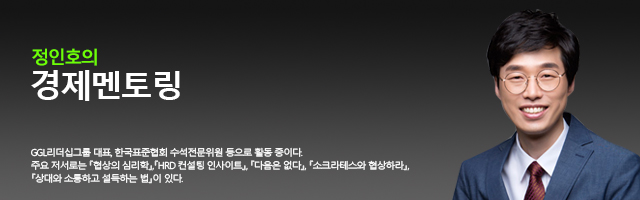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가정해보자. 등산 중에 들어선 지름길이 사실은 잘못 든 길임을 알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핸드폰 배터리도 나가서 구조 요청도 할 수 없다. 어디가 어딘지 가늠할 수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길 잃은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은 공포심이다. 이 단계가 되면 허우적거리며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한다.

캐나다 저널리스트 로렌스 곤잘레스는 <생존>이라는 저서에서 조난되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정신적 혼란 때문에 죽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전략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생존을 약속하고, 어떤 전략이 재앙으로 이끄는지 분석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생존 전략은 ‘그 자리에 머무르며 힘을 아끼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조언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막상 인적이 드문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이 전략은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전략이 된다. 길을 잃은 사람들 99%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상황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이른바 국내 조선 빅3가 최근 1년여 사이에 8조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런 천문학적 손실은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나왔다. 설계 능력도, 공기와 원가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11억 달러에 수주한 해양플랜트를 잦은 설계변경과 납기지연으로 26억 달러를 들여 건조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조선 3사의 CEO들은 왜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드는 결정을 했을까?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업체의 추격으로 주된 수입원이던 상선 발주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 결과,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해양 플랜트에 뛰어드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미국 철학자 잭 보웬은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운을 겪는 것보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나서 불운을 겪는 편이 심적으로 덜 괴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불운이나 실패를 겪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노력은 했잖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명분이 그럴싸할수록 행동편향은 심각해진다. 1994년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년간 16번이나 뜯어고쳤다. 사회적 합의 없는 개정안을 내놓고, 부작용이나 폐단이 나타나면 그때 또 다른 개선안을 마련하는 이런 식의 과정이 반복된 거다. 어찌되었건 부모들은 이러한 풍토 하에서 자식의 상위권대학 입학을 위해 온힘을 쏟아 붓는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만이 만들어내는 병적인 열정이다. 내일을 모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진학문제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애플은 1997년 9월에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렸다. 급기야 회사를 떠났던 스티브 잡스가 CEO로 복귀했다. 잡스가 추진한 일련의 조치로 회생은 했지만 애플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는 없었다. 당시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4%도 되지 않았다.
잡스는 이 문제에 대한 성장전략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저 웃음을 지으며 “다음에 올 대박을 기다릴 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애플이 아이팟과 아이폰으로 재도약하기까지 2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 잡스의 대답은 적합한 때를 위한 기다림의 지혜인 것이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다. 이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게으름뱅이나 수동형 인간들의 행동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행동의 포기가 아니라 언제든 행동할 수 있지만 ‘지금은’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식적인 전략을 말한다.
철학자 디터 비른바허는 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행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동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