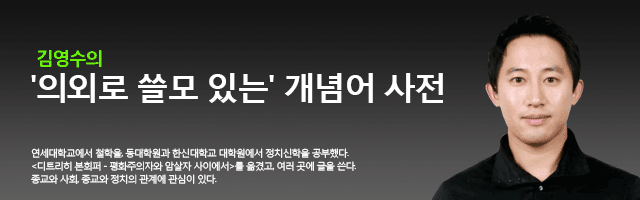회의(懷疑)
[명사] 1.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2. 인식이나 지식에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그 확실성을 의심하는 정신적 상태나 태도.

<곡성>은 의심에 관한 영화다. 의사는 사람이 아픈 이유를 모르고,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잡겠다며 엉뚱하게도 친구들의 사적 폭력에 의존한다. 마을이 초토화되는 상황에도 정치는 하는 일이 없고, 언론은 과학 수사반의 엉터리 발표를 쫓아 엉뚱한 보도만 반복한다. 의학, 과학, 공권력, 언론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시민을 보호할 사회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거나 미친다.
“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주인공 종구는 절규한다. 그는 알고 싶다. 아이는 왜 아픈가. 사람들은 왜 죽었나. 마을을 휘감은 불길한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본인의 말을 통역하는 게 하필 천주교 사제라는 설정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시스템이 붕괴한 상황에서 종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종구 역시 절박하게 매달리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진실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책망이다. “그 아이의 아비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무지(無知) 위로 의심(疑心)이라는 죄가 더해지고, 비극은 억울하게도 형벌이 된다. 영화가 끝나도 질문은 남는다. 의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살의 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꽤 당돌한 청년이었다. “나는 내 스승들로부터 해방되는 나이가 되자 학교 공부를 집어치워버렸다.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학문 외에는 어떤 학문도 찾지 말자고 다짐했다.” <방법서설> 하지만 그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을 펼치자마자 만난 건, 짓궂게도 길고 잔인한 전쟁이었다. 독일 전역을 납골당으로 만들었다는 ‘30년 전쟁’은 그가 22살인 1618년에 시작해 죽기 2년 전인 1648년에야 끝난다.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자식이다.” 헤겔의 말은 데카르트에게도 옳다. 그의 사상은 저 끔찍한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어떤 전쟁이었길래? ‘30년 전쟁’은 가톨릭 교회와 새롭게 출현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벌인 종교 전쟁이다. 신을 향한 믿음조차 논쟁과 검증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중세적 문화와 사회 규범, 경제와 정치까지 이전 시대의 시스템은 모두 와해되고 만다. 모든 것이 무너진 불확실성의 시대. 데카르트의 질문은 바로 그런 시대가 낳은 것이다.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데카르트는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이 악령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능하고 교활한 기만자가 집요하게 나를 항상 속이고 있다고 치자.”<성찰> 만약 사악한 악마가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배운 모든 것을 조작해 나를 속인다면? 악마보다 힘이 약한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농락당하느니 데카르트는 차라리 전통, 감각, 현실, 수학 등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한다. 속지 않기 위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아무리 의심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니, 바로 의심이야말로 진리의 증거라는 것을. 의심은, 의심하는 내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통찰이 서양 지성사에서 가장 유명한 명제를 낳았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본래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고쳐도 좋다. 의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의심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 ‘방법적 회의’(Methodical Doubt, 方法的懷疑), 방법으로서의 의심이라 부른다. 데카르트를 통해 ‘의심’은 인간의 유한한 조건에서 진리에 도달하는 통로로 격상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무지를 고발하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서 시작됐다. 중세 신학의 여명기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쓰며 인간의 원죄를 곱씹었지만, 결국 그가 말한 건 무조건적인 신의 은총이었다. 무지에서 지혜로, 죄에서 은총으로, 의심에서 진리로, 데카르트는 바로 이 전통 위에 서 있다. 이 전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무지, 죄, 의심이 결코 끝일 리 없다는 강력한 믿음이었다. 어쩌면 그런 신뢰만이 올바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종구는 의심이라는 죄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믿어야 했을까. 그는 제대로 의심을 하기는 한 것일까. 더 현명한 의심은 불가능했을까. 물론 종구나 데카르트보다 중요한 건, 그 둘 사이 어디쯤 서 있을 우리들이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와 신뢰하기 어려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의심’은 불가피한 삶의 조건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어쩌면 이런 물음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무엇을 의심하고, 어떻게 의심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의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