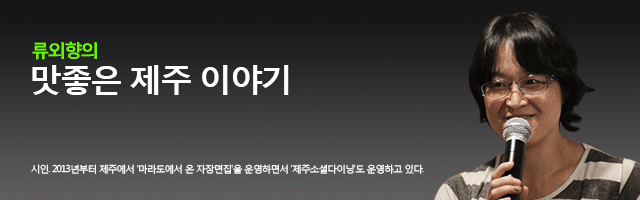인도를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내 통장 잔고가 그 겨울 성수기에 이르러 상한가를 달리던 인도행 티켓을 끊기엔 적었고, 인도행이 한창 유행일 때라서 티켓 자체가 동이 났더랬다. 왜 인도였냐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인도를 동경하지도 않았고, 남들 다 가는 곳은 애써 피해 다니는 성정인데, 그때는 그냥 가고 싶었다. 가면 숨 쉬기 어려울 만큼 뒤틀리고 왜곡된 대한민국을 얼마간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경하지는 않았지만, 남들 다 가는 이유 중 적어도 하나쯤은 내게도 와 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망을 가고 싶었던 거였다. 숨 쉬러, 나라 밖에서.
마라도는 내게 인도였다. 얼마간의 돈이 모자라 남들 다 가는 인도조차 못 가는 신세를 한탄하던 그 몇 주 후에 나는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 가 있었다. 마라도는 내게 인도만큼이나 머나먼 섬이었다. 애써 고른 것도 아닌데, 그때 내 앞에 나타난 마라도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현신했던 것이다. 마침 한국작가회의에서 마라도 내에 있는 사찰인 기원정사에서 창작작업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가기만 하면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최장 한 달 동안이나 비비고 삐댈 수 있다는 공지를 솔째기(‘슬그머니’의 제주어) 흘리고 있었고, 누군가 바로 너를 위한 거라고 나보다 더 기뻐하며 알려주었고, 비행기 타고 가면 인도나 마라도나 매한가지 아니겠냐고, 무엇보다 돈이 안 든다잖아,라며 온몸으로 받아 안았더랬다.
그리고 진정 나는 마라도를 인도처럼 여겼다.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배 타고 다다를 수 있는 복잡한 여정도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나라를 떠난 느낌이 드는 거였다.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여정. 그리고 겨울철이라 자주 이는 풍랑, 그럴 때마다 끊기는 배도 마음에 쏙 들었다. 아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고립무원에 혼자 있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마라도는 내게 인도였다. 바다 한가운데에 불쑥 솟아오른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섬, 어느 곳에서도 사방으로 바다가 보였다. 걸어서 4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작은 섬이 어찌 그리 거대하고 육중한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를 일이다. 섬은 겨울엔 대체로 황량한 법이지만, 마라도의 황량함은 겨울에 절정을 찍고, 여름마저 끌어안았다. 황량해서 사실은 인도보다 더 좋았다.
그곳에서 나는 칩거했다. 방 안에서 칩거했고, 절 안에서 칩거했고, 섬 안에서 칩거했다. 세 겹의 감옥 창살을 기꺼이 즐겼다. 그 전 일 년 동안 나는 너무 밖으로 밖으로 쏘다녔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 많은 사건들에 시달렸다. 서울의 종로 어딘가, 평택의 논두렁 어딘가에 떨어져 뒹굴고 있을 나를, 나는 간절히 그리워했다. 그리고 간절히 버리고 싶었다. 상처투성이인 나를, 나는 다 끌어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일이 꼭 필요했다.
마라도에서는 시 쓰고 밥 먹고, 시 쓰고 바람 맞고, 시 쓰고 자고, 시 쓰고 바다를 보았다. 평택 그 너른 벌판의 황량함에 취해 직장도 때려치우고 서울 생활을 접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이사하더니, 삼십 하고도 오륙년을 살면서 맞은 바람보다 마라도에서 한 달 동안 맞은 바람이 훨씬 더 많았으며, 삼십 초반에 흔히 가던 엠티 장소인 이런저런 해안에서 술만 취했다 하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이러다 언젠가 바다에 빠져 죽겠다 싶어 수영까지 배우러 다니더니, 천지간 바다밖에 없는 섬에 숨어들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그래, 모든 게 운명인 거야,라고 한 달 내내 되뇌었던 것 같다.
그러다 그것이 진짜 운명인지, 사달인지 지금도 헛갈리는 일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3주를 유폐와 칩거의 희열 속에서 시를 썼고, 시집 한 권을 마무리할 십여 편의 시를 얻고서야 긴긴 잠에서 깨어난 동면동물처럼 한껏 기지개를 펴며, 그동안 어떻게 잊고 살았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갈 정도인 음주 발동이 걸렸다. 맞춤하게 핑계거리도 생겼다. 그동안에는 기원정사에서 처음 만난 이나미 소설가와 같이 밥 먹고, 한두 번 산책 같이하는 정도로 지내다가 나미 언니도 알고, 나도 아는 서성란 소설가가 입숙하는 날이라고 모두 다 같이 술집을 찾아 나섰다.
마라도의 밤은 진정 암흑이다. 그믐이 가까운 날이면 정말 칠흑이다. 가로등이 있을 리 만무한 섬에서 사방에서 불어재끼는 바람을 필사적으로 받아내며 유일하게 불이 켜진 집을 찾아갔다. ‘돔나라’라는 민박 겸 횟집이었다. 망망대해의 등대 같은 불빛이라고나 할까. 횟집 안에는 사내 셋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여자 셋은 미닫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돈이 별로 없다며 내밀었다. 기원정사에서 여자 셋은 가진 돈들을 다 꺼내 보았는데, 달랑 3만원이 전부였다. 돈이 필요 없는 곳이고, 돈 쓸 일도 없는 곳이라 다들 현금이 없었던 것이다. 회를 한 접시라도 먹어야겠는데, 단돈 3만원으로 고기 한 마리나 사겠냐며 걱정부터 늘어놓다가 돈 찾을 곳도 없는 깜깜절벽 섬인지라, 일단 그 중 가장 어린 내가 총대를 매기로 하고 나선 길이었다.
사내 중 하나는 기꺼운 얼굴에 살짝 짓궂은 웃음을 머금고 얼마든지 드린다며, 뜰채를 들고 수족관으로 향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덧붙이는 것이었다. 냉장고에 있는 술은 마음껏 드시라고. 오호라, 찾아도 너무 잘 찾아왔구나, 여자 셋은 로또 맞은 기분이었다. 남은 사내 둘은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며 애초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렷다. 그날, 새벽이 깊도록 여자 셋과 사내 하나는 긴꼬리벵에돔 세 마리를 안주 삼아 한라산 열한 병을 마셔댔다. 여자 셋은 생전 처음 긴꼬리벵에돔이라는 마법 같은 고기를 맛보며 환희에 들떴고, 마셔도 마셔도 취하지 않는 한라산은 달디 달기 짝이 없었다. 술자리는 즐거움이 넘쳐났고, 마라도의 깜깜한 겨울밤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내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