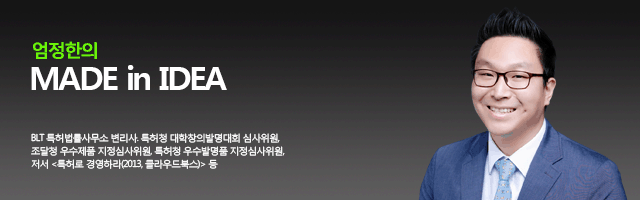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지원정책을 수립하느라 정권마다 바쁘다. 하지만 문제는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해주고, 정부에서 기업들에 각종 금전 지원을 해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미 10년도 넘게 실리콘밸리 따라하기를 시도해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왜 그런 것일까? 외국 회사들은 한국의 IT인프라가 훌륭하고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빠르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을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왜 괜찮은 신규 IT기업이 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들 대기업에 가고 싶어할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에 있다. 대학의 수익구조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교수들이 따오는 과제비 및 임대업, 의료업과 같은 수익사업으로 나뉘어진다. 물론 특허를 팔아서 나오는 기술료 수익도 있지만, 형편없는 특허의 품질로 인해서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대학의 유지와 관련된 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따오는 과제비에 있다. 정부에서 연구재단에 위탁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학교수와 그들의 연구소에 맡긴다. 하지만 과제기획서를 써낼 때의 그 열정은 일단 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급격히 감퇴된다. 경쟁은 한 차례에 불과하고 그 결과물이 사업화되는 것은 부수적인 평가항목일 뿐이다. 과제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된 연구결과물은 한 권의 보고서로 누군가의 책장에 고이 모셔지는 것으로 끝난다. 대학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모아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학과 국가 경제 간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선순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얼마 전 ‘스탠퍼드대가 연세대를 앞서는 이유’라는 글이 SNS를 통해서 인기를 얻은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두 학교의 총장이 자기의 대학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내용인데, 사법고시 몇 명 합격, 국무총리 몇 명 배출 등을 자랑한 연세대에 비하여 스탠퍼드대의 발표내용은 차원이 달랐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총장은 1930년 이후 스탠퍼드대 졸업생이 세운 기업의 수가 4만 개, 졸업생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540만 개, 졸업생들의 총 매출이 연간 2조7천억달러라고 자랑했다. 구글, 야후, 테슬라, HP, 나이키, 시스코, 갭 등 수많은 혁신기업들의 로고가 열거되었고, 창업가들의 기부액이 9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고시와 취업률에 목을 매는 대학의 문화는 창업을 응원하는 대학의 문화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말로 실리콘밸리를 모방하고 배우고자 한다면, 그들이 잘 되는 근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연구비로 연구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과 교수들은 대학원에서 함께하는 제자들이 훌륭한 후배 교수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적 성향과 창업에 의지가 있는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임팩트 있는 논문을 받도록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니즈가 예상되는 아이템을 연구실에서 만들어보고, 그 아이템을 좋은 특허로 보호받고, 창업을 통해 기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자 우리나라가 좋은 기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