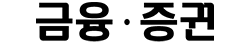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상장이 IPO(기업공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IPO는 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이자 ‘공모주=대박’이라는 인식으로 기업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금융투자업계도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IPO 시장이 그리 녹록한 시장은 아니다. 경쟁이 심하고 관심이 높은 만큼 수익률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IPO 열풍에 투자자들은 공모주 펀드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예상과는 다르다. 공모주 펀드의 수익구조상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IPO를 둘러싼 세 주체의 동상이몽
일반적으로 IP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은 ‘증시 활성화’다. 엄밀히 말하면 ‘증시 상승 국면’이다.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공모가를 원하다. 따라서 증시 환경이 우호적일 경우 IPO 시장이 활성화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IPO가 몰리면 그만큼 투자자들은 분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대기자금도 소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증시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할 경우 해당 기업이 IPO를 통해 높은 공모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참담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양광 기업들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다. 지난 2010년 초부터 태양광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이 부각을 받으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폴리실리콘 생산 전문업체 OCI는 2010년 20만원 초반의 주가로 시작해 불과 1년 만에 200% 이상 상승하며 65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LG화학도 20만원 초반의 주가로 출발해 58만3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삼성SDI도 10만원 초반의 주가에서 20만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당시 태양광, 2차전지 업황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쯤,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장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업황 호조의 기대감으로 높은 공모가는 물론 상장 이후 수일 만에 공모가의 2~3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이들 업체의 주가는 당시 최고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기업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2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웃는 주체는 따로 있다. 바로 IPO 주관사들이다. 일반적으로 IPO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대형사들의 경우 공모금액의 1~3%로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관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의 절대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름 고충이 있다.
한 증권사 IB업무 담당자는 “IPO 물량은 줄어들고 수익은 내야 한다”며 “증권업계가 어렵다 보니 중대형 IPO 유치에 공모가는 높게 책정하고 IPO 수수료는 일부 낮춘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IPO 시장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침체기를 겪었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16건, 2012년 7건뿐이며, 2013년에는 신규 상장기업이 3개사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주관사들은 계약을 위해 서로 공모가를 높인다. 바로 이러한 환경이 국내 IPO 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기업이 속출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평가된 공모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12.5%로 미국(-2.6%)보다 훨씬 낮았다”고 분석했다.
국내 IPO 시장이 미국시장 대비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었음을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IPO를 통해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미 고평가된 수준의 공모주를 매수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며 공모주를 확보하는 자체도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차익 실현을 위해 상장 이후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위원은 “주관사들이 발행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공모가를 책정하지 못했다”며 “IPO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왜 저조할까?
삼성SDS에 이은 삼성에버랜드 상장계획 발표로 IPO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업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직접 공모주 투자가 어려우면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주춤했던 공모주 펀드 자금유입이 1000억원의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공모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초 이후 국내 37개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24%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는 –0.95%, 국내 채권형 펀드가 1.66%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양호한 성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한국정보인증과 인터파크INT 등이 상장 이후 200%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 5년간의 평균 수익률도 17.98%에 머물러 있어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가 43.48%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23.94%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채권형 펀드보다도 성적이 저조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펀드에 들어온 자금을 전부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펀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자산의 70%를 채권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를 공모주에 투자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IPO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더욱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그중 일부 자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서도 “채권형 펀드 수익률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IP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모주 펀드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