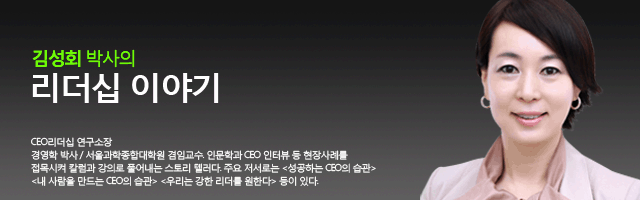가르치기보다 깨우쳐라
공자는 평소 제자들에게 해답을 주입하기보다 질문으로 끌어냈다. 제자들에게 스스로 고민하며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유능한 리더는 지시하기보다 토론케 했고, 설명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재육성 역량이며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이다.
공자의 재능이 가장 빛난 부분은 교사로서 인재육성 역량이다. 그는 이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고위관료, 또 시대와 사회의 멘토로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공자는 인성과 실무를 갖춘 공자표 인재, 즉 군자 양성을 표방했다. 그의 제자들은 관계에 진출해 실력 있는 관리로서 공자의 덕치를 펴는 데 기여했다. 일방적 가르침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수준에 맞춘 눈높이 학습을 실시했다. 강의나 훈시보다 질문을 많이 활용하고, 똑같은 질문에도 각각 다른 답을 해준 것도 바로 공자의 이 같은 인재교육관 때문이었다. 공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고 배로 늘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하고자 한 것은 ‘지식 주입’의 교(敎)가 아니라 언제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지 판단력을 주는 밝음의 깨우침의 효(曉)이었다. 요즘 말로 교사라기보다 코칭이다.
하긴 <논어>라는 책 제목 자체가 이를 표방한다. <논어>는 스승인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집이다. 공자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토론한 것이 논(論)이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어(語)라고 부른다. 공자는 제자의 입장, 질문이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하고 다양하게 대답해주고 있다. 후한 시대의 철학자 왕충은 “공자의 말이 그 자체로는 불완전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비로소 불완전했던 말이 완전해진다”고 보았다. 공자는 질문을 통해 생각을 유도하는 리더였지, 정답을 제시하는 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지시하기보다 토론케 했고, 설명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이끌고자 했다. 문답 토론을 통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군자다운, 군자를 위한, 군자에 의한 수양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안핑친 예일대학 역사학과 교수는 <공자평전>에서 공자는 가르침에 관해 1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할 때, 교(敎)가 아닌 회(誨)자를 썼다는 데 주목한다. 예컨대 나는 “가르침에 싫증 내는 일이 없다”(회이불권 誨而不倦-술이-)에서 공자는 굳이 誨를 사용하고 있다. 誨는 빛을 비춰줌으로써 가르친다는 뜻의 효(曉)와 통한다. 가르침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한 모퉁이에 빛을 던져주는 것(enlight)이라고 공자는 생각했다. ‘교육하다’라는 의미의 educate도 어원은 ‘밖에서 집어넣다’가 아닌 ‘밖으로 끄집어내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교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소질과 능력을 발현시키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한 교육이었다. 이는 공자의 敎가 아닌 誨의 교육방법과 통한다. 공자는 신분과 상관없이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나 군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또 각자의 강점을 세밀히 관찰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했다.
가르친다는 뜻의 훈(訓)은 말로 이야기해줌으로써 가르친다, 설교한다의 뜻이다. 訓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공자가 긴 논설을 펴거나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가르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교(敎)도 있다.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에서 유래한 敎는 윗사람이 세운 모범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논어>에선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인하다고 한다(不敎而殺謂之虐· 요왈), 좋은 임금이 백성을 7년간 가르친 연후에 아마 군대에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子曰 善人 敎民七年 亦可以卽戎矣-자로-) 등에서 쓰였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敎는 한쪽이 베풀고 한쪽이 받아들이는 수직적 위계관계의 가르침이다.
공자는 짜진 시스템하에서 주어진 결론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군자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 발 한 발, 한 단계 한 단계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 이끈 공자의 인재양성 방식은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보다 선진적이었다. 공자는 질문을 통해 생각을 유도하는 리더였지, 정답을 제시하는 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지시하기보다 토론케 했고, 설명하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이끌고자 했다. 문답 토론으로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는 것이야말로 군자다운, 군자를 위한, 군자에 의한 수양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대답할 때조차 진술보다 질문을 자주 사용한다. 또 제후를 설득하고자 할 때 논쟁하기보다 질문을 던져 스스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 가령 ‘무도한 사람을 사형에 처해 도의 방향으로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에 대한 답을 단도직입적으로 생각을 내지르기보다 공자는 “정치를 하는데 어찌 사형부터 생각하십니까?”라고 한 번 상대의 말을 다시 요약정리한 의문문으로 정리해 되묻는다. 또는 “자장아, 네가 말한 통달이란 무슨 뜻이냐?” 하고 단어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들어가는 것 등이 그런 예이다. 자신이 한 말을 의문문으로 만든 것에 스스로 답하면서 상대는 스스로 설득이 된다.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다. 그는 제자들은 물론 제후들에게 그들이 동의할 만한 것으로 말머리를 열어 仁의 도덕정치도 결국 패도정치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으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도록 설득했다.
실제로 <논어>에는 공자가 제자들이 못마땅할 경우 내쳐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공자는 개방적인 스승이었지만 일일이 먹을 것을 떠먹여주거나 밥상을 차려주는 친절한 스승은 아니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유비란 인물이 있었다. 그가 공자를 뵈려 하는데 공자는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유비는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에게 사상례를 배웠다고 하는데 아마 공자는 그에게 못마땅한 바가 있었던 것 같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문을 나서자마자 공자는 비파를 손에 잡고 노래를 부른다. 바로 유비가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문을 나서 그가 거절의 말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될 무렵에 비파를 잡아당겨 노래를 불러 유비가 듣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는 병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오늘 내가 그대를 만나주지 않은 것은 나와 만나는 것을 거절당한 원인이 그대에게 있다는 사정을 완곡히 알려주어 반성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그를 거절하고 만나주지 아니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한 것이다. 또 번지가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공자는 “나는 노련한 농부보다 못하다”라고 했다. 다시 번지가 채소밭 가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공자는 “나는 노련한 채소재배자보다 못하다”라며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
번지는 왜 뜬금없이 농사짓는 법을 물었을까. 번지의 질문이 돌연한 듯해서 후대의 해석가는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성호 이익은 번지가 <맹자>에 나오는 허행(許行)처럼 직접 노동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 설을 대변했다고 여겼다. 그런데 공자는 그 관점이 식화(食貨)만 앞세우고 예의(禮義)를 뒤로하는 폐단을 초래할까 봐 꾸짖었다고 보았다. 맹자는 일찍이 ‘가르치는 데에도 방법이 많은데’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는 가르침, 이를 일러 불설지교(不屑之敎. 좋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라고 했다.
공자는 때론 질문을 이끌어내고, 때론 아예 질문을 무시하여 그 근본으로 돌아가 스스로 일단 연구해보도록 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지고 모르는 점을 물을 때도 표현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워할 정도가 되기까지는 먼저 나서서 소방수가 돼 불을 끄러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생각의 실마리를 자극해 자발적으로 깨우치도록 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유능한 리더는 답을 주입하기보다 질문으로 끌어낸다. 구성원들은 스스로 고민하며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르치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우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