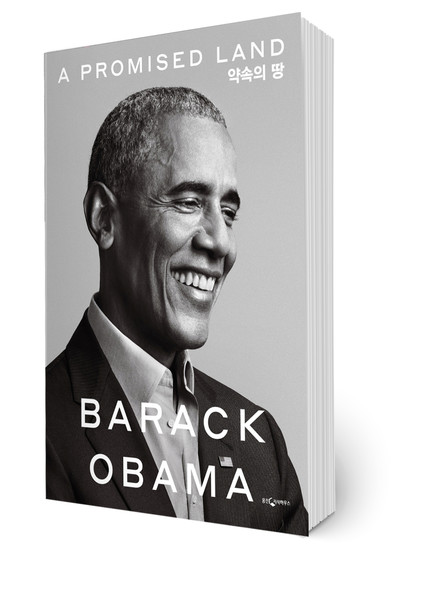
<약속의 땅> 버락 오바마 지음, 노승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회고록을 냈다. 상원의원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2006년)을, 대선에 나섰을 때 <담대한 희망>(2008년)을 썼다.
<약속의 땅>은 백악관 입성 후 빈 라덴 사살 작전까지를 다뤘다. 임기 후반부를 담아낼 네 번째 회고록도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달변가 오바마는 글도 잘 쓴다. 주요 사건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다. 충분한 배경 설명을 곁들이면서도 글의 전개가 빠르다. 상황 묘사는 섬세하다. 읽다 보면 오바마가 주인공인 정치 드라마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다.
자성(自省)과 통찰의 묵직한 문장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오바마는 초강대국 대통령이 지닌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면서도 언제나 그 근원적 한계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치인의 자서전인지라 자화자찬과 자기 합리화가 빠지지 않는다. 겸손한 듯, 배려심이 넘치는 듯한 오바마의 어휘들을 걷어내면 결론은 대부분 ‘그들은 부족했고 내가 다 해냈다’는 식이다.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두 대목을 보자.
‘2009년 10월 9일 새벽 6시 백악관 전화 교환수가 잠을 깨우더니 보좌관의 전화라고 바꿔줬다. 심장이 철렁했다. 테러 공격인가? 자연재해일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보좌관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방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왜 주나요(For what)?” 보좌관은 요령있게 나의 질문을 피했다.
전화를 끊자 미셸이 무슨 통화냐고 물었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대.” “정말 잘됐다, 자기” 미셸이 돌아누워 다시 잠을 청했다.
아침 식사때 두 딸이 식당에 들렀다. 말리아가 책가방을 어깨에 메며 말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 아빠가 노벨상을 받았대. 그리고 오늘이 보의 생일이야!” 사샤가 한마디 거들었다. “게다가 사흘 연휴라고!” 둘은 내 뺨에 입 맞추고는 학교로 갔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예정된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상원이 오바마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국제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합의를 하려면 미국 내 온실가스의 대규모 감축과 개도국들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신규 지원이 가능해야 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없었다. 코펜하겐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끈질겼다. 둘이 백악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반기문은 오바마를 압박했다.
오바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반기문은 잠자코 있다가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길 반복했다. 이후 G20 회의에서도, G8 회의에서도 반기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회의 참가를 거듭 요구했다.
이듬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때 오바마는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반기문에게 약속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수전 라이스에게 말했다. “숙맥 같은 친구가 하도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 무도회에 같이 가주기로 한 고등학생의 심정을 알겠소.”
책에는 정상회의에 마지못해 나섰던 오바마가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잠정 협정을 도출해낸 영웅담이 한 편의 액션 영화처럼 펼쳐진다.
귀국길 대통령 전용기 상에서 오바마는 “정말 기분 좋았다. 회의장의 혼란상과 중국의 고집을 감안하면 나는 이번 일이 승리라고 여겼다”고 술회한다.
그러나, 모든 난맥상을 한 방에 해결할 ‘킹핀’이 오바마라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자신감 없어 하는 오바마를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난장판 정상회의를 평정해낸 반기문의 지략과 노고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