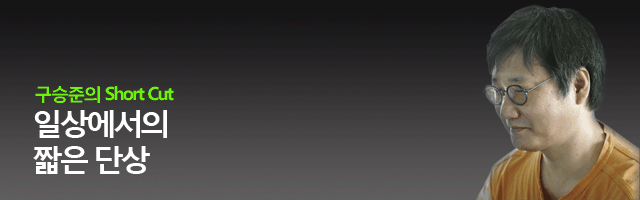내가 사는 동네의 시장 어귀에 작은 떡볶이집이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먹자골목’까지는 아니지만, 사거리에서 시작해 전철역에 이르는 300미터 가까운 길이의 시장통에 곱창집, 즉석 어묵집, 순댓국집, 떡집, 빵집이 각기 서너 개씩은 되는데 떡볶이집은 달랑 두 개라 아쉬워하던 차였다. 게다가 그중에 한 곳은 튀김을 받아다가 하는지, 막 튀겨낸 걸 먹어도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기는커녕 두껍고 눅눅하게 떡이 지게 씹혀서, 내 평생 처음으로 튀김 한 접시를 다 못 먹고 남기기까지 한 바 있다. 길거리표 튀김이야 원래 속에 든 내용물보다 바삭바삭한 튀김옷 맛으로 먹는 건데, 어린애 새끼손가락만 한 오징어 함량이야 그렇다 친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나머지 한 곳도 이보다는 준수하지만, 먹고 나면 번번이 속이 아파서 발길을 끊은 지가 두어 달은 넘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시장 어귀에 작은 떡볶이집이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먹자골목’까지는 아니지만, 사거리에서 시작해 전철역에 이르는 300미터 가까운 길이의 시장통에 곱창집, 즉석 어묵집, 순댓국집, 떡집, 빵집이 각기 서너 개씩은 되는데 떡볶이집은 달랑 두 개라 아쉬워하던 차였다. 게다가 그중에 한 곳은 튀김을 받아다가 하는지, 막 튀겨낸 걸 먹어도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기는커녕 두껍고 눅눅하게 떡이 지게 씹혀서, 내 평생 처음으로 튀김 한 접시를 다 못 먹고 남기기까지 한 바 있다. 길거리표 튀김이야 원래 속에 든 내용물보다 바삭바삭한 튀김옷 맛으로 먹는 건데, 어린애 새끼손가락만 한 오징어 함량이야 그렇다 친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나머지 한 곳도 이보다는 준수하지만, 먹고 나면 번번이 속이 아파서 발길을 끊은 지가 두어 달은 넘었다.
하지만 떡볶이집 신장개업이 무작정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껏 먹은 떡볶이 양만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베테랑 소비자로서 ‘될 가게인지, 안 될 가게인지’ 떡잎부터 관찰하는 은밀한 탐색전에 들어갔다. 일단 점포가 들어앉은 자리가 묘했다. 행인들이 오가는 통로에 면해 있는 게 ‘먹는 장사의 정석’이건만, 상가 건물의 안쪽에 뵈지도 않게 쑥 들어가 앉았다. 상가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바로 옆자리이긴 하지만 그리 발길이 닿는 곳이 아니라서, 이래서야 동네사람 대부분이 가게가 생겼다가 망해나가도 알 길이 없다. 오가는 행인들의 시각과 후각을 무차별 유린(?)하는 게 떡볶이집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호객’이건만,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무슨 배짱으로 생략해버렸는지 나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원래 나쁜 일은 겹쳐서 온다고 했다. 음식점이 후미진 지하나 상가 안쪽에 볕도 안 드는 자리에 있으면, 왠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손님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한다. 따지고 보면 미신도 아니다. 해가 안 들면 해충이 득실거리기 쉽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석진 자리는 케케묵은 음식 냄새가 오갈 데 없이 배이고 먼지도 켜켜이 쌓이게 마련이다. 주인이 청소를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유유상종’이랬다고 행인들이 슬며시 담배꽁초며 휴지를 버리기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음식 장사는, 특히 떡볶이 같은 길거리표 음식은 최소한 점포의 1~2 면이 통유리로 되어 지나는 사람이 무얼 파는 곳인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무슨 피치 못한 사연이 있는지, 이 가게는 고작 1미터나 될동말동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가게 외관에 ‘윈도우 페인팅’로 적힌 메뉴판을 보고서야, 나는 여기가 시장 골목에 생긴 세 번째 떡볶이집인 줄을 알았다.
그래도 몇 번의 곁눈질 끝에 막상 들어가 보니, 8평 남짓 되는 자그마한 가게를 꽤 알차게 꾸몄다. 테이블 배치도 효율적이고, 자리에 앉아보니 이 집의 최대 장점인 깔끔하고 위생적인 주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곧이어 작은 스카프를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처럼 날렵하게 맨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다가온다. 그러고 보니 삼십 대 중반쯤 되는 여자 둘이 파스텔 블루 앞치마에 분홍색 스카프를 똑같이 둘렀다. 오호라, 이게 콘셉트인가 보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포장마차형 떡볶이집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차림새다. 시장 골목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지만, 감각적인 윈도우페인팅이며 인테리어까지 더해져 젊고 트렌디한 장소에 와있는 듯한 기분도 준다. 메뉴는 떡볶이에 어묵, 꼬마김밥으로 단출하다. 꼬마김밥은 으레 받아다가 파는 것일까 봐 주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전부 국내산 재료로 직접 만든다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떡볶이에 곁들이는 ‘오뎅 국물’을 가져다주면서는, 한우사골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설명도 조용히 덧붙인다.
한마디로 ‘엄마표 안심 먹거리’를 지향한다는 얘긴데, 이것도 산전수전(?) 다 겪은 늙수그레한 소비자는 와락 반갑지가 않다. 지속가능한 가격이며 품질인지 염려가 돼서다. 시장통에 있는 다른 경쟁업소는 모두 여주인 혼자 주방도 보고 서빙도 보는데, 이곳은 작은 가게에 주방 따로 서빙 따로 둘이나 붙어있다는 점도 그렇다. 좀 더 오지랖을 펼치면, 장사 아이템도 공간과의 궁합이 중요한데 골목에 면해 있든 아니든 ‘시장바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을 바에야 ‘팬시한’ 인테리어의 떡볶이집보다는 수더분한 멸치국숫집이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떡볶이 한 접시에 서비스로 주는 ‘꼬마김밥’까지 하나 얻어먹고 자리를 일어섰다. 맛은 어땠냐고? 맛에 대한 뾰족한 노하우도 없으면서 인공조미료까지 뺀 음식이 대체로 그렇듯,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었다. 그래도 속은 편안했다. 이 세 번째 떡볶이집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다음번에 가면 어묵 국물에 한우사골은 됐고, 꽃게 다리나 몇 개 넣어보라고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