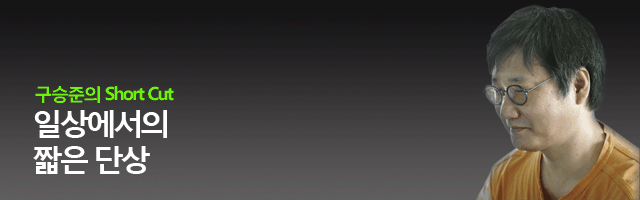한 인도인 친구를 가깝게 알고 지낸 적이 있다. ‘스리니바스 말라디’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해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 대열에 합류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갔고, 우리가 만난 것도 그 시절이었다. 집에 가는 나를 불러 세워 길을 물은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오만가지 상담을 하루가 다르게 내게 쏟아냈다. 인도인 특유의 생활력과 붙임성, 빠른 두뇌회전… 나는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친구의 ‘상상력’이었다.
한 인도인 친구를 가깝게 알고 지낸 적이 있다. ‘스리니바스 말라디’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지금은 미국으로 이주해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 대열에 합류했지만, 한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갔고, 우리가 만난 것도 그 시절이었다. 집에 가는 나를 불러 세워 길을 물은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한국생활에 대한 오만가지 상담을 하루가 다르게 내게 쏟아냈다. 인도인 특유의 생활력과 붙임성, 빠른 두뇌회전… 나는 모든 것에 감탄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그 친구의 ‘상상력’이었다.
하루는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심각한 트러블이 생겼다며 내게 상담을 청했다. 나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기업 분위기를 그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풀 수 있는 플랜A와 오해를 풀지 못하는 경우 고용계약을 마무리하는 플랜B를 내 나름대로 제안했다.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에 지레 질린 탓인지, 녀석의 걱정은 안드로메다로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 이를테면, 회사 동료들이 악의를 품고 고가의 회사 장비들을 자기 숙소에 몰래 갖다놓은 뒤, 경찰에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오는데 그만 어안이 벙벙해졌다.
허걱, 이것이 인도라는 나라의 상상력인가? 도대체 녀석은 이제껏 어떤 세상을 살아왔기에, 이런 ‘아침드라마’ 적인 복수극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고려하는 걸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워졌다. 인도 관광청이 몇 년 째 밀고 있는 슬로건인 ‘인크레더블 인디아(Incredible India)’가 ‘밑도 끝도 없는 인디아’로 해석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그렇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이 에피소드가 최근에 다시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인도시장 진출 전략 10계명’ 보고서를 보면서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원칙 하나를 주워섬겨보면 이렇다.
“비가 오면 물건값이 달라질 정도로 거래가 불투명하니, 구매는 반드시 직접 챙겨라.”
기가 막힌 얘기다. 물론 명절 무렵 쇠고기값이 슬금슬금 오르거나, 관광지의 음료수 값이 시중 가격과 판이하게 다른 일이야 한국 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종종 벌어진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 ‘인도 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이를 내세울 정도라면, 시장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소를 머금게 된다. 이렇게 낮은 ‘사회 신뢰도’를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폭발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극심한 빈부격차와 높은 문맹률과 더불어, 내가 인도경제의 성장 한계선을 낮게 잡는 이유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이다. 최근에 다소 주춤해진 감은 있으나,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978년 이후 연평균 10.0%에 달하며,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약 56배나 상승했다. 중국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는, 최근 3~4년 사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동향만 훑어봐도 드러난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투자 이민이 급증하면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범중화권의 부동산 값은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의 땅값까지 일제히 뛰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는,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 러시로 인해 “제주도는 20년 후 중국인의 정원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은 해외 부동산 확보나 투자 이민에 그토록 열을 올릴까? 돈이 될 만하니 투자를 하는 거라든지, 우수한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니 따로 언급할 게 못된다. 중국인들에게만 암암리에 작용한다는 그 불안감의 실체는 이것이다. ‘공산당이 언제 어떤 이유로 재산을 몰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 신뢰도’의 중요성에 대해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사회의 신뢰도는 그 사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인도와 중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얼마만큼 왔는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