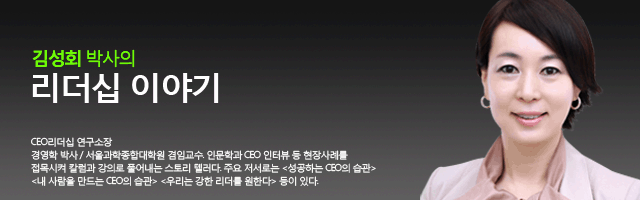리더들의 공통적 꿈이자 소원은 하나로 모아진다. 바로 구성원들의 동기 부여다. 산업화사회를 넘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직원들의 생산성은 근태가 아닌 ‘몰입’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푸념한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라는 생각이다.
관리자들의 시름을 더하는 것은 평생직장의 시대가 무너지면서 정착민의 주인의식을 불어넣기가 한층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가 돼있는 유목민 직원들에게 고대광실의 미래그림을 그려 줘 봤자, “그게 어디 내 집이고 내 꿈이냐”고 콧방귀를 뀌는게 요즘의 풍속도다.
며칠전 만난 K임원은 “요즘 직원들은 우리 젊을 때와는 너무 다르더라"며 "나때만 해도 대다수가 한번 입사한 이상 조직에서 최고경영자까지 올라가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는데 요즘 새내기들은 이런 게 없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마디로 승진 등 명예욕 자극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다.
공감하는가. 그렇다면 리더들은 손 놓고 수수방관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관리자급 이상의 리더들과 일선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요소가 다르다는 점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서 찾을 수 있다.
경영학자 존 R 카첸바흐는 “조직의 상부 사람들과 일선 직원들의 동기 부여 방식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보수가 다르고 승진 욕망이 다르며, 개인의 발전에 대한 꿈도 다르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다르다”고 강조한다. 관리자들이 영향력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직원들은 자신의 회사제품, 리더, 서비스에 대한 주변인, 고객의 관심이란 감정적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필자 역시 기자시절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한 것은 독자들의 감사 피드백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한 콜센터 직원 대상의 동기부여 실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일의 의미 자각’이 직원들의 자부심 뿐 아니라 생산성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콜센터는 대학기부금을 모집하는 곳으로, 이직률이 높고 성과나 근무 사기가 낮은 곳이었다.
그랜트 교수가 사용한 동기부여 방법은 단순하다. 콜센터직원들과 장학금 수혜 학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5분의 티미팅을 갖도록 했다. 한 달 뒤 그랜트 교수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티미팅 실험(?)을 한 직원들이 잠재 기부자들과 통화를 시도한 것이 기존 시간의 2배나 됐고, 모집된 기부금 역시 주간 185.94달러에서 503.22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영업파트가 아닌 내근파트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고객과 접할 기회를 자주 만들라. 자신의 일에 대한 고객의 견해와 반응을 다양하게, 빈번하게 접하게 하라. 일상성과 관성의 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부심도, 생산성도 함께 커진다. 비록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관성화 된 일상적 업무’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지금 리더인 당신은 혹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그치며 혀만 차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에 우선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부터 정의해보라.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를 실감할 기회를 마련해 보라. 직원들의 잠자는 열정에 불을 댕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리더인 당신은 혹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그치며 혀만 차고 있지는 않은가. 그 전에 우선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은 누구인가’부터 정의해보라.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를 실감할 기회를 마련해 보라. 직원들의 잠자는 열정에 불을 댕길 수 있을 것이다.
김성회 CEO리더십 연구소장
경영학 박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인문학과 CEO 인터뷰 등 현장사례를 접목시켜 칼럼과 강의로 풀어내는 스토리 텔러다. 주요 저서로는 <성공하는 CEO의 습관> <내 사람을 만드는 CEO의 습관> <우리는 강한 리더를 원한다> 등이 있다.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