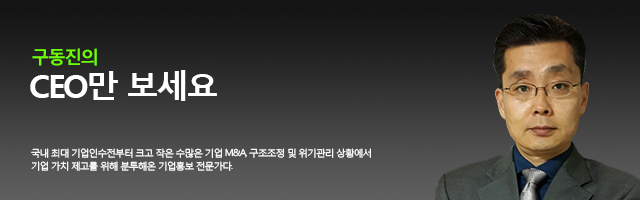우리 나라에는 여러 바보들이 있다. 얼마 전 선종 10주년을 맞은 김수환 추기경도 살아 계실 땐 기꺼이 ‘바보’를 자처하며 가장 낮은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하고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노 전대통령의 별명도 ‘바보’였다. 2020년에 50주기를 맞이하게 되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으나 유머를 잃지 않았고 ‘바보’라는 별명을 갖게 될 만큼의 청년이었다고 후대가 평하고 있다.
아름다운 바보들이 많다. 바보의 어원은 밥+보에서 ‘ㅂ’이 탈락된 형태다. 밥만 먹고 하릴없이 노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런 사람을 경멸하는 뜻에서 낮춰 표현한 말이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딱 맞는 표현으로 아내 밖에 모르는 아내 바보, 딸이나 아들 생각뿐인 딸바보, 아들바보도 주위에 많다. 의외로 주위에 보면 진짜 바보들도 많다. 바보들의 천국인지도 모르겠다.
전 직장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회사 소개를 위해 자료를 만들던 참이라 현업 여기 저기를 다니면서 자문을 구했다. 영업팀도 가보고 계열사들도 가보고 연구소에 들러서 이것 저것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 같이 제대로 된 답변을 구할 수가 없었다. 당장에 외부 투자 설명회도 해야 하고, 자료집도 만들고 하려면 사업에서 업데이트 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한참을 지켜보던 재무담당 부사장이 나를 불러서 한마디를 했다.
“그 바보들한테서 뭘 기대하지 말아.”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일들에 대해 알려면 가서 물어봐야죠.”
“그 바보들은 뭘 얘기해야 할 지도 모르고, 해도 되는 지 판단도 못해.”
“아니, 어떻게 그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위에 가서 직접 물어봐.”
“예? 아래 현업에서 하는 일들을 왜, 위에 가서 물어봐야 하나요?”
“아 글쎄, 그 바보들한테는 백날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술 싫다는 사람에겐 술 사주고, 좋아하는 사람에겐 밥만 사줘라
실제로 현업에서는 말을 해주면서도 연신 ‘이런 내용을 말 해도 되는지, 위에 여쭤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직접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꿰고 있지도 못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고객사의 담당을 만나서 식사를 할 때도 뭘 먹어야 할 지와 식사 후에 맥주라도 한잔 할 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위에 물어보고 지시 받아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게다가 ‘저녁은 한식으로 하고, 2차로는 맥주집에 가고, 금액은 얼마 정도에 맞춰 영업을 하라’는 지시까지 알려주는 위는 더 놀라웠다. 영업 담당자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소위 위에선 고객사에서 나올 사람이 팀장급 이상이면 한정식과 2차로 술이, 그게 아니라 팀원이면 삼겹살에 가벼운 반주 정도로 줄이라는 판단을 내려주곤 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직원과 추후에 나눈 대화는 더 놀라웠다. 사실 고객사 부장은 명색은 팀장이지만 실제 업무는 다른 분야여서, 타깃 영업 대상은 과장인 팀원이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부장은 술을 즐기지 않아서 차 한잔 정도가 좋고, 팀원은 말이 팀원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고, 술을 무지 즐긴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부장은 그냥 인사 정도만 챙기면 되고, 팀원에게는 제대로 된 접대가 필요하다고 뒤늦은 하소연을 토해냈다.
“아니, 그걸 아까 말씀 드렸어야지.”
“에이, 그러면 이상한 얘기까지 들어야 해요. 간단히 끝내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술 싫어하는 사람에겐 술 사주고, 술 좋아하는 사람에겐 밥만?”
“할 수 없죠. 뭐”
“…………..”
우여곡절 끝에 자료집을 만들고 진행해야 할 일들을 쳐내긴 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현업팀과 회의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던 차에 또 다른 얘기를 듣게 됐다.
“재무팀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에요. 늘 현업과 동떨어진 판단만 해요.”
“예? 재무 쪽에서는 현업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위에 보고합니다.”
“엥? 둘이서 얘기하면 될 것을, 이쪽은 위에다 얘기하고, 저쪽은 위에서 듣고?”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죠. 괜히 우리가 얘기했다가는 위에서 뭐라고 할 거고, 판단은 위에서 하고, 우린 시킨 일이나 하는 거죠.”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완벽한 기업이나 조직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가 취업하고 싶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부러운 마음을 담은 몇 마디를 건네보면 어김 없이 ‘우리 회사도 별 거 없어요’라며 조직이 가진 한계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가장 완벽할 것 같은 조직인 정부부처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역시 불만들은 상당했다. 하물며 그런 조직의 구성원도 불만을 가지는데, ‘그런 조직의 발 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목을 메고 있는 나는 뭔가’ 하는 허탈감이 들곤 했다.
최선을 다해 일하기 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데에만 최선을
대부분 그 시작은 최고경영자가 직원들에게 심은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직원들이 겁을 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조직 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의 말 한 마디에 조직원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싶거나 좀 못 마땅해 보이는 직원에게는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며, 어김없이 승진과 보상에서 밀어내 버린다. 직접 언급은 없었더라도, 가장 높은 의자에 앉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진자 대상에 끼워 넣어서 적극 지지할 인사담당자는 없다. 한 두 번 CEO의 지적만으로도, 모든 조직은 일단 알아서 맞춰져 돌아간다.
조직 구성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일단은 움츠리게 되어 있다. 심적인 동력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다지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는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秦)나라의 시황제와 두 번째 황제인 영제를 섬겼던 환관 조고(趙高)에 얽힌 이야기다.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은 조고가 사슴을 끌고 와서는 ‘황제를 위해 좋은 말(馬)을 구해왔다’고 고했다. 아무리 멍청한 호해였지만 말과 사슴 정도는 구분할 줄을 알았기에 농담하지 말라고 하자, 조고는 중신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사슴인지 말인지?’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다. 대부분은 말이라고 했고, 사슴이라고 답한 몇몇은 얼마 안가 죽임을 당했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사슴과 말을 구분하지 못할까 만은 두려움에 몰아 넣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인간의 두뇌는 두려움을 느끼면 항상 일신의 안위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우선 CEO 앞에서는 그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게 된다. 불편한 진실, 다시 말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위기의 징조가 보이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된다.
두려움과 수치심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리더는 결국 진실에 눈과 귀를 막게 되고 바보로 전락한다. 기업은 돈이 돌지 않아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망한다. 내부에 제대로 된 역량과 인재가 없어서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있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다. CEO와 그를 둘러싼 직원들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가는 마당에,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사슴을 말이 아니라고 사슴이라고 지적한다면 결국 피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천하의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사 사정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CEO다. 나 역시 그랬다."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CEO라고 손꼽는 잭 웰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CEO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직원들이 나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 지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전지전능을 보유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