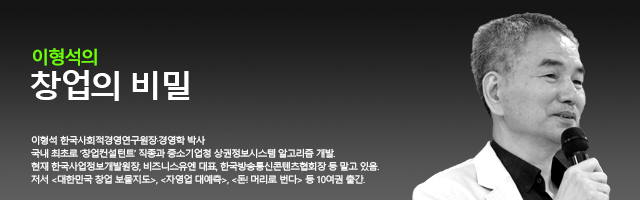미국의 신경경제학자 폴 자크는 신뢰를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거창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신뢰는 우리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창업이나 기업경영에서 어떠한 역량이나 물리적 자본보다도 그 비중이 크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결과고, 연일 불거지고 있는 기업들의 위기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의 과도한 욕심과 오너리스크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본, 즉 물리적 자본에는 관심이 크면서도 보이지 않는 심리자본 ‘신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사회가 선진화되고 연결과 융합이 절대적인 4차 산업이 진전될수록 신뢰는 그 어느 자본보다 큰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하는 자원의 총합’을 말한다. 자원의 총합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산출물이다. 즉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유되는 물리적 상품과 심리적 감정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유 가능한 물리적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 확실한데 신뢰는 물질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까? 신뢰에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다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것이고, 관계에서는 믿고 의지하는 힘이 평판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다.
미국 듀크대학 비즈니스스쿨에서 낸 자료를 보면 소비자는 저렴한 단가(16.8%)보다 신뢰(18.7%)가 구매결정에 더 영향을 끼친다. 특이한 것은 매년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신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과거에는 비즈니스모델이나 매출증가율 등을 봤지만 요즘에는 ‘태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여기서 태도는 창업가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신뢰가 훼손되면서 잘나가던 기업이 추락한 경우도 있다. 1939년에 창업해서 프린터와 컴퓨터 등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IT기업 휴렛팩커드(HP). 이 회사는 한때 “업무에 필요하다면 회사의 무슨 물건이라도 반출해도 좋다”고 해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이 언론사에 불리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색출하려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한 결과 지금은 유능한 직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사세도 기울어지게 됐다. 한때 HP의 직원에 대한 신뢰경영을 ‘HP Way(HP방식)’라고 해서 미국의 주요 MBA 과정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직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탐정을 고용하는 악수를 둔 바람에 불신을 초래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제 ‘신뢰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할 차례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지만 현실적 정의는 ‘상대 능력이나 의도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그럼 상대능력과 의도를 어떻게 평가해서 신뢰를 쌓게 되는지가 핵심인데 바로 상대가 주는 정보에 기반한다.
상대가 나에게 주는 정보가 참이고, 그게 반복되면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반대로 그 정보가 거짓이면 불신으로 이어진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비용은 처음 신뢰를 쌓을 때보다 훨씬 많이 든다. 한 연구에 의하면 떠나간 고객을 다시 단골로 만들려면 신규고객 11명을 유치하는 것만큼 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신규고객 11명을 유치하기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기업에게 유리하다.
불신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달함으로서 피해를 피하라는 사회적 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당한 언짢은 기분을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안 좋은 기분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심리다. SNS가 보편화되기 이전 자료들을 보면, 좋은 정보는 하루 평균 8명에게 전달될 뿐이지만 나쁜 정보는 48명에게 전달된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불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60%가 그 사실과 무관한 사람에게 전달했으며 45%는 그 사실을 혼자 안고 가기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논문도 있다. 고객의 컴플레인을 진정성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돌이켜보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도 단지 두 사람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되돌리지 못할 국제적 신뢰손상을 당한 사례다. 이 사건에서 보듯 신뢰는 오랫동안 쌓았더라도 불과 한두 명에 의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사례는 흔하다.
상호 신뢰를 갖고 있다가도 고의든 실수든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 진정한 자기반성 ▲결과에 대한 책임 ▲과정의 투명성 ▲정확한 정보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진정한 자기반성이 중요하다. 잘못했을 경우, 빠른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도 상대가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가습기 사건이 터진 지 5년 만에 사과한 옥시크린, 운전기사 폭행과 폭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치즈통행세’와 보복영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 등도 진정성 없는 뒤늦은 사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약서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업 간 분쟁이나 사기사건이 적었다. 요즘에는 정보 하나를 주더라도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야 할 만큼 삭막해진 것 같다.
“왜 가난한 나라는 가난하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것일까?” 이에 대해 MIT의 세자르 히달고 교수는 ‘정보의 교환속도 차이’라고 해석했다. 정보교환의 속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환의 ‘질서’가 중요하다. 즉 정보를 교환할 가치가 있는 사람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가치란 상대의 성품과 역량이며 기업에게는 품질과 이미지다.
우리가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거래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상대방을 검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뢰한다면 그런 소비되는 시간만큼 사업에 힘을 쓸 수 있다. 신뢰는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고, 사업에 전념하게 해주는 힘을 준다. 기업에 대한 신뢰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다음 상품의 매출을 예측하게 해준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는 최고의 자본이 신뢰라는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윈저효과라는 것이 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바른 정보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이론과도 연결된다. 구조적 공백이란 인적 네트워크에서 직접관계하지 않은 제3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소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인데 흥미롭게도 나를 잘 아는 직접관계자보다 제3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직접관계자에게 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언제 누구와 만나든 바른 정보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은, 신뢰한 사람을 잃고 나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