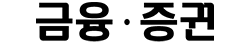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셰일혁명과 미중 무역전쟁의 공통점은 ‘글로벌 패권’에 있다.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직후 달러, 원유를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를 지향하는 모습이다.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달러와 유가의 상관관계는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체력이 강해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중국의 유일한 수단이자 핵심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은 미국의 무역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무역전쟁이 화폐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전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국이 오는 27~28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취소했다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 아래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2000억달러(약225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1월부터는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추가 관세 품목에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다만, 애플 스마트 워치와 여타 IT기기 등은 그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미국이 연말 소비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또 ‘순차적 부과 방식’은 중국에 대응할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시장의 이목은 중국의 대응으로 쏠렸다. 결과는 미국산 수입품 600억달러 규모에 5~10% 관세부과로 맞받아쳤다. 예상보다 낮은 수위에 시장은 안도했다. 특히 미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원유 등의 품목은 제외했다.
이에 무역갈등이 파국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중국이 협상테이블에 응하지 않는다는 소식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체력 강해진 미국 대응 가능할까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경제우위 등을 배경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시작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은 ‘중국제조 2050’를 겨냥해 중국의 기술발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무역 전체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에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도 대립구도는 경계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등으로 미국 기업의 로비를 유도해 협상력을 제고 중이다.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관세 부과가 수입가격 상승과 미국 기업 피해 등을 간과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양국의 ‘갈등’이 자본·금융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직접적인 영향은 제외하더라도 홍콩을 통한 간접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홍콩은 달러 페그제를 적용 중이다. 달러 당 7.8홍콩달러를 중심으로 7.75~7.85로 설정하고 있다. 페그를 유지하려면 미국 금리인상 시 홍콩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문제는 홍콩의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PIR 19.4배)이 발목을 잡는다. 페그제가 붕괴되면 홍콩은 아시아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중국본토로 자금공금기능도 위축돼 결국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된다.
왜 ‘팍스아메리카나’인가
미국 경제는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견디기에도 충분한 체력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흥국은 좌불안석이다.
미국의 향후 경제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호황 국면 지속과 경기정점이라는 진단이 대치하고 있다. 다만, 달러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코노믹리뷰>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달러(인덱스)와 유가(WTI선물)의 상관계수를 시기별로 도출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부터 오일쇼크까지 약해졌던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플라자합의 이후 음(-)의 관계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아메리카나’ 시대가 열렸다. 달러는 기축통화가 됐고 미국은 60년대까지 원유를 수출했다. 금본위제도 하에 유가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세븐시스터즈(7 Sisters)로 불리는 서방의 메이저 석유업체들이 글로벌 석유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전쟁(1960~1975년) 등으로 국제수지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비 조달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낸 결과 달러 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일부 국가들은 미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고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렸다.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달러 변동성도 확대됐다. 미국은 1973년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외교문제에 있어서 에너지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두게 된다.
미국은 1975년 ‘에너지정책 보호법’을 제정하고 원유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해 수출한다는 약속도 받았다. 원유가 ‘검은 황금’이라 불리게 된 계기다.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결정권을 넘겨주게 되면서 미국의 힘은 약해졌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2차 오일쇼크 발생의 타격도 불가피했다. 달러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반전은 아시아외환위기 이후부터였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1990년대부터 미국 경제는 제조업체들의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와 유가의 음(-)의 상관관계도 더욱 강해졌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로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기축통화로서의 기반도 단단해졌다.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셰일에너지 혁명은 2014년 유가 급락을 불러왔다. 미국은 달러와 유가의 결정권을 동시에 거머쥐게 됐다. 달러와 유가의 관계를 보면 미국의 국제 시장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재림이다. Fed의 금리인상에 국제시장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지 없는 미국·중국 패권 도전, 금융시장 살얼음판 되나
미국이 과거의 위상을 차지했다고 해도 공조 없는 독단 행동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플라자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무리한 요구였지만 유럽 등과 같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현재 미국은 유럽은 물론 캐나다, 일본 등 기존 우호국들을 전방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의 최대 수출품목은 달러’라는 말이 있다. 기축통화가 가지고 있는 ‘트리핀 딜레마’의 숙명이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내 달러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반면, 무역흑자가 지속되면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한 미국이 ‘과도한 자신감’에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패권은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있다.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더욱 주목되는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