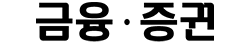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국내 증권산업은 여타 금융업(은행, 보험 등)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도 주체는 대형증권사다. 그만큼 중소형사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증권사별 특화를 지향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증권업 내 양극화에 일조했다. 중형사는 중기특화 등으로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문제는 소형사다.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부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 소형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적극 공략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에 따른 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국내 55개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6978억원이다.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총자산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411조원으로 2013년 1분기 이후 5년간 52.1%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은행업(일반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의 총자산이 34.2%(2249조원→3019조원),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이 44.9%(768조원→1113조원) 증가한데 비해 빠른 속도로 늘었다.
증권업 규모가 확대된 배경에는 대형사의 급성장이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대형사의 평균 총자산은 44조3600억원으로 중형사(19조200억원)의 2.3배에 이른다. 대형사의 총자본은 5조1522억원으로 중형사의 2배를 넘어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사와 중형사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변화다.
실제로 2012년말 기준 대형사의 평균 총자산은 20조1600억원으로 중형사(13조8900억원)의 1.45배에 불과했다. 총자본은 대형사가 3조3698억원, 중형사는 1조7669억원으로 2배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증권산업에서 대형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2013년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프라임브로커 등 신규업무를 허용했으며 2016년 8월부터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했다.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통해 신규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대형증권사들이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몸집을 키웠다.
부채의존도를 나타내는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증권사 규모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소형사의 자기자본비율은 13.8%로 중형사(12.5%)와 대형사(11.6%)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은 모두 80%대 후반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RP매도와 매도파생결합증권으로 대표되는 시장성자금조달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형사(53.1%)와 중형사(49.4%)에 비해 소형사(38.6%)가 다소 낮았다.
자산별 각 구성요소 비중을 보면 현금과 예치금이 15% 안팎이며 증권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파생상품과 기타는 20% 내외다. 이 역시 증권사 규모와 관계가 없다.

수익구조는 일부 비중에서 차이가 있지만 투자은행과 자산관리의 비중이 낮은 것은 동일하다. 먼저 증권사 규모와 관계없이 위탁매매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다. 반면, 대형사와 중형사가 자기매매(38.4%, 35%) 비중이 높고 소형사는 투자은행(IB) 수익비중(27%)이 중대형사(12%) 대비 높았다.
장정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 자산 규모 차이에도 자금조달과 수익구조가 차이가 없다”며 “증권사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증권사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국내 증권사의 평균 법정필요자기자본은 1219억원으로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되기보다 종합증권사를 지향한다. 증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과 업무의 동질성 탓에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가 특정부문에만 집중하면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증권사의 자금조달 구조나 수익구조가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이유라는 지적이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등 최근 제도들은 특정 사업부문 시장진입을 일부에게만 허용하는 형태다. 규모의 경제 등을 활용한 독점 상품판매가 가능하다면 시장지배자적 지위 확보를 위해 규모를 확장할 유인도 크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수혜를 입는 증권사들의 유인체계는 다른 증권사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수익구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업의 경쟁강도는 대형화의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집중도를 표현하는 HHI(허핀달-허쉬만지수)는 2009년 이후 자산관리·상품판매를 제외한 여타 수익부문에서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HHI 지수가 상승하면 시장집중도는 높아지고 경쟁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뜻한다. 다만, 자산관리·상품판매는 2013년을 기점으로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HHI 수치가 전반적으로 낮아 시장이 집중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부문에서는 시장지배적 성격을 가진 몇몇 증권사가 독과점으로 수익을 향유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는 타 상품에 대해서는 시장지위가 높은 증권사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기존보다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금융상품들이 등장한다면 대형사들에 의한 과점시장도 사회후생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형사의 입지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형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이든, 다른 소형사 혹은 IT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혁신 금융상품과 같은 니치마켓은 기존 증권사, 특히 중대형사보다 소형사가 적절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장 연구위원은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 소형사의 장기 생존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