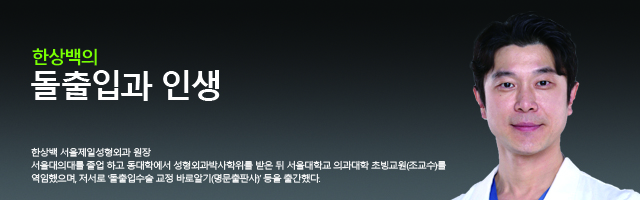오늘 수술할 돌출입 환자와의 집중 상담이 끝나고 창밖을 보니, 병원 밖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병원 안에서는 이제 돌출입 수술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필자는 수술 전에 환자와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입이 들어가는 정도, 앞턱 끝의 길이와 위치 등 환자가 원하는 입매에 대한 취향,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토의할 뿐만 아니라, 인중의 길이, 입술의 두께, 입꼬리의 방향, 비대칭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한다. 또한 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를테면 연기자 지망생인지, 주부인지, 미혼인지, 공무원인지, 하다못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지까지도 메모해놓는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을지, 얼마나 눈에 띄게 예쁘게 해주면 좋을지도 이런 곳에서 감이 온다. 환자가 좋아하는 배우의 옆모습 사진을 수줍게 내밀어도 좋다. 웬 배우 사진이냐고 면박을 주는 병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환영이다. 환자가 원하는 입매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수술하는 돌출입 환자는 10년 전부터 돌출입수술을 하리라 마음먹고 필자와 필자의 병원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수술하게 되었다고 한다. 돌출입을 지닌 사람들은 사실 구강 쪽 ‘기능’에는 거의 항상 아무 문제가 없다. 돌출된 치아로 무를 갈아내던 모 개그맨에서 보듯이, 기능으로만 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돌출입 수술의 특성상, 얼마든지 미룰 수 있고 미루어도 된다.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10년 동안이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과 대비된다.
* * *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는 속설이 있다. 필자도 가을 꽤나 타는 남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무던해졌다. 무뎌진 것은 편리하지만 서글픈 일이다.
그래도 가을이 되면 한 번쯤, 필자는 갓 스무 살을 넘긴 때의 대학 캠퍼스를 떠올리곤 한다. 필자가 다녔던 관악캠퍼스의 가을 단풍은 장관이었다. 아니, 장관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가슴 뭉클하도록 그립지만, 사실 그땐 너무 새파랗게 젊어서 붉게 물든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필자의 마음 속 신비의 공간처럼 각인되어 있는 곳은 자하연이라는 연못이다.
‘샤’ 마크로 불리는 거대한 학교의 상징이 고압적으로 서 있는 정문, 천재와 영재와 수재와 공부벌레들이 득실득실한 찬바람 나는 강의실과 도서관이 20세의 필자를 압도했다면, 자하연은 시공간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블랙홀 같이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곳이었다.
가을비 내리는 어느 날, 그 신비로운 연못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위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을 기억한다. 필자는 혼자 그 다리를 건너본 적이 있다. 연인이 함께 그 다리를 건너면 헤어지게 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았다. 믿을 수 없었지만, 여자 친구가 생기면 절대 같이 건너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몇 해 전 어느 가을, 전신마취 하의 돌출입, 안면윤곽, 양악수술 스케줄을 여간해서는 잡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돌출입수술을 하나 가뿐하게 마치고 홀로 모교 캠퍼스를 찾았다. 필자가 아직 가을을 탈 때였다. 더듬거리는 기억으로 찾아간 자하연은 변해 있었다. 전에 없던 깔끔한 벤치와 발코니, 수중분수를 갖춘 잘 정비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그리고 돌다리는 없었다.
아아, 자하연에 다리가 없다. 이제 자하연의 다리는 건널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전설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자하연을 같이 건넜던 연인들은 정말 헤어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헤어졌을 것이다. 대학에 가면 누구나 자기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스무살 갓 넘긴 애송이 커플들이 십 년쯤 연애를 계속해 결혼에 골인할 확률은 희박하다. 물론 다리를 안 건넜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요컨대 당시 대학 1, 2학년인 제 연인의 손을 잡고 객기로 다리를 건넜던 커플들은 거의 다 지금쯤 다른 남자의 아내,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하연 돌다리의 저주가 현실이 된 셈이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저주 덕택에 지금 더 행복해졌을 수도 있다.
사랑이든 뭐든 처음이고 서툴 때는 다 떨리고 불안하고 위험하다. 첫 수술은 어떨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떤 의사든지 첫 수술이 있다. 당신이 그 첫 수술의 대상이 되기는 정말 싫겠지만, 여하튼 처음이 없으면 숙련된 의사도 없다. 물론 제멋대로 첫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급자가 손잡아 가르쳐주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필자에게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초집도 기념패’가 있다. 의사로서 처음 사람의 몸, 환자의 몸에 칼을 댄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날 외과의사로서의 운명이 결정된다. 아니, 결정되어 있던 운명이 드러난다.
필자가 이제는 일상처럼 여기는 돌출입이나 안면윤곽 수술 역시 마찬가지다. 필자에게도 첫 돌출입수술, 첫 윤곽수술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십여년 전의 일이다. 그때 필자의 손을 잡아 가르쳐준 은사님, 선배님에게 감사한다. 다행히 당시 돌출입, 양악 수술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그땐 지금보다 더 수술을 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권위자로 알려진 어떤 교수나 의사라도 처음에는 서툴기 마련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환자가 명의를 만들어준 셈이다. 즉, 집중적인 수술 경험이 훌륭한 의사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물론 똑같은 수술이 반복되어도 실력 차이는 존재한다. 수술 솜씨가 정말 남다른, 위대한 외과의사(Great Surgeon)가 자주 탄생하지 않는 이유다.
오늘 수술하는 돌출입수술 환자가 “10년 전부터 원장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찾아왔어요”라고 하던 날, 필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아무래도 더 낫겠지요.”
흔한 이야기지만 역시 사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열정의 스무 살, 그때의 서툰 사랑은 풋풋하고 아름답지만 참 깨지기 쉽고 영원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수술도 의사와 환자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처음 해보거나 몇 번 안 해본 수술은 의사에게는 짜릿하지만 환자에게는 우울하고 불안한 경험일 것이다.
한편, 경험이 많은 사랑의 방식은 순수함을 잃고 능글거리고 지나치게 세속적이 되기 쉽다.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은 의사는 타성에 젖는 매너리즘과 만용 그리고 과욕을 경계해야 한다. 순수함과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수술 받을 의사를 찾아다니는 환자도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언제쯤 만나게 될까? 어느 소설 속 여주인공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우리가 늦게 만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하연에 가보고 싶다. 연못에 떨어진 단풍잎이 온 몸으로 가을비를 받아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