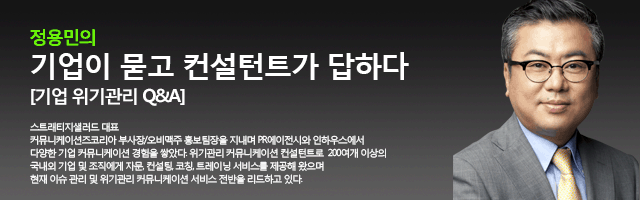[기업의 질문]
“최근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 저희 직원 하나가 언론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취재 후 방송을 보니 저희 직원이 논란이 더 커질 만한 이야기를 했더군요. 그래도 그게 그냥 직원 실수인데 저희를 나쁜 회사 취급까지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실수 하나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컨설턴트의 답변]

기업 관련 논란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해가 모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언론이나 논란의 원점에 있는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이슈화를 하죠. 이 직후에는 압도적으로 언론 취재 내용이나 원점의 일방적 주장이 전체 여론을 지배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문제는 또 그 이후죠. 당시 편향된 여론의 방향을 덜 편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해당 기업입니다.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단, 그 메시지가 정확하고 전략적이어야 하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논란이나 위기가 발생해 상황이 가변적인 상태에서 나름 메시지를 스스로 확인해 정리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 더해 전략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감도 오지 않아 허둥대게 됩니다.
일단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해 메시지를 정리해야 하겠지만, 상황이 가변적이라면 어느 정도 메시지상에서 변화 가능성을 명시해 주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상황 업데이트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논란이나 위기 시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결과 보도 형식의 언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체 수도 그렇고, 보도 지면이나 시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는 사실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최근에는 위기 시 단순 결과에 대한 보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계형 보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을 처음부터 계속 따라가며 연속 보도하는 것이죠. 마치 올림픽 게임을 중계하듯 실시간 정보들을 기사화하고 보도합니다. 기업이 이에 맞추어 전략적 대응을 하려니 힘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도자료나 사과문 하나로 가늠하던 것이, 이제는 상시 기자회견을 해도 어렵습니다. 홍보실이 쏟아지는 전화를 다 받아내지도 못하고, 연락 자체가 두절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은 당연히 기업 내부와 연결된 다양한 정보 소스를 찾아냅니다. 일반 직원들로부터 전직 직원은 물론입니다. 전화를 받는 모든 직원은 언론의 취재원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창구가 다원화되는 것이죠. 재앙은 그때부터입니다. 중앙에서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 비공식 창구들이 개인적으로 수도 없이 뚫리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터진 둑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질문 속 그 직원은 실수가 아니라 해사 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나 처벌 이전에 평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창구일원화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얼마나 진행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직원은 누구나 기자의 질문에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회사 스스로 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우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가짜로 “늑대다!” 외쳤을 때는 재미만 보고, 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했죠. 그러나 실제 늑대가 나타나 울며 “늑대다!”를 외쳤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업이 자꾸 설화를 만들어 공중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게 되면 이런 ‘양치기 소년’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