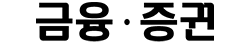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제2금융권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한 번은 경험해본 일이 있다.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알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상 ‘주거래 은행’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2금융권은 물론 모든 은행은 소비자를 ‘주거래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은행은 두 가지 부류를 좋아한다. 돈을 많이 맡기는 사람과 이자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자산이 적거나 이자를 꾸준히 낼 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금융서비스 상담 자체가 어렵다.
대출금리는 은행 연동채권금리(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6개월 변동금리’라는 것은 ‘금융채 6개월’ 금리(1.8%)에 은행의 비용과 마진을 붙여 정한 이자라는 뜻이다. 대출금리에서 금융채 금리는 6개월 후에 그 시점의 금리를 반영해서 갱신하지만 가산금리는 한 번 책정되면 바뀌지 않는다. 금융채 6개월 금리 1.8%에 가산금리 5.2%가 더해져 대출금리가 7%라고 할 경우 연동채권금리(1.8%)는 금리가 오르면 바뀌지만 가산금리(5.2%)는 은행이 고정한 만큼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소비자들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은행도 알릴 의무가 없다. 은행 내부에서 비공개로 사용하는 산정식이다. 은행 실무로는 소득의 가중치가 얼마인지, 부수 거래의 가중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밴드 정도만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당국은 “시장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지나친 영업 개입”이라며 발을 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며 은행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발품을 팔기 전 제2금융권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나의 최종 신용을 높여 가산금리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신용등급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기본 요소이자 소비자에게 알려진 객관화된 지표다.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가산금리 책정방식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제2금융권 소비자 중 6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융이용 실적을 올리고 신용등급 상승을 꾀할 수 있다. 여기에 신용카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자산관리가 수월해진다.
우리나라가 금리인상기 국면에 들어서면서 연 3%대 정기 적금도 등장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묵혀놓을 곳이 많아진 셈이다. 은행이 돈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를 선호하는 만큼, 저축은 신용점수와 가산금리 책정 수준을 함께 높일 방법이다. 소비자의 자산 증가는 덤이다. 이는 2금융권 소비자부터 모든 금융권 소비자까지 해당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계와 금융계 회사 간 조달금리 격차도 벌어졌다. 양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계 기업이 더 낮은 금리에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계 금융도 파격적인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제2금융권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차피 발품을 팔아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신용등급을 관리하며 은행 대출상담원과 마주 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침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카드와 저축을 적절히 이용해 신용등급을 올릴 시기도 찾아왔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해 1금융권에서 값싼 대출을 받을 것인가. 무더운 날씨에 은행을 찾아 나설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