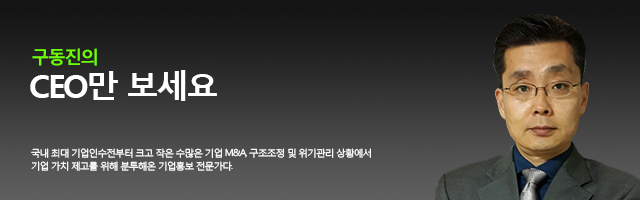식당 예약, 문구·간식·음료수·선물 구입, 하찮아 보이는 것들?
2002년 벤처기업에 근무할 때였다. 인력이 부족해 사내의 여러 잡무를 위해 잠실 지역 상업계 여고 졸업반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2명을 뽑았다. 그로부터 좀 뒤에 사장 비서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가량 쉬어야 했는데, 여직원들이 순번을 정했던 모양이었다. 중요 손님들에겐 찻잔을 이용했기에 설거지도 필요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여고생 직원 둘 다 참았던 속내를 털어놓고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
“차 타고, 설거지나 하려고 회사 들어온 줄 아세요?”
어리다고 도맡아 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선배들도 돌아가며 하던 일이었는데 참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개수대에 손 담그는 것을 참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아무리 귀천이 없다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평가받기 쉽다. 누구나 고개 끄덕일만한 대단한 일을 원한다. 그게 곧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스포츠단을 운영하던 때의 일이었다. 40대 과장 두 명이 임원실에 불려가서 한참 동안 혼이 나고 풀이 죽어 돌아왔다. 주요 임원들이 참석하는 빅 게임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큰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됐다.
“기념품으로 호두과자 한 상자씩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누가 단 것 좋아하냐고, 덜 단맛으로 준비하라시네요.”
‘호두과자가 달아봐야 얼마나 달고, 또 덜 달면 얼마나 덜 달까?’하는 마음에 두 과장을 달래긴 했지만 필자 역시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날짜가 다가오자 회사에서 관심 가지는 것은 메인 행사 내용과 경기가 아니었다. 행사 전후에 필요한 자잘한 것들이었다. 생수는 계열사 대표의 지인업체 제품을 준비해야 했다. 시합 후 식사 때 사용할 건배주는 충남의 유명한 막걸리 외에 경기도와 경상도까지 아우른 자료를 조사해서 브리핑했다.
인사말을 포함한 행사의 주요 콘텐츠 보고는 한 번에 끝났지만 식사 메뉴, 단체 이동, 막걸리, 생수, 중간 간식 그리고 호두과자 등에 대해서는 서너 차례 이상 보고한 끝에 겨우 통과됐다. 당일 이슬비가 예보됐는데 대형 우산도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해 행사는 별 탈 없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보다 막걸리가 맛이 있었다는 평으로 대신했고 이에 다들 흐뭇해했다.
승부는 디테일에서 갈린다
2012년 3월 23일, 당진군에서 A모 그룹의 대형 행사가 열렸다. 착공해서 무려 3년 하고도 6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세계 최대의 단일 생산공장 완공을 기념했다. 행사 준비를 주관한 총무팀에서 본사와 공장 인력이 총동원되어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군수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확인도 했고, 전세버스, 무대 설치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기획과 홍보팀에서 콘텐츠를 준비했고 사전 리허설까지 맞춰보며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참석자 대부분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상당히 잘 진행됐다’는 평이었다. 그런데 일주일여가 지났을 무렵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총무팀장이 갑자기 공장의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 본사 총무팀장에서 공장 물류팀원이 되었는데, 다들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려운 여건에서 행사를 잘 준비했던 사람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하다는 말이 돌았지만, 거역할 순 없었다.
알고 보니, 계속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 하필 행사 당일 새벽부터 비가 오락가락 한 날씨가 문제였다. 외부에 마련된 행사장은 꽤 쌀쌀했다. 추위를 잘 타는 주요 인사 한 사람을 위한 난방 준비가 미흡했다고 내려진 조치였다. 그 후로는 한 여름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농담 삼아 ‘난로는 준비했어?’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했다.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금물
커다란 프로젝트에서 그럴싸한 기획안을 내고, 여의도와 광화문을 오가면서 회의실에서 PT하고 미팅하는 것이 폼 나기는 한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회사에 큰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연하장, 선물, 간식, 음료, 문구류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 싶은 일들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건 이른바 회사의 윗분들을 모실 때나 손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디즈니랜드에서 고객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원은 미키 마우스나 구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다니는 청소부들이다.’ 경제학자이자 인적자본 분석컨설팅 기업 맥바시&컴퍼니의 CEO인 로리 바시 박사가 공저한 베스트셀러 <굿 컴퍼니>에서 강조한 말이다.
주요 참석자들을 모시고 큰 행사를 기획할 때 사람들은 메인 행사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하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은 행사의 주요 멘트나 발표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밥이 맛있었다’거나 ‘이동 동선이 편했다’와 같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그래서 임원이나 팀장 할 것 없이 상사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닥 한 번 더 쓰는 것과 소소한 준비물들이다. 그게 사회생활을 오래 한 내공이 될 수도 있고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데,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젊은 팀원들은 ‘아 참, 연로한 분이 별 것 아닌 것에 너무 신경 쓰시네’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사소한 것을 챙기는 상사를 두고 ‘대리 같은 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응당 크고 화려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반증이다. ‘참을 수 없는 사소함에 대한 관심,’ 아재나 꼰대질이 아니라 오랜 조직 경험을 통해 더 촘촘해진 공력의 그물망이라면 너무 거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