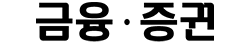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눈앞에 둔 1944년의 어느 날.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튼우즈에 전 세계 44개국 대표가 모였다. 전후 앞으로의 통화 제도를 논하기 위해서였다. 2차대전 패권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자국의 통화를 기반으로 한 통화 체계를 만들고자 했고 44개국 대표는 이에 동의했다. 미국의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본위제, 브레튼우즈 체제의 시작이었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골자는 미국의 달러만을 금과 고정된 이율로 바꿀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달러는 35달러당 금 1온스로 바꿀 수 있었고,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는 달러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연결하는 간접적 형태의 금태환제도를 마련했다. 2차대전 패전국으로부터 전쟁배상금을 금으로 지급받은 미국은 막대한 양의 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찍어내게 된다.

그러나 달러의 양이 늘어나며 달러 가치는 ‘35달러=금 1온스’의 공식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급락하기 시작했다. 결국 추락하는 달러를 팔고 금을 요구하는 사람, 단체, 국가가 늘어나며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만다. 기축통화는 공급을 늘려 신뢰를 높여야 하는데, 공급이 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의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트리핀의 딜레마’가 여기서 발생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2차대전 후 경제를 회복해나가는 동안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무역적자에 허덕였고, 결국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며 브레튼우즈 체제는 막을 내리고 만다.
1980년대 미국 은행 산업의 위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후 세계는 변동환율제 시대를 맞이한다. 그 속에서 은행들은 이윤율 하락과 그에 따른 강한 경쟁 압력을 받아야 했다. 미국의 은행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0년대 이후 전체 금융 시장에서 미국 은행들이 차지하는 파이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부상했던 뮤추얼 펀드는 은행으로부터 부유층과 중간계층 가계의 저축을 빼앗아갔다. 대기업들은 은행이 아닌 CP나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형은행은 고객층을 크게 잃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따르면 1980년대 상업은행의 자산은 1조482억달러로 전체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34.6% 수준이었다. 은행 자산은 1985년 2조3760억달러, 1990년 3조3380억달러, 1995년 4조4940억달러, 2004년 6조4690억달러로 매년 크게 성장했지만 파이는 같은 기간 30.9%에서 29.1%로, 다시 26.4%에서 23.8%로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벼랑 끝에 몰린 미국 은행들은 합종연횡하며 몸집을 합치게 된다. 확장 지향형의 대형 상업은행들은 어려움에 빠진 은행들을 하나둘 인수하기 시작했다.
몸집 커진 은행지주, 거대 금융지주로 발전하다
미국 금융지주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지주회사를 통해 증권업으로 업종을 넓히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1956년 마련된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ies Act)은 은행이 증권 계열사를 거느리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은행지주회사를 허용한 것으로 1980년대 이후 은행이 인수와 합병을 거듭해 몸집을 키운 근간이 됐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며 갈수록 은행 간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 규제가 미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1999년 미국은 보다 개방된 내용의 금융현대화법(Gram-Leach-Bliley Act)을 내놓는다. 은행이 지주 자회사 형태로 은행·증권·보험 등의 진입장벽을 허물고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은행들은 은행 간 인수·합병을 확대하며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몸집을 키워왔다.

미국 금융지주는 이후 공룡기업으로 발전했다. 지난 6월 기준 미국의 1위 금융지주인 JP모건 체이스의 총 자산은 2조5631억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미국 GDP는 19조3621억달러다.

미국 내 금융지주 1위부터 10위 그룹의 총 자산을 합치면 11조9028억달러로 미국 GDP의 절반을 뛰어넘게 된다. 인수와 합병으로 몸집을 키워온 금융지주는 말 그대로 공룡 기업이 돼버린 것이다.
금융지주 그 후, 미국 은행은 어떻게 변했나
거대 공룡이 돼버린 미국 금융지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경제학자 알렌 N. 버거와 레베카 뎀세츠, 필립 스트라한이 1999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형화가 규모의 경제, 이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형화된 은행 혹은 은행그룹에서는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은행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윤관호 배화여대 교수는 2013년 논문을 통해 “미국 10대 주요 은행의 경우 금융규제 완화가 일어났던 2000년 이후와 이전의 수익성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2000년 초 금융규제가 완화되며 은행의 업무 영역은 크게 넓어졌지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손실도 크게 입었다는 설명이다. 증권과 파생상품 업무는 투자은행(IB) 분야의 업무로 변동성이 크고 세계 금융 환경에 민감하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미국 10대 은행의 수익성은 미국 전체 은행기관의 수익성과보다 시기별로 더욱 변동성이 컸다”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해당 지주회사의 자산규모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10대 은행의 주식 초과수익률은 지주회사가 몸집을 불리는 동안 모두 감소해 자산규모와 수익성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