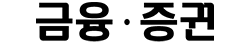현행 채무자 대리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박현근 위원(변호사)은 30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채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채무자 대리 제도가 입법 당시 논의된 채권자 적용 범위보다 크게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채무자 대리는 채권자의 추심과 관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채권공정추심법상 제도다.
현행 채무자 대리 제도는 대부업체가 채권 추심을 할 때만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추심을 방어하거나 채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사, 개인 채권자가 채권 추심할 경우는 채무자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근 위원은 "채무자 대리 제도는 등록,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심행위가 심각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들에 맞서 채무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일정정도 하고 있긴하다"면서도 "추심을 방어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무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들 채권 회사,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채무자 대리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채무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변호사로 국한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를 감당할 수 있는 채무자가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는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무 관청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공목적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채무자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채무자 대리 제도에서 채권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여연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채무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문제와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