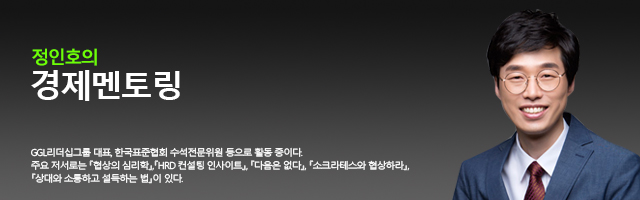“지금 몇 시야?” 조용히 공부하고 있던 한 친구가 옆자리 짝꿍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친구의 손목에는 단추를 누르면 시간을 알 수 있는 디지털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의아해 하던 짝꿍은 그 친구에게 “네 손목에 시계가 있는데 왜 나한테 묻는 거야?”라며 불평조로 되물었다. 이 질문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음성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 사실 시간을 물어본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수업시간에 음성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교실에 울리게 되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친구들이 다 알게 될까 봐 그랬다.
장애인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더구나 장애인 취급 받는 것은 극도로 싫어한다. 그들은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다. 이러한 개념에 맞춰 최근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소리 없이 팔려가는 시계가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이원(EONE)에서 만든 ‘브래들리 타임피스(Bradly Timepiece)’라는 시계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라? 만약 당신이라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계를 만들겠는가? 일단 앞을 못 보니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촉각으로 시간을 인지해야 하니 점자로 시계를 만들고, 크기도 가급적 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앞서 언급했듯 장애인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전용 시계를 출시한다면 그들에게 불쾌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가 된다. 2004년도에 ‘장애인을 위한 세탁기’라는 콘셉트로 세탁기가 출시되었다가 장애인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결국 해당 기업은 즉시 ‘장애인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로 정정 마케팅을 했다. 최근 삼성전자가 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나 제품을 출시할 때 ‘Designed for All(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등장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이라고 한다. 유니버설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자유 자재한 등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디자인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소수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소수도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그로 인해 다수도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한 디자인, 이것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계를 만들어야 할지 정리되었는가? 이원의 김형수 대표는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를 개발하면서 ‘쿵’ 하고 얻어맞는 기분이 몇 번이나 들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웬만한 사람들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듯, 시각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점자를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적극적 관찰을 통해 시각 장애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앞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손의 감각까지 무뎌져서 아예 점자 배우기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치로 표현하자면 시각장애인 10명 중 8~9명이 점자를 못 읽는다.
2014년 그래미 시상식 공연에 살아 있는 팝의 전설로 불리는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가 브래들리 타임피스를 차고 공연을 했다. 알겠지만 스티비 원더는 시각장애인이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는가? 보통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니 시계를 만들 때도 패션이나 디자인보다는 기능 위주로 만들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스티비 원더가 찬 시계는 시계의 본래 기능보다는 상대를 위해 배려다. 배려의 시계를 찬 것이다.
그래서 김형수 대표는 시침도 분침도 없는 시계. 크기가 다른 구슬 두 개가 자판 끝 부분을 돌면서 움직이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었다. 점자를 몰라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 누구나 시간을 읽을 수 있다. 적극적 관찰과 배려를 융합해서 탄생된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이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18개국으로 팔려나간다. 국내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색적인 패션시계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품을 넘어 예술로도 전이 된다. 최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전이 서울에서 열렸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림을 보지?’ 이 전시회는 보인다는 이유로 사물을 특징을 단정해버리는 상상력의 한계와 빈곤을 여지없이 타파한다. 작품전의 영어 타이틀은 ‘An-other Way of Seeing’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만지고 냄새를 맡아가면서 사물을 관찰한다. 보이지 않는 눈, 마음의 눈을 통한 관찰에는 편견이 없다. 보이니까 믿어버리는 시각의 자만이 이들에게는 없다. 시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고흐와 로댕을 즐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