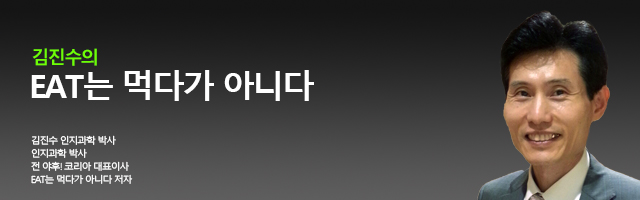한국말에 능숙한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있는 타일러 라쉬가 몇 년 전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한국말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다음은 그 일부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의 하나가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 너무 맵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힘든 것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다’라는 말 자체다. 이 단어는 쓰임새가 너무 넓어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설날이 되면 떡국만 먹는 게 아니라 한 살을 더 먹기도 한다. 그래서 떡국을 먹으면 이마에 주름이 생길까 봐 겁을 먹기도 했다. 주름이 진짜로 하나 더 새겨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충격을 먹기도’ 했다. 심지어 사람들과 사귀면서 ‘친구 먹는다’라는 말도 들었다. ‘먹다’라는 단어의 용도만 봐도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중앙일보> 2014.12.11 00:08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우리말의 ‘먹다’는 그 단어를 계속 사용해온 사람은 잘 못 느끼겠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어의 ‘먹다’는 정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우리말의 ‘먹다’의 가장 기본 의미는 몸이나 정신의 영역으로 어떤 것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바지를 먹다’는 표현은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바지가 엉덩이 사이로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무엇이 그 의미의 동질성이 있다. ‘친구를 먹다’를 영어로 직역하면 외국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말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친구라는 영역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의미다.
그러면 영어의 Eat는 어떤 의미로 쓰일까? Eat에는 먹는 대상이 영향을 받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먹는 대상이 식품인 경우 그것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겠지만, 먹히는 식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양이 망가지고 양이 줄어들고 끝내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빵을 먹는 경우 빵의 모양이 망가지고 양이 줄어들고, 다 먹고 나면 빵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의 모양이 망가지고 혹은 양이 줄어들거나 끝내 없어지는 현상들을 영어권에서는 ‘Eat’라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문을 살펴보면 ‘The sea has eaten into the north shore’는 ‘바다가 북쪽 해안을 침식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This acid eats metal’과 같은 문장에서는 ‘이 산이 금속을 부식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층적 의미로 보면 ‘부식하다’라는 말이나 ‘침식하다’라는 말이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닌 셈이다. 이런 표현이 추상화되어, ‘What’s eating you?’와 같이 “뭐가 너를 괴롭히니?’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 타일러 라쉬와 같이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에게 ‘먹다’란 단어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Eat’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