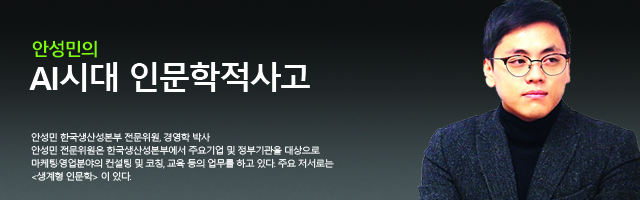한국의 기업은 유교 문화+군대문화가 결합되어 극강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곳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유교적인 문화나 군대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적어도 지금은 ‘까라면 까’식의 군대문화보다는 ‘창의력’과 ‘새로움’이 담보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기업문화는 너무나도 엄격하고 단단하다.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
우리는 회사에서 전략적이고 이윤추구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각종 보고가 넘쳐난다. 말로 하거나 실무자를 통해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전부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를 하다 보면 여백이 생기고, 타 부서와 비교되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더 채우게 되고, 내용을 부풀리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현업을 제쳐두고 보고 자료를 만들다가 하루를 다 보낸다.
심지어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 덕분에 반나절이면 끝날 자료를 이틀을 밤새워 만들어, 차트와 이미지 등 화려해 보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또한 실무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윗사람의 관심 사항에 맞춰 보고를 하다 보니 실제 업무와 결이 맞지 않고, 결국 보고 자료 자체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업무와는 영 딴판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계층’이 너무 단단하고 계층별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즉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회사에서 살아남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내실보다는 외면에 집착하는 기업문화, 쓸데없는 계층 구조와 계층에 따른 권위 의식이 워라밸에 매우 큰 걸림돌이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해
회사 사무실의 모습은 사뭇 전투적이다. 다들 무언가 화면에 몰두하고 있고 타자를 치기 바쁘며, 뭔가 고민하는 표정들이다. 아마 외국인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군’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의 직장인이라면 대충 표정이나 타자의 속도, 간격만 들어봐도 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잡담을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눈치문화’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도록 만든다.
사실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한다면 집중하는 시간도 있고, 잠시 휴식을 하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옆자리의 동료와 업무 이야기뿐 아니라 잡담을 통해 리프레쉬를 하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에서는 이러한 효율이 거의 통하지 않는다. 보통은 동료와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저 잡담으로만 여기는 문화까지 있어, 직장인들은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이나 회사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하게 된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끝내고, 휴식 시간을 가지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까’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문화에서 볼 수 있는 법칙
1. 파레토 법칙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온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법칙은 실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성과의 80%는 전체 근무 시간 중 집중한 20% 시간에서 나타나고, 20% 정도의 일 잘하는 직원이 80%의 무능한 직원들을 먹여 살리며, 회사에서 하는 회의 중 80%는 필요 없는 시간이고 단 20% 정도의 시간만 유용한 회의가 되는 것이다.
2. 파킨슨 법칙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파킨슨이 제시한 사회 생태학적 법칙으로,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일이나 조직의 규모는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심리적 이유 등으로 인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조직이 커지는 이유는 업무량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부하를 늘리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는 불필요한 일(행정처리 등)을 늘리게 되고, 결국 업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업무량이나 지출도 마찬가지다. 지출도 결국에는 수입에 맞춰 증가하게 되고, 업무도 시간에 맞춰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데 회사에서 2주일의 기한을 준다면 우리는 2주일을 꽉 채워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3. 피터의 법칙
피터의 법칙은 캐나다 출신의 미국 교육학자 로렌스 피터가 1960년에 제시한 이론으로, “조직에서 모든 직원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조직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한 직원들로 채워질 것이며, 하위직 직원들의 신조는 “나 살 길만 찾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공감되는 법칙이다.
무능한 상사는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부하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하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능력보다는 자신의 수준에서 평가하고, 부하들이 회사 규칙이나 관례를 잘 따르는지, 별 말썽 없이 현재의 체제를 잘 유지하는지 등의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부하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4. 딜버트의 법칙
샐러리맨 출신의 만화가 스콧 애덤스가 그린 ‘딜버트(Dilbert)’라는 만화의 주인공을 빗댄 이 법칙은 똑똑하고 열정적인 직원보다는 무능력하고 회사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직원이 조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윗선의 관리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혁신이나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을 벌이는 똑똑한 직원보다 회사에 타격을 적게 입히는 무능한 직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정치학에서 최고 권력자가 권력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무능한 직원들을 고위직에 승진시키는 경우를 ‘부정적 선발’이라 부른다.
지금 우리는 노예가 되어간다
워라밸을 이루는 핵심은 개인적 노력이다. 사회나 정부가 또는 회사가 어떻게 바꿔주겠지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워크와 라이프를 하나의 추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워크 쪽 저울팔에는 이미 추가 올라가 있다. 여기서 워라밸은 한쪽으로 쏠린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다. 저울을 한쪽으로 쏠리게 둘 것인지 평행을 맞출 것인지 결정하는 건 본인이다.
자신의 생활은 사회가 바꿔주지 않는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지만 사람들의 문화나 인식은 결코 이러한 속도에 맞춰 바뀌지 않는다. 어쩌면 현재 자신의 권리나 지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더욱 더디게 바뀐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이유이건, 가정적인 이유이건 자신의 삶에 있어 워라밸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야 한다. 워라밸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조직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삶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다. 적어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직장이 주는 의미는 과거 부모 세대가 느꼈던 직장의 의미와 다를 수밖에 없다.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빛나는지, 그리고 더 무거운지…’라고 미국의 극작가 리로이 존스가 1960년에 이야기했다. 무려 60년이 지난 지금, 이 글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회사의 모습과 사회의 인식을 비판하면서도 또 그 틀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킨다. 각성할 여력도 없이 곧바로 생존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단단한 사회를 변화시킬 자신이 없어서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