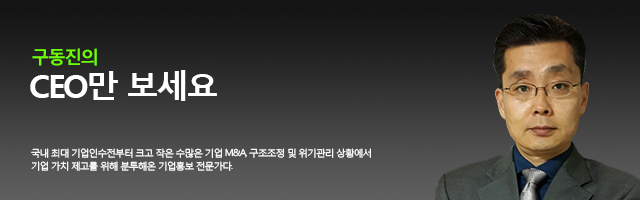커뮤니케이터가 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글을 쓰는 것이다.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다. 보도자료부터 떠올리겠지만 비단 언론 기사를 위해 작성되는 자료들 외에도 써야 되는 글들은 상당히 그 종류가 많다. 각종 공문서에서부터 사보나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에서부터 브로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IR자료집, 카달로그, 광고용 문구 심지어 화장실 칸칸마다 내 걸리는 오늘의 격언에 이르기까지 사 내외를 막론하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글이라면 다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신년사나 경영설명회, 주주총회 같이 정기적으로 닥쳐오는 연설문뿐만 아니라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각종 행사에서 요구되는 CEO 인사말이나 서신도 포함된다.
말과 글, 메시지가 바로 그 사람이다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의 말과 글은 대통령 자신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그 자체라고 했다. 그 사람의 생각, 이념, 철학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건 결국 말과 글로써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 자신이 말과 글로써 자신을 보이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비선실세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맡겨 버렸다는 것은 유능, 무능을 떠나서 그 글이나 말에서 자기 자신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CEO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기업경영의 한 국면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CEO 자신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아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사탕발린 이야기들만 잔뜩 나열한 것을 읽기만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데로 자신의 생각, 이념, 철학 없이, 자기 자신이 빠져버린 셈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긴다.
강 작가는 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게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글은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도 20년간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가슴속에서 항상 무언가 절절하게 맺혀있었고 토해 내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었기에 고심을 거듭하다 원고 작업에 매달렸다.
3-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사말 또는 연설은 지겨운 것으로만 기억에 남아 있기 십상이다.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훈화로 기억에 남는 조례시간이 대표적이었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운동장에서 줄 맞춰 서서 지겨운 말을 들어야 했다. 여름날 뙤약볕에 친구가 쓰러진 소동, 겨울철이면 발이 시려워 동동거렸던 기억뿐이다. 내용은 전혀 없는데 ‘에 ~~, 끝으로’ 같은 여운은 아직 남아있다. ‘끝으로’라는 말이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횟수만 손꼽아 세었던 씁쓸한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다.
회사의 품격은 메시지에서 나온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해서 예로부터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생각,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체 자체도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마디로 글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주는 척도였다.
회사나 조직에도 마찬가지로 품격이 있다. 그 품격은 역시 글이라는 수단에 실린 메시지를 통해 나온다. 회사라는 유기체는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각종 문서와 문구를 통해 전달한다. 작은 구호에서부터 사보나 홈페이지, 이메일, 뉴스레터, 브로슈어나 경영자 인사말 같은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다. 외부로 알리거나 나가는 자료들은 모두 회사가 대중이나 시장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된다.
여의도 증권가나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변화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시장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귀를 쫑긋 세운다. 때문에 지금 당장 회사에 큰 일이 없더라도 PR이나 IR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터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회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기업의 내일,’ 메시지라는 프리즘을 통해야만 볼 수 있어
시장은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회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메시지에 더 큰 기대를 품는다. CEO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채택한 아젠다를 임직원이 어떻게 소화해내는 지가 살아있는 정보다.
비즈니스에서도 ‘꿈’은 너무나 중요하다. 기업의 내일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기업의 내일을 현재로 끌어와 들여다 보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다. 기업의 꿈과 미래를 현재의 시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CEO의 의지와 기업과 임직원들의 합심된 노력으로 일구어 내고자 하는 메시지 밖에 없다. 시장이 받은 메시지는 기업의 약속이기에 감시자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메시지는 무서운 법이다.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조직일수록 글이라는 것은 막무가내로 지어내면 되는 것인 양 오해한다. 알맹이를 담기 보다는 온갖 형용사와 미사여구만 나열된 아름다운 글만을 강요하게 된다.
한번은 신년사를 써서 보고 하는 과정에서 ‘감동이 없어!’라는 평을 받고는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또, 분기에 한번씩 경영진들이 전임직원들 앞에서 그간의 성과와 분발을 호소하는 경영설명회의 인사말을 듣던 주위의 선후배 동료들이 나를 향해 엄지를 척하고 올려 세웠던 기억도 새롭다.
감동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 신년사는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형용사와 부사어 그리고 몇 가지 인용문을 덧붙인 덕분에 통과는 됐지만 일년 내내 읽어 볼 때마다 팥소가 빠진 단팥빵 같아 부끄러웠다. 엄지척을 불러왔던 인사말은 현실은 높은 부채비율과 채권단의 압박으로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어찌 그리 멋지게 표현해냈냐는 빈정거림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요구 받았겠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꽃만을 보여주는 글’을 꼬집은 것이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해서 임직원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내용이나 너무 먼 허황된 꿈과 공약만 남발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경영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에는 차마 딴짓 할 수 없겠지만, 마음 속으로는 문을 닫아 걸어버린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터는 함부로 글쓰기를 주저한다.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되는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한다. 메시지가 부족해도 안되고 넘쳐도 곤란하다. 전체 글쓰기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부나 마찬가지다.
오버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회사상황에 적절한 내용이 들어 가야지 듣기에만 멋지고 화려한 말은 절대로 삼가 할 필요가 있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말을 꺼내서도 안 된다. 원고 분량도 중요하다. 보통 폰트 11 정도 크기로 A4지 한 장의 분량을 이야기 하는 속도로 읽어 나가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2분 30초에서 3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꽉 채운 2장이 아니라 2장에서 조금 모자란 분량이면 5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 정도가 적절한 길이다.
커뮤니케이터의 글이 아니라 CEO의 메시지다
커뮤니케이터가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CEO의 생각이기에 실제 전달 주체는 CEO 자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간혹 경영자들 중에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임직원 앞에서 대충 웅얼거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것만 못하다.
보통 신년사 하나 쓸 때 한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작업을 한다. 각 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자료, 국내외 대기업들의 자료, 업계 동향 등 수 많은 자료를 먼저 섭렵한다. 그 결과 회사의 현실을 반영해 A4지 2장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사실 긴 글보다도 짧은 글일수록 더 힘든 법이다. 글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글을 한번 쓸 때마다 회사를 통째로 씹어 삼켰다가 뱉어내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짧은 보도자료 하나를 위해 백 번을 소리 내어 읽어 본다’는 선배의 말처럼 정성과 땀이 배어들어야 한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대로 씹어 삼키지 못하고 메시지를 쓴다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
1. 말과 글, 메시지가 바로 그 사람이다.
2. 회사의 품격은 메시지에서 나온다.
3. 시장이 보고 싶어 하는 기업의 꿈을 메시지에 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