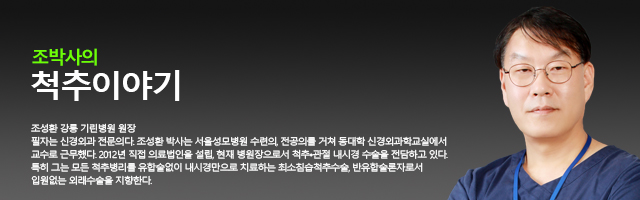진료실에서 환자에게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라고 진단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므로 재해라고 주장하는 이가 많다. 주로 보험과 관련한 민원이다. 과연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통상 디스크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누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사인분류(WHO ICD-10)에 따르면 디스크는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질병으로 본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매미의 최종 탈피에 비유할 수 있다. 7년 동안 매미 유충이 땅 속에서 지낸 시기는 발병 전 추간판에 일어난 퇴행성 변화의 시기와 같다고 본다. 즉 디스크의 발병에 있어서 선행하는 추간판 손상은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통증이 발생된 그 순간에 무심코 차 트렁크 안을 들여다 보려고 고개를 숙였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을 수도 있다. 들여다 보거나 허리를 숙이는 단순한 동작만으로 디스크가 발생한다면 그런 허약한 인류가 오늘날까지 진화해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사고나 외상이 추간판 손상(외상성 추간판파열, 이른바 외상성 디스크)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엄청난 에너지가 두부, 체간을 직접 타격하거나 강력한 가속·감속, 굴곡·신전 스트레스가 척추에 가해질 때 발생한다. 주로 정면충돌, 전복, 추락을 수반한 자동차 사고나 건설현장 붕괴, 추락 등과 같은 대형재해에서 발생하므로 심각한 연부조직 손상은 물론 척추골절, 척수손상을 입은 채로 응급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외상성 디스크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디스크에 대해 갖는 태도는 어떨까? 두 보험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손해보험은 당해 사고가 디스크 발병(손해)의 원인인지(인과관계), 원인이라면 얼마나 기여했는지(기여도)를 따져서 그만큼만 손해로 인정한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할 손해도 없다고 본다. 이런 태도는 손보사와 가입자 간의 사적 계약, 즉 약관에 근거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적법한 업무상 재해라면 외상성, 퇴행성 디스크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보상한다. 이와 같은 두 보험의 시각차는 사적보험과 공적보험의 사회적 역할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디스크 환자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두고 주치의와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있다. 잘 치료받아오던 환자가 돌연 진단명을 바꾸어 달라고 조르기 때문이다. 이유인 즉슨 손보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니 외상성 디스크로 진단명을 바꾸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을 변경할 리는 만무하니 결국 의사의 고집 때문에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를 낳게 된다. 이런 환자는 진료 의사를 증오하며 기피를 주장하거나 병원을 옮기기도 하지만 결국 치료 중단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의사가 사실과 달리 진단을 바꾸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사적 계약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보험사가 의사를 고소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일반인이 디스크가 재해인지 여부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보험금 지급청구 이외는 없다. 보험가입 전에 보장 범위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만이 낭패를 줄이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