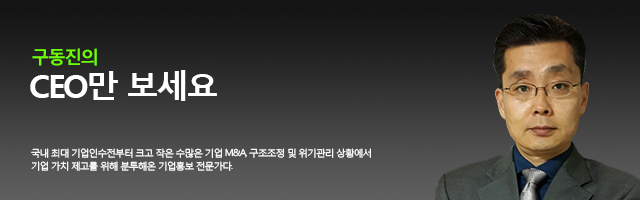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형님이라고 한번만 불러주면 안 되겠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차 부르겠습니다.”
“꼭 형님이라는 소릴 듣고 싶어서 그래”
“다음부터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한번만이라도 불러주면 안될까?”
“…………”
예전에 겪었던 일화다.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면서 기자를 포함해서 NGO단체, 여야 당직자, 국회 전문위원, 청와대 행정관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만날 기회도 제법 많았다. 행사장 같은 곳에서 악수만 나누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가끔은 별도로 만나기도 했다.
첫 만남에서는 명함에 있는 직위를 존칭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무리 작은 회사 회장이라도 명함에 회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큰 회사에서 수 천억 원을 주무르는 큰 권한이 있어도 과장이면 짤 없이 ‘과장님’인 것이다. 요즘은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표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 같다.
‘형님’, 당신이 그 누구든 내 스스로를 낮추는 의미
호칭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열에 일곱은 돌아봤던 시절이 있었고, 감독님이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방송국이나 영화사들이 많던 충무로나 여의도에서 감독님하고 부르면 다 돌아보던 시절도 있었다. 실장님도 유행했었지만 아무래도 호칭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회장님’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큰 조직을 만들어 이끄는 리더나 명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회장님 호칭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극존칭이 따로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신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이 극존칭을 사용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형님’이라는 말이 가장 극존칭이라는 나만의 궤변을 가지고 있다.
‘형님’은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상대보다 낮추는 말이다. 인간 그 자체를 따르겠다는 의미를 포함한 말로써 존경심, 친밀도, 관계성, 태도 등등 모든 것을 녹여서 표현하는 말이다. 뒷골목 보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아마 일맥상통하리라 본다. 사내에서 ‘부장, 상무, 부사장’으로 불리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님’ 또는 ‘큰 형님’으로 통하는 관계도 많다.
나는 ‘형님’이라는 호칭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절대 아무나 그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아무리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다 해도 그 사람 자질이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형님’이라는 호칭을 입에 담지 않았다.
삼국지에서 주인공 유비, 관우, 장비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는다. 유비가 맏형, 다음이 관우 그리고 장비가 막내다. 사실 큰 형인 유비보다 동생인 관우가 더 연장자다. 관우는 비록 나이가 더 많았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유비를 형님으로 모셨고 훗날 주군으로 받든다. 유비의 사람됨을 알아 봤기에 형님으로 모셨던 것이다. 그게 진정한 관계고 그런 유비를 알아보고 마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배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대표나 사장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몰랐지만 몇 번 만나다 보면 내게서 대표나 사장이라고 불리는 것 보다 형님으로 불리고 싶어들 했다. 하지만 형님이라는 말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 존경하고 따를만하다는 판단이 설 때야 형님으로 모셨다. 지위가 높거나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품이 기준이었다.
형님에는 뜻을 쫓아 따름의 의미 담아
예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라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 집권당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사업가들과도 두루 친분을 맺고 있었다. 가끔 함께 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회사가 살아남도록 도움을 청하고 다닐 때였다. 어느 날 선배와 몇몇 사업가들이 함께 하는 저녁자리에 끼게 됐다. 안면이 조금 있던 한 사업가가 내게 특별히 친하게 지내자면서 ‘형님’이라는 말을 끄집어 냈다.
"자네는 항상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가 변함 없구만."
"감사합니다."
"항상 깔끔하게 입고, 흐트러진 걸 못 봤어."
"아, 예 ....."
"회사도 자네에게 기대가 엄청 크겠어. 우리와도 잘 해 나가면 좋겠어. 그런데 나한테 너무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아. 이제 편하게 형이라 불러."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뵌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자네한테 형님이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어 그러니 형님이라고 부르게."
"차차 부르겠습니다."
"오늘 형님이라는 소리를 꼭 좀 듣고 싶어."
그때 옆자리에 함께 했던 선배가 한 마디를 거들고 나섰다.
"사장님, 좀 기다리시지요. 이 친구는 쉽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2년이 넘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절 형님이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하하하."
무슨 일인지 그 대표는 통사정을 하듯 말을 이어나갔다. 저녁 식사에 이어 술자리에서도 몇번을 졸랐다.
"그러면 오늘 딱 한번만이라도 형님이라고 불러주게."
"다음에 뵐 때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람 가리는 것처럼 오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아직 제가 어떤 놈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요."
"괜찮아,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자네한테 형님이라는 소리를 오늘 꼭 좀 듣고 싶어. 한번만이라도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나?"
옆에 있던 선배가 한술 더 떠서 거들고 나섰다.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혀가 닳는 것도 아닌데, 한번 불러 드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참 어색한 상황이었다. 그 사업가는 지방에 번듯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호칭은 개의치 않으면서도 내게서 형님 소리를 듣고 싶어 저녁 내내 안달이었다. 괜한 것 가지고 오해 받기도 싫고, 분위기 망치기도 싫어서 그날 두 번인가 ‘형님’으로 불렀다. 덕분에 그날 저녁 자리는 유쾌하게 끝났다. 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는 두 번 다시 형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조금만 친해져도 형님 동생이라 부르는 사람이 많다. 아래 위 한 살 정도는 친구로, 그 이상 벌어지면 자연스레 형님 동생이다.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업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도움된다. 형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君師父一體(군사부일체)라 하여 그림자도 밟지 않고 섬겨야 할 세 사람이 있다. 그런 연장에서 ‘형님’은 뜻을 좇아 따르고 함께 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 의지다.
---------------------------------------
1. 상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돈과 지위가 아닌 사람 됨됨이가 귀한 대접을 받게 한다.
3. 뜻을 따르고 함께 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의지를 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