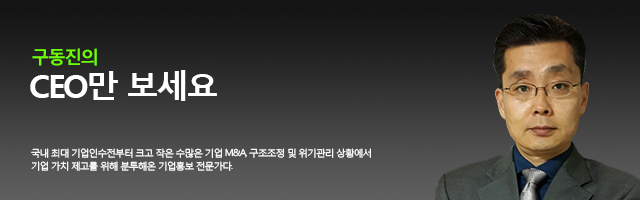한국사회에서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하다. 선배와 후배, 사수와 부사수는 보통 인연이 아니기에 지역, 학교, 직장 그것도 아니면 모임에서라도 선후배로 서로 엮이는 것이다.
일을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도 중요하다. 명성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선배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정 받는다. 상대방이 선배를 알고 있거나 함께 일 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냥 묻어간다.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호구조사가 대화의 초반을 장식할 때가 많다.
사부님으로 모시는 두 분이 있다. 모두 대우그룹의 마지막을 함께한 정통 홍보맨들 이었다. 대우그룹에서 하루도 일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도 신기할 따름이다.
2005년 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모실 기회가 있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소송이며 여론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되고자 사부님을 조력했다. 그 핑계로 대우그룹과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면 늘 나 스스로를 ‘대우인의 피가 절반쯤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과장된 소개를 했다.
배수의 진, 결정부터 해 놓고 난 뒤에 처음 만나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된 이후 2005년 무렵 세녹스의 말년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 야구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베라의 명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마지막까지도 뭔가 회사가 재기 할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는 회사가 힘든 상황임을 알고있던 기자들이 오히려 밥을 사겠다거나, 술을 한 잔 살 테니 나오라는 얘기를 먼저 했다.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려면 그들과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소중했다. 때문에 그 인연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
당시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 심지어 출퇴근이나 밥값도 버거울 정도로 회사가 암울했다. 밀린 급여가 쌓여 있었고, 컵라면과 햇반으로 사무실에서 허기를 채웠다.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버젓이 기자들 만나서 식사나 차 대접은 언감생심이었다.
기자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니 그처럼 감사한 일이 또 없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런 기자들과의 인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정 답답할 때면 당시 모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다가 한 언론 매체의 대표직을 하고 있던 다른 사부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초기 세녹스의 홍보대행을 했던 업체 대표이사였다. 회사가 힘들어지자 몇 개월 치의 홍보대행 수수료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계약은 파기됐다. 회사와의 관계는 파국이었지만, 줘야 할 돈도 주지 못한 회사에 몸담은 내가 번번히 도움을 요청하는 뻔뻔스런 관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한번도 그런 내색 없이 온갖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2005년 봄, 전화로 한 마디를 불쑥 던졌다.
“내 선배가 전화 할 지도 몰라. 들어보고 판단해!”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십 여분 뒤에 핸드폰이 울렸다. 대우그룹 마지막 홍보담당 전무이사였고, 전설 같기만 하던 분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을 건네오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광화문 종로구청 근처에서 봅시다.”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그랬고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어찌 이런 분이 내게 연락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메이저리거들이 이름 없는 동네 야구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세녹스는 더 이상 가망 없어 잔류하던 사람들이 따로 나와 바이오디젤 제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차라리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판을 벌여보자는 생각하던 시기였 다. 자금이 부족한 사정에 쉽지 않았다. 동남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팜유에 관심이 모아졌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사무실 임대며 집기도 들여놓고 사업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전설로만 생각했던 그 분이 직접 전화까지 해왔다. 일을 해 오면서 가장 목말랐던 것이 ‘내가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었다. 전화 끊고 한참을 생각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지만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었다.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제일 큰 가르침
결국 그날 밤에 모든 것은 정리했다.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밤에 경영진의 집까지 찾아가 작별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종로구청 근처에서 사부님을 만났다. 생각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은은히 풍기는 인간적 면모가 왠지 모르게 끌렸다. 사부님은 이미 비밀 아지트 하나를 마련해 두고 계셨다. 종로구청 옆 오피스텔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같이 일을 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네.”
두 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로 대답을 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 해도 되나?”
뵙기 전부터 동경하고 존경하던 분을 앞에 두고 있었기에 두 번 생각해볼 필요가 없었다.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그런 마당에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으니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다. 즉각적인 답에 오히려 사부님이 뜻밖이라 생각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라 했지만 이미 맘을 굳히고 있었다.
“결혼은 했다고 들었고, 애도 있나?”
“예, 두 돌 지난 사내아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뇨, 요새는 지역의료보험도 괜찮습니다.”
“정규 조직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급여 지급도 힘들지 몰라.”
“괜찮습니다. 애초에 급여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 봅시다. 일단 귀가 했다가 내일부터 챙겨보도록 해요.”
“예, 그런데 굳이 내일부터 할 필요 있겠습니까? 바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만.”
“아, 그럴까요? 그러면 각 언론사 데스크로 보낼 레터부터 한 장 써봐요. 내용은 작은 장소를 하나 마련했고 슬슬 준비해서, 조만간 제대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결정은 신속했다. 바로 일에 착수했다. 첫 만남부터 일 시작까지 종로구청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온 시간을 빼면 불과 삼십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정리됐다. 그 짧은 만남과 대화가 인생의 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전격적으로 바꿔 놓았다. 그날 오후 각 매체 산업부장에게 보낼 초안을 보고 사부께서 한 마디 하셨다.
“글은 좀 되네.”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인정 받은 느낌이었다. 수년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일을 해 왔지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실행할 수 밖에 없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불안했다. 사람 하나 소개 받을 수 없었고, 막힐 때 도움을 요청할만한 사람도 옆에 없었다.
그렇게 사부님을 만났다. 인생의 큰 변곡점이라 생각한다. 그냥 사부님이 아니라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생각에 절로 힘이 생겼다. 같이 일 하면서 실제 직접 이것 저것 지시하거나 가르쳐 준 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부님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우그룹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는 기자를 만날 때면 자칭 타칭 ‘사부님의 마지막 애제자’로 스스로를 소개해왔다. 두 분 사부님께는 늘 감사하는 마음 가득 가지고 산다.
------------------------------------------
1. 조건을 따지는 것 보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2. 악조건에서도 악착 같이 하려는 자세가 극복의 열쇠다.
3.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제일 큰 가르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