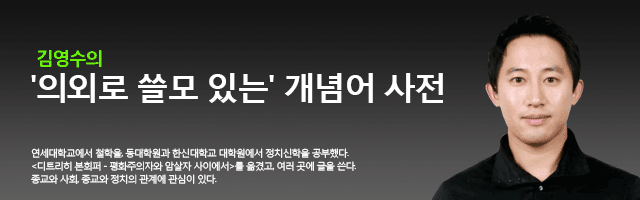국가(國家)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조각이다.” 영국 시인 존 던이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한 소절이다. 완벽하게 격리된 개인이란 없다. 누구나 대륙 위에 발을 딛고 산다. 저 대륙의 목록이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첫 두 항목은 자연과 사회일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한 조각으로, 사회를 이루며 산다.
그래서일까. 물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탈레스부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를 상상한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까지, 서양 최초의 학자들은 자연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학문의 관심이 자연에서 사회로 옮겨진 건,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리스 땅을 휩쓸고 지나간 즈음이었다. 소피스트들과 그리스 비극 작가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모두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중 플라톤은 국가에 관한 최초의 정교한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화편 <국가>를 보면, 국가는 지배자, 수호자, 생산자라는 세 계급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머리, 가슴, 배라는 인간의 신체 구조에 상응한다. 말하자면,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인간인 셈이다. 현대인의 입장에서야 우스운 소리지만, 사실 이는 국가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세 개의 가치인 지혜, 용기, 절제를 각각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플라톤은 세 개의 계급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나라가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 ‘정의로운 나라’는 이처럼 오래된 주제다.
당시 아테네나 스파르타는 도시 국가였으며, 지금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출현한 건 근대에 이르러서다. 중세 시대에 거대 왕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삶의 단위는 도시나 지역이었지 국가는 아니었다. 출신 지역이나 마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과거 사람들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의 유명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이름은 ‘빈치 마을의 레오나르도’라는 뜻이다.
반면 오늘날 삶을 결정짓는 근본 단위는 도시나 지역이 아니라 ‘국가’다. 근대 국가는 17세기 절대왕정이 들어서면서 국가가 도시의 경제력을 흡수하고, 신흥 자본가 계급이 왕족과 귀족을 몰아내 시민사회라는 근대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형성되었다. 새롭게 출현한 시민사회와 국가는 곧바로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홉스부터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마르크스까지 근대 정치사상가들은 하나같이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 계약을 맺어 권력을 국가에 양도한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현대의 국가 권력은 전체 부르주아지의 공동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홉스는 왜 대중이 국가에 의탁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국가 권력의 정당화를 꾀한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대의하는지를 물으며 국가를 급진적으로 해체하고자 했다. 사뭇 다른 입장이지만,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이다.
국가 권력은 누구의 의지와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가? 지난 겨울 촛불집회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선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내놓은 대답이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대중의 자기 지배가 정당화되려면 그들이 합리적이고 선하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대중을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수개월은 대한민국 시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울 지혜와 용기를 지닌 주권자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고, 모두가 기대에 차 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주인의 자격, 즉 시민적 덕성을 고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