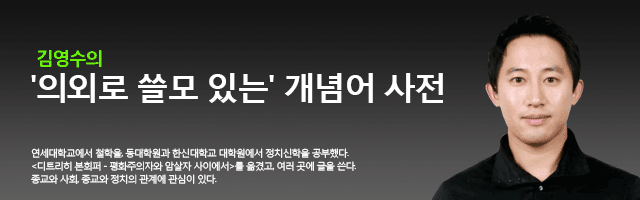정치(政治)
: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는 허균이다. 그의 집안은 당대의 명문가였다. 명나라까지 명성을 떨쳤다는 천재시인 허난설헌이 그의 누이였으며, <조선왕조실록>은 “세상에서 일컫기를 ‘허씨가 당파의 가문 중에 가장 치성하다’고 했다”고 적었다. 허균 자신도 삼당시인 중 한 명인 손곡 이달을 사사하고, 20대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다.
화려한 이력을 지닌 명문가 자제답지 않게 그는 꽤나 독특한 취향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유교를 숭상하는 사대부이면서도 불교에 심취해 승려들과 왕래했으며, 기생을 아예 집에 들여 살림을 차렸고, 당시 차별의 대상이었던 서자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다. 하긴 당대의 금기를 다루는 문제작을 쓰려면 이런 남다른 기질을 지녀야 했을 법도 하다.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자신이 천하게 난 것을 스스로 가슴 깊이 한탄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이 소설의 중핵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새삼 요약할 필요 없이 유명하다. 길동은 활빈당이라는 의적단을 만들어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조선 사회에 맞서 싸운다. 초인적 능력을 지닌 그는 승승장구하고 조선의 임금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거물이 된다.
개인적 고통에서 출발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한 뒤 용감하게 그에 맞서 싸운다는 길동의 서사에는 오늘날에도 눈여겨볼 만한 교훈이 담겨 있다. 다양한 규정이 가능하지만, 정치를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개혁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길동의 이야기는 정치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을 짚어준다. 정치의 출발점은 거대한 이론이나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고통이어야 한다.
버거운 경쟁에 내몰려 이른 나이에 지쳐버린 학생들, 취업을 하지 못해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학창시절에 진 빚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청년들, 유리천장과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장벽에 막혀 마음껏 삶을 펼치지 못하는 여성들, 인생의 황혼기를 폐지를 주워가며 연명하는 노인들까지. 저 구체적인 현실 속 고통들, 정치는 그곳에서 자라나야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길동의 고통에서 출발한 이 소설이 여전히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도 그 때문이다.
소설의 마무리는 그래서 더욱 아쉽다. 길동의 활동에 위기감을 느낀 임금은 길동에게 병조판서라는 벼슬을 하사한다. 길동은 임금께 감사하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으로 가버린다. 그리고는 왕이 되어 여러 부인을 거느리며 산다. 그 역시 자손을 많이 낳지만 첫째 부인의 자식 외에는 모두 서자가 된다. 소설은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간다.
‘책임’을 뜻하는 독일어 ‘Verantwortung’은 ‘응답’을 뜻하는 단어 ‘Antwort’에서 파생했다. 영어 Responsibility나 프랑스어 Résponsibilité 역시 각각 Resonse와 Réponse에서 왔다. 책임을 진다는 건 무엇인가에 응답한다는 뜻이다. 어떤 응답인가가 어떤 책임인가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인에게 필요한 책임이란 무엇일까? 적어도 자신의 고통에만 응답하고 사회적 모순에는 결국 눈을 감아 버린 길동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곧 대선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예리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를 해결하겠노라 호언장담한다. 생각해보면, 때아닌 5월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 이전 대통령이 정치인다운 책임의식을 전혀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 혹은 내가 속한 진영과 계파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나라를 앞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저 소설처럼 낡은 과거로 되돌릴 뿐이다. 이번에는 정치인다운 대통령, 책임 있는 정치인을 만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