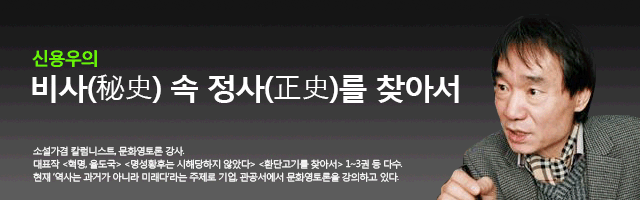일본이 대한제국의 문화에 관하여 기술된 서적들을 일본 왕실의 지하서고인 쇼로부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1999년 12월 6일 중앙일보가 박창화씨의 증언을 인용해서 폭로한 것이다. 박창화씨는 공주대학교를 졸업한 후, 1933년부터 1945년 조국 광복 때까지 일본 왕실의 지하서고에서 사서를 분류하는 일을 했던 분이다.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쇼로부에는 대한제국의 역사서들이 다량 있는 데 특히 단군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은 단군에 관한 역사서를 대한제국에서 모조리 수거 한 후 단군이 통치했던 고조선을 신화 속의 나라로 만들자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만일 신화로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역사를 짧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영역을 좁혀 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 역시 작용한 것이다. 단군신화라는 묘한 단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부정하려 했던 것과 점제현 신사비의 위치를 바꿔가면서까지 우리 역사를 반도 안으로 끌어드리려 했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일제가 고조선 역사를 왜곡했던 첫 번째 이유인, 고조선의 역사를 시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조작했던 단군에 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단군조선 즉 고조선을 이야기 하자면 고조선의 원래 이름은 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훗날 근세조선과 지금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약호로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는 바람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고대조선 즉 고(古)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고조선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단군이다.
우리는 흔히 단군이 마치 한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많은 곳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단군이 몇 명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군은 한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게 바로 단군을 신화로 만들기 위한 일제의 첫 번째 작업이었다.
고조선은 단군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단군이 한 사람이라고 치자. 고조선이 BC2,333년에 세워지고 BC108년에 멸망했다고 하니 무려 2,20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사람의 단군이 다스렸다면 필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단군이 몇 분이셨는가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첫 번째는 행촌 이암 선생님의 단군세기를 기준으로 하면 1세 왕검부터 47세 고열가까지 마흔일곱 분이셨다. 그리고 총 재위 년 수는 2,155년이다. 이 경우에 약간의 오차가 나는 것은 고조선 말기의 통계와 각각의 재위 년 수에서 약간의 오차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벌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조선의 멸망 연대가 BC280~BC108년으로 주장되는 것에서 오는 오차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이병도・최태영 두 박사께서 공동으로 저술한 <한국상고사입문>에서 주장하는 전기단군 47분과 후기단군 40분이라는 주장이다. 즉 단군세기에 알려진 47분은 전기단군들이고 은나라에 일시적으로 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후에는 후기 40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기 단군들의 재위 년 수가 47대 1,028년이고 후기단군은 40대 928년으로 총 재위 년 수는 1,956년이다. 이 역시 패망 년대와 중간에 은나라에 패했던 기간 등에서 오는 오차라고 사료된다. 어쨌든 고대 역사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 오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어느 학설이 맞는 설이든 간에 단군은 분명히 한 분은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단군왕검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단군왕검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시대에 두 가지를 다 독점해서 한사람이 이끌어 간 것처럼 배웠다. 그러니 단군은 설화 속의 인물이라고 해도 의심 없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단군의 재위 년 수는 짧게는 10년 이하부터 아주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군왕검이라는 한 사람의 단군이 2,000여년에 걸쳐 고조선을 집권했으니 신화일 수밖에 없다는 왜곡된 역사의 희생양이 되었다. 그 결과 역사에 관해서, 특히 고대사에 관해서는 우매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게 바로 일제가 노리던 식민사관의 효과다. 그러나 일제가 아무리 우리역사를 뭉개 트려 놓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었다.